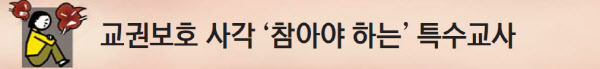장애 인권과 함께 통합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지만, 특수교육의 부담은 특수교사만 짊어지는 게 현실이다.
2023년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10만9천703명 중 73.3%인 8만467명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다.
전체 대상자 중 73.3% 일반학교行
다수 '부분통합 수업' 문제땐 떠넘겨
이들 중 다수는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오가며 수업을 듣는 '부분통합' 교육을 듣는 반면, 일반학급에서 비장애 학생과 모든 수업을 함께하는 '전일제 통학학급' 대상자도 1만8천474명으로 17% 가까이 된다.
일반교사도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 일부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특수는 특수교사에게'라는 식으로 떠넘겨지는 게 교육 현장의 현실이다.
특수교사의 전문성은 교과 지도와 수업 역량과 함께 장애 영역·유형별 특징에 따른 수행능력도 함께 평가받고 있다. 학급 구분을 넘어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대처 능력을 갖췄다는 이유로 특수교사가 맡게 된다. 반면 일반교사들은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인식교육 외에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일 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다.
객관적 기준없이 지역별 배치 달라
학폭위 선처 목적 대상 선정 요구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가 오남용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시각·청각 등 10가지의 장애 진단, 판단을 받거나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가 된다.
ADHD 또는 극단적 폭력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의 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의 감경 조치를 받거나 선처 대상이 되기 위해 대상 지원청과 학교 등에 선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최근 노조에 수차례 접수됐다. 특히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와 선정배치 기준이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객관적 지표 없이 지역별로 서로 다른 잣대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승희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특수교사의 교권에 대한 교육 현장 인식은 장애인에 대한 일반 사회에서 인식을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장애인 인권이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비장애인과 차별이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차이가 교사에게도 전달되는 상황"이라며 "대표적 예로 기간제 교사의 비율도 일반교사에 비해 특수교사가 두 배다. 이러한 제도와 법의 위상, (사각지대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 상태"라고 짚었다.
/고건·김산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