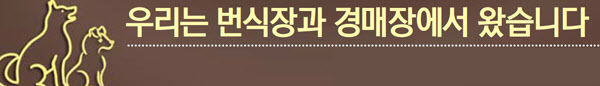[우리는 번식장과 경매장에서 왔습니다] 반려견 전성시대의 그늘·(中)
충동구매 부추기는 유리 진열장
주먹구구식 가격 책정하는 펫숍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변화 없어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배경은 소위 '펫숍'이라고 불리는 동물판매업의 성장과 연계돼 있다.
길거리 펫숍의 유리진열장 속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는 반려동물 충동구매를 부추겼다. 길거리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등에 들어선 펫숍에서 사람들은 물건을 고르듯 반려동물의 가격과 외모를 비교해 구매했다. 아무런 제재나 노력없이 가장 쉬운 방식으로 반려동물을 집으로 데려온 것이다. 앞으로 함께 살아갈 '가족의 일원'으로서 '입양'한다는 인식은 빠진 채로 말이다.
한국에서 펫숍은 1960년대 충무로에서부터 자리잡기 시작했다. 국내 최초 펫숍으로 알려진 '애조원'이 명동 재개발에 밀려나 충무로로 자리를 옮기게 되며 충무로 애견거리를 형성했다.
이후 펫숍은 '우후죽순' 늘어났다. 2012년 2천152개소에서 2020년 4천159개소까지 늘어났으며 현재는 27일 기준 동물판매업장 3천28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도내에만 1천30개소가 있다.
반려산업 성장과 동시에 관련 불법행위들도 수면 위로 드러나자, 동물보호법 개정 등이 이뤄져 지난해부터 동물판매업을 비롯한 동물수입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지만 펫숍의 풍경은 달리 바뀐게 없다.
판매업자는 펫숍에서 적게는 4마리, 많게는 20여마리의 동물들을 유리진열장에 넣어 판매한다. 대부분 태어난 지 2개월 이하의 어린 새끼지만 간혹 나이가 찬 동물들도 있다.
문제는 펫숍에서의 가격 책정이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다. 펫숍마다 가격도 차이가 클뿐더러, '작고 예쁘고 어리면 비싸다'는 주관적인 공식 하나만이 펫숍에 통용된다.
가령, 인기가 많은 포메라니안·말티푸(말티즈와 푸들을 교배시킨 믹스견)·비숑프리제 등은 120만원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피부병 등 질환을 가진 6개월령 말티즈는 40만원으로도 팔리고 있어 가격 차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지역 한 펫숍 관계자는 "동물의 나이, 상태 등에 따라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사진 촬영은 금지한다"면서 "구매 계약을 확정한 고객에 한해 출신 번식장 정보를 제공한다. 매주 화요일에 동물들을 (경매장에서) 데려오기 때문에 수요일에 방문하면 동물들이 가득 차 있다. 저희는 허가받은 생산업장, 경매장에서만 데려온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방문한 다른 펫숍 관계자도 "다른 펫숍과 달리 저희는 직접 허가받은 경매장에서 동물을 데려온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 번식장과 경매장 문제를 의식하듯 답변을 내놨다.
펫숍 유리박스 속 나란히 진열된 강아지들을 보며 "이 친구는 아파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냐", "강아지를 처음 키워봐서 그런데, 이 친구는 혼자 집에 둬도 되는 성격이냐" 등을 물으며 강아지를 고르는 사람들의 모습도 여럿 포착했다.
이는 동물관련 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국가가 규제를 가하지 않은 채 방치해 놓은 결과일 수도 있다.
→ 관련기사 ('한국형 루시법' 종사자 반발에 지지부진)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