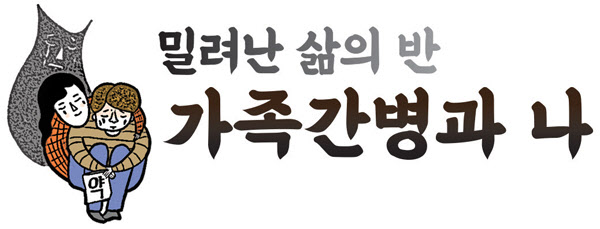정부 간호간병 통합, 실효성 부족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사용률 저조
인식 전환·완충지대 마련 등 필요

'간병할 자유'.
가족을 간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 두 집단 사이에 불평등의 벽을 세운 건 그저 단순히 '가족 간병의 여부'가 아니다. 불평등의 핵심은 '완충지대', 다시 말해 한 사람이 가족 간병을 할 동안 사회·정신적으로 소모되는 시간과 감정을 뒷받침해줄 사회 안전망이 없다는 데서 시작한다.
완충지대를 일구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 그리고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조화가 필요하다.
정부도 가족 간병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담 간호 인력이 가족의 간병을 대신하는 것이다. 비용 역시 민간업체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80%가량 저렴하다.
하지만 반쪽짜리 정책이란 비판이 꾸준히 터져나온다. 가족 간병 때문에 일상이 흔들릴만큼의 중증 질환은 그 대상이 못되기 때문이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홀로 13년 동안 돌봐온 경험을 토대로 에세이 '아빠의 아빠가 됐다'를 쓴 조기현 작가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경증의 일부 병원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처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 병원에서, 그리고 '간병 살인'을 막을 정도의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는 높지만 양질의 간호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지난해 5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발표한 '간병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2%가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적절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가족 간병을 도맡고 있거나, 갑작스레 가족 중 누군가가 쓰러질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 '가족돌봄휴가' 제도도 있다. 정책과 현실은 꽤 다르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에서 지난 8일 발표한 '공공기관 돌봄휴가제도 활용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책 시행 이후 4년간 중앙공공기관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비율은 평균 12.7%로 보고됐다. 10명 중 1.5명 정도만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실정이다. → 표 참조
사용률이 높지 않은 까닭은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면,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장기적인 간병이 아닌 이상,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때는 사용하기 어렵게 설계됐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휴가를 낸 기간의 급여에 대한 규정이 없다. 급여 지급 수준을 개별 사업장이 정한다는 것인데, 급여가 낮게 책정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내야 할 경우 해당 제도를 사용하기 꺼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단지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간병이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 간병을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철학적 접근'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데 가족간병인들은 한목소리를 낸다.
'간병할 자유'는 조기현 작가가 만든 조어다. 말하자면 '간병=가족' 공식에서 벗어나, 한 개인이 위험 부담 없이 간병을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 자체가 사람한테 너무 죄책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부담감 없이 간병을 기꺼이 할 수는 없는 걸까'. 가족 간병을 하겠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은 개인의 손실이 너무도 커요. 직장을 포기하고, 일상을 포기하고, 계속 모든 걸 다 포기해가는 점진적인 포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랜 기간 한국 사회를 둘러싸고 있던 '간병=가족'이라는 인식이 여러 고정관념을 만들어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조 작가는 꾸준히 "나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이라고 외쳤다.
"아들이어서 13년간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 '가족이 (간병) 해야지', '남들보다 어른스럽네, 효자네' 이런 말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아빠'이기 전에 내 눈 앞에 누워 있는 '사회적 약자'이고, 제가 아버지를 돌보는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가 이런 약자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깐 효자, 효녀 같은 말로 개인의 몫, 가족의 책임으로 떠맡겨지는 부분에 대한 부당함이 컸어요. 우리 모두가 그냥 보통 시민으로서 가족 간병, 돌봄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어떨까 싶었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선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을 책임지는 사회적 '완충지대'가 수반돼야 한다.
/공지영·유혜연·한규준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