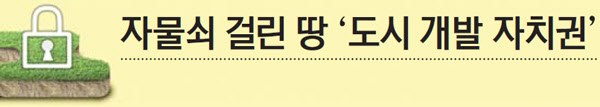꿈, 추억 그리고 '보람채 아파트'
40년전 구로공단 청년노동자들
닭장집·기숙사 등 좁은 곳 생활
철산리에 생긴 아파트 들어가자
한 집 5~6명 지내도 '여유' 생겨
보금자리 마련 기반 돼 준 공간
꽤 오랫동안 우리 마을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마을과는 선이 그어져 정체조차 알 수 없었던 공간들이 경기도 곳곳에 있다. 국유지이거나 서울시가 소유한 땅들인데, 이들의 기능은 오로지 국가, 서울시민을 위한 것들이다.
워낙 오랫동안 그래와서 그러려니하며 살았다. 그렇게 서울 변방, '위성도시'로 태어난 숙명을 안고 참아왔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도시와 시민은 성장했다.
이제 경기도의 도시들은 독립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했고 주도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해졌다. 경기도 도시들이 빼앗긴 '도시개발의 자치권'은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 편집자 주
일당 3천300원, 월급 9만9천원. 아침 8시30분에 출근해 밤 10시는 넘어야 끝이 나는 근무. 40여년 전 그때를 생각하면, 오정애씨는 참 고되고 힘들었어서, 이보다 못할 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현재'를 산다고 했다.

정애씨는 지금은 가산디지털단지로 이름과 모습을 바꾼, '구로공단'에서 일했다. 1986년, 스무살을 막 넘긴 즈음부터 8년여간 구로공단에서 청춘을 보냈던 그는 우리가 한번쯤 들어 본, 이른바 '여공'으로 불린 청년노동자다. 그리고 가진 것 없던 그 시절, 나아질 것이라 희망을 쥐어준 것이 3년간 살았던 광명 보람채 아파트였다.
"구로공단에는 주로 전자회사, 봉제공장들이 많아서 거의 여공들이 일을 했어요. 인건비가 워낙 싸니까. 가리봉 시장 쪽에 가면 복도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아주 좁은 방들이 늘어서 있는데, 화장실도 없고 몸 하나 뉘일 공간 정도…. 화장실은 보통 1층 공용화장실 하나로 같이 쓰는데, 그렇게 열악한데도 월세 아끼겠다고 2~3명씩 같이 살았어요."
이런 집들을 '닭장집'이라고 했고 또 가장 열악했다. 회사·구로공단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들도 간혹 있었지만, 수준은 거의 마찬가지였다. 정애씨도 한때 공단 기숙사에 기거한 적이 있지만, 그때를 회상하면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들었다.
"한방에 8~10명까지도 살았어요. 천으로 된 옷장 하나 놓고 누우면 끝나는 게 유일한 내 공간이었죠. 입사하고 한 6개월쯤 살았는데, 도저히 못살겠더라고. 그런데 철산리쪽에 아파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구로공단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입주자를 30명 뽑는데, 100명이 넘게 왔어요. 경쟁이 엄청 치열했는데, 제비뽑기로 뽑혀서 운좋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보람채 아파트 첫 입주자가 됐어요."

보람채도 46.2~49.5㎡(14~15평)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다. 그래도 방 2개·싱크대 있는 주방·화장실까지 있었다. 머리 뉘일 곳밖에 없던 이전 숙소에 비하면 대궐 같은 곳이라고 여기며 만족했다. 물론 이 곳에서도 한 집당 보통 5~6명이 살았는데, 정애씨는 5명이 함께 살았다고 했다. 좁은 화장실을 다 같이 써야 해서 아침이면 출근전쟁을 벌여야 했지만, 퇴근하면 도란도란 모여서 국수도 삶아먹고 빨래도 널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 행복했다.
그러나 공단에서의 근무는, 어린 나이의 여성청년이 감당하기엔, 많이 고되고 서글펐다. 오후 6시라는 퇴근시간은 서류상의 시간일 뿐이었다.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야간근무는 선택권조차 없었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 쉬고 싶어도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분위기조차 되지 못했다.
공장 관리자들은 어린 여공들을 이름 대신 "야"라고 하대하며 욕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일쑤였다. 또 대부분의 이들은 워낙 낮은 임금을 만회하려 야간근무를 해야만 하는 상황들에 놓이기도 했다.

그렇게 서울로 실려오다시피 온 공장노동자 상당수가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오빠 혹은 남동생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거나 딸린 동생들을 먹여살려야 하는 사연들이었고, 이들이 '닭장집'과 '철야근무'를 견뎌야 하는 이유들이었다.
그렇게 혈혈단신 서울로 상경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기반이 돼 준 것이 보람채였다.
"그렇게 고생했어도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시간은 참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보람채의 3년이 우리들의 기반이 돼줬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면서 조금씩 서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도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 관련기사 (청년의 꿈 머물렀던 안식처 '보람채'… 이제는 방치된 '도심 속 섬')
/공지영·김성주·이시은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