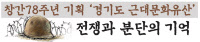뺏벌마을을 이렇게 설명해보면 어떨까. '빼뻘은 주름이다', '빼뻘 마을 산은 도봉산보다 좋다', '빼뻘 마을은 사람과 사이에 풋풋한 정이 있는 곳', '처음처럼 왔다가 빼뻘처럼 가는 거지'.
15일 의정부시 고산동 508-75번지 뺏벌마을을 찾았다. 실은 저 문구는 뺏벌마을에 만들어진 예술가와 주민의 공간 '빼뻘보관소' 창문에 적힌 글귀들이다. 하나하나 차근히 설명해보자.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6만7천여㎡에 걸쳐 건물 130여채, 490여명의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뺏벌마을이다. 미군 캠프 스탠리 후문을 기점으로 형성된 기지촌인데 부대가 산 위에 있어 가파른 언덕배기에 좁다란 길목을 따라 상점들이 죽 늘어서 있다.
한때 이태원 방불… 미군 떠나며 쇠락
고산동 일대 130여채·490여명 거주중
토지의 대부분 '전주 이씨 문중' 소유
주민들 땅값 치를 형편 안돼 세입자로
예술가들과 연대, 마을 기록하고 지켜
다양한 삶의 흔적 SNS 'ㅃㅃ보관소'에
'처음처럼 왔다가 빼뻘처럼 가는 거지'
이들의 노력에도 위태로운 기억·역사

1960년대부터 형성됐는데 2006년 평택기지 건설이 결정된 이후 미군 대다수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뺏벌마을도 쇠락하기 시작했다. 송산로 남쪽에 위치한 마을은 동서방향으로 긴 형태에 마을 서쪽 끝엔 캠프 스탠리로 이어지는 문이 있다.
좁은 골목·작은 상점은 서울의 이태원이나 해방촌을 떠올리게 한다. 구릉에 자리 잡은 마을은 수락산 도정봉과도 이어진다. 영어로 표기된 상점의 간판과 메뉴를 보건데 평소 미군 이외에 마을을 찾는 외지인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미군기지 이전 이후 급격한 쇠락기를 겪고 있는 마을은 마을 턱 밑까지 밀고 들어온 고산지구의 고층 아파트와 대비된다. 마을 능선에서 바라본 풍경이 초현실적이다. 60년대 풍경을 간직한 골목 사이로 비친 브랜드 아파트들은 서로 다른 2개의 사진을 합성한 것 같은 착각을 부른다.
뺏벌의 유래는 배나무가 많은 마을이라는 설과 한 번 들어오면 발을 못 뺀다는 두 가지 뜻으로 전해지는데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뺏벌마을은 '빼뻘'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형성된 지 반세기가 넘어 쇠락한 마을을 기록하고 지키는 건 이 마을에서 주민들과 느슨한 연대를 이룬 예술가들이다.
서두에 밝힌 '빼뻘보관소'는 예술가들이 기록을 위해 만든 마을 속 공간이다. '빼뻘은 주름이다'라는 말 속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 마을에서 주민들과 유대하며 기록을 업으로 삼은 예술가들은 페이스북 'ㅃㅃ보관소'(facebook.com/Hyunjoodalo)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

지난해 4월 19일 작성된 'ㅃㅃ보관소' 게시물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방이 열두 개가 넘었다고 한다. 70년 넘은 오래된 집 열세 개 방이 품고 있는 이야기들이 참도 많을 텐데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할아버지께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다. 직접 지으신 이 집이 곧 새집이 되고 귀한 물건들이 사라지기 전에 눈 사진이라도 잔뜩 찍어둔다."
뺏벌마을 정착민들은 대개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했다.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다는 마을 이름처럼 떠난 미군, 쇠락한 마을을 벗어나지 못한 정착민이 여전하다. 'ㅃㅃ보관소'는 그 중 고중주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올해로 빼뻘마을에 정착하신 지 48년 되신 고중주 어르신. 미군 철수 이전까지 이불집을 운영하셨다. 사진에 어르신 뒤편으로 알록달록 이불이 가득 쌓인 가게-서울이불집 모습 발견! 빼뻘이 예전에는 명동처럼 골목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걷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이곳에 오면 돈을 벌 수 있다, 장사가 잘 된다는 친척 권유로 전라도에서 의정부 빼뻘마을에 오게 되셨는데 장사가 정말 잘됐다고 한다."
마을에서 '빼뻘보관소'를 운영하고 온라인 공간 'ㅃㅃ보관소'에 마을에 담긴 '사람과 사이에 풋풋한 정'을 기록하는 예술가들은 이 오래된 마을을 통해 기억과 기록, 공생을 이야기 한다.
"가난이 수단이 되지 않길. 사업이 목표가 되지 말길. 과정이, 공생이 목표가 되길"(페이스북 'ㅃㅃ보관소', 2022년 2월 15일)
뺏벌마을의 또 다른 특징은 전주 이씨 문중이 대부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ㅃㅃ보관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다.
"물가가 오르니 토지 임료도 어쩔 수 없는거 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 조금만 올렸으면 좋겠다는 마을 주민이 처한 상황이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그녀는 40년 가까이 마을에 살았고 모은 돈으로 미군담장 경계에 건물을 지었다. 미군이 떠나자 가게는 문을 닫았고 이후 마트 점원이 되었다. 2019년 이씨종중이 주민에게 땅을 매매하게 되었으나 평당 오른 땅값을 낼 도리 없는 주민들은 세입자가 되거나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주민들은 여전히 땅을 빌려사는 세입자로 오른 땅세를 견디며 산다. (중략). 지금 그녀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란 생의 긴 시간을 노동이라는 쳇바퀴에 몸을 맡기고 땅에 대한 시름을 망각하는 것일지 모른다. 원경의 풍경이던 아파트들은 이제 근경이 되어 마을로 마을로 다가오고 있고 미군부대 헬기 소음은 여전하다."(페이스북 'ㅃㅃ보관소', 2021년 10월 17일)

'처음처럼 왔다가 빼뻘처럼 가는거지'란 말의 원뜻은 그러니까 결국 뺏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얘기한 것이었다. 골목 사이사이 스며들었을 기억과 역사는 이를 기록하려는 예술가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위태롭다.
앞서 인용했듯 의정부 뺏벌마을의 삶과 기억을 기록한 온라인 공간이 있다. 서울에서 불과 30분이면 닿는 마을이지만 직접 가보기 어렵다면 페이스북 'ㅃㅃ보관소'만이라도 찾아보자. 뺏벌에서 발을 빼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이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르니.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