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반 맞고 반 틀려… 의료인력 확충 대수술 필요”
1999년 길병원과 인연… 지난해 7월 센터장 부임
최근 드라마 인기 덕분에 시민들 관심도 높아져
현실과 다른 부분 있지만 ‘인력수급 필요’ 공감
17일 오전 11시께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외상센터. 외상센터 내 공용 휴대전화가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다. 부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왼쪽 사타구니 열상과 출혈로 혈압이 낮아져 생명이 위급하다는 내용. 환자의 상태를 들은 현성열 인천권역외상센터장은 달리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카’와 외상센터 의료진을 즉시 해당 병원으로 출동시켜 환자 전원을 지시했다.
현 센터장은 “의료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타 병원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것보다 외상센터 소속 의료진이 전문 장비를 이용해 전원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환자 전원 요청을 한 병원에서도 응급학과 의사 1명만 근무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을 고마워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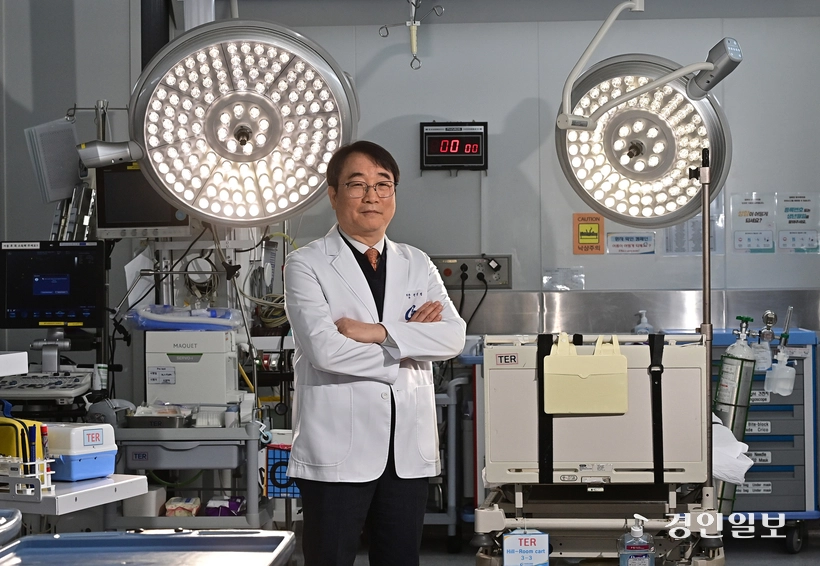
2015년부터 인천권역외상센터에서 일한 현 센터장은 지난해 7월 센터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지난 1999년 응급의학과 외상(Trauma & Acute surgery) 담당으로 가천대 길병원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길병원 응급의료센터는 국내 최초로 일반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소아과, 영상외과 등 6개과 전문의를 응급의학과에 배치해 중증환자의 신속한 처치와 입원을 도왔다.
2011년 길병원에 전국 최초 닥터헬기가 도입된 이후에는 서해 권역에서 발생하는 중증환자를 응급의료센터에서 도맡았다. 2012년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건의 중상 환자 역시 닥터헬기로 길병원에 이송돼 당시 흉부외과 교수인 현 센터장이 집도를 맡아 생명을 구했다. 인천권역외상센터 탄생 전부터 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기틀이 길병원에서 이미 마련되고 있었던 셈이다.
현 센터장은 “응급의료센터만 있던 시절에는 서산과 당진 등 충남의 중증환자 90%가 닥터헬기를 통해 모두 길병원으로 왔다”며 “전국에 권역외상센터가 생긴 이후 환자가 분산돼 인천권역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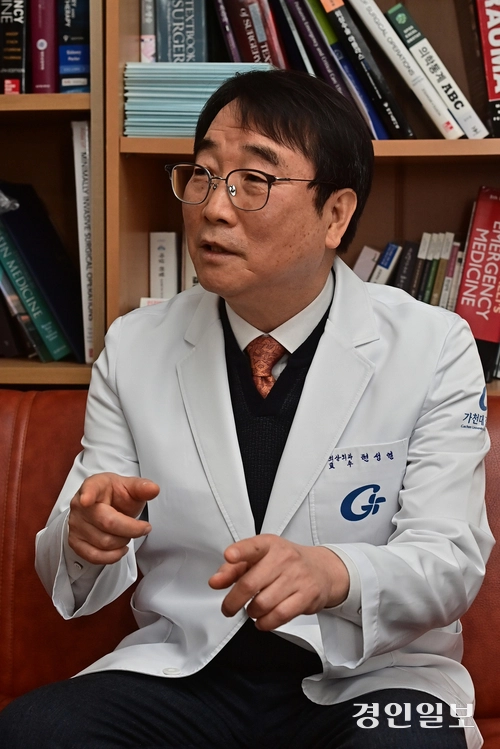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큰 인기를 끌면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와 추락 등으로 다발성 골절, 과다출혈 등이 발생한 중증외상 환자가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의료시설이다.
응급실에 오는 환자 중 중증도 점수(ISS, Injury Severity Score)가 15점 이상으로, 생명과 직접 연관이 되면 권역외상센터에서 맡아 조치한다. 응급의학과에서 운영하는 닥터헬기로 이송된 환자 역시 중증도에 따라 외상센터에서 담당한다.
현 센터장은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를 시청했느냐는 물음에 “1화 밖에 못 봤지만 외상센터 의료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드라마가 현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데, 가령 인체에 꽂힌 흉기를 수술실 밖에서 뽑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응급구조사에게도 비슷한 상황 발생 시 몸에 박힌 물체를 최대한 고정한 상태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권역외상센터 영향 ‘예방가능사망률’ 30→6% 뚝
센터엔 골절 환자 많지만 정형외과 의사들 부족
비외상 진료시 페널티 등 정부 정책 변화 호소도
인천권역외상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치료한 외상환자는 3만298명, 이 중 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 환자는 5천604명이다. 최근에는 중증외상 환자 발생 시 권역외상센터로 직결되는 이송 체계가 자리 잡아 연간 외상환자만 2천명 이상, 그 중 중증외상 환자가 800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시 예방할 수 있는 사망’을 뜻하는 예방가능사망률은 전국 기준 2011년 35.2%에서 권역외상센터의 영향으로 2021년 13.9%까지 낮아졌다. 인천권역외상센터의 경우 개소 당시 30% 정도였던 예방가능사망률이 현재는 6%대로 줄었다.
현 센터장은 외상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권역외상센터에 소속된 의료진은 전문의 21명, 외상외과 전담간호사(PA) 15명, 외상시설 전담간호사 16명, 외상집중치료실 간호사 52명 등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적자는 면하고 있지만, 인천을 포함한 전국 권역외상센터 모두 의료인력을 수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센터장은 “인천은 수도권에 위치해 다른 권역외상센터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생명을 살린 후 추가 치료를 하기 위한 의료진이 부족하다”며 “외상센터에 오는 환자 중 골절이 많다. 중증환자의 혈압을 잡고 생명을 살린 다음에 수술에 들어갈 정형외과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외상센터에 1명 밖에 없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 외상센터 지침에서는 정형외과 의사를 최소 1명 이상 두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 센터장은 최근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외상센터에서도 정형외과 부족 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금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내 일반병상을 줄이고 중증진료 비중을 늘리는 내용이다.
한 예로 정형외과는 중증질환 비중이 낮다.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지 못한 정형외과를 홀대하게 되고, 결국 외상센터에 들어올 필수 의료인력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현 센터장은 “외상환자 발생 시 의사 3~4명에 간호사 4~5명이 붙는데, 정형외과는 물론 안과까지 모든 진료 과목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안 돼 있다. 결국 정부의 병원 평가에서 외상센터를 우대해주고 이와 관련된 의료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현 센터장은 외상센터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 센터장은 “외상센터 의사가 비외상 진료를 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회수하는 페널티가 있는데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외상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세운 의료 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병원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통을 지속하며 정책을 개선해야 하지만 의정갈등으로 이러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현 센터장은 “인천권역의료센터를 담당하는 동안 외상센터 의료인력 확충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다”며 “외상센터에서 살린 생명이 배후 과목과 연계 진료로 이어지고, 의료진 역시 충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현성열 인천권역외상센터장은?
▲1988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9년 흉부외과전문의 취득
▲2005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2009년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취득
▲2011년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
▲1999~2013년 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Trauma & Acute surgery 담당
▲2002~2015년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수
▲2000~2013년 가천대 길병원 응급중환자실장
▲2011~2013년 가천대 길병원 전체 중환자실장
▲2015년~현재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외상학 교수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이슈추적] 갈 길 먼 반도체 ‘주 52시간’에 멈췄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0/news-p.v1.20250220.ea7a64e450c84f9bb932f29dc03ff983_R.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