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남정맥의 정기를 타고 났는지 이 마을에서는 학처럼 고고하게 살다가 짧은 인생을 마친 오달제(1609~1637) 선생이 태어나고 자랐다고 한다. 지금도 집 자리며, 강당 자리, 연못 자리 등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는 다른 집들이 들어섰는데 강당 자리 부근에는 네모나게 잘 다듬은 돌들이 지금도 여러모로 쓰여서 예사롭지 않음을 드러낸다. 오달제 선생이 누구인가? 25세 때 장원급제하고 28세인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맞서 조선의 기개를 당당하게 드러낸 삼학사(윤집, 홍익한, 오달제) 중 한 분이다. 그는 청나라에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외로운 신하 의리 바르니 부끄럽지 않고(孤臣義正心無?)/ 성주의 깊으신 은혜 죽음 또한 가벼워라(聖主恩深死亦輕)/ 이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最是此生無限慟)/ 홀로 계신 어머님 두고 가는 거라오(北堂虛負倚門情)'라는 시를 지어 당시 사람들을 꽤나 울린다.

또 부인인 의령 남씨에게 보낸 시에서도 눈물샘을 자극한다. '우리 금슬은 구구 비둘기/ 만난 지 2년 만에 만리 밖 헤어져서/ 백 년 살자던 약속 무너졌네/ 길이 멀어 편지도 보낼 수 없고/ 산이 높아 꿈길도 더디구나/ 내 목숨 나도 모르는 일임이여/ 뱃속의 아이 잘 길러주오'
그 유복자는 딸로 태어나 가계는 양자로 이어갔다. 시신도 청나라에서 수습하지 못하게 해 모현면에 있는 선생의 묘소에는 관대와 비단주머니만 모셨다.

# 청정마을 학일리
학과 백로 등이 서식하여 '학일' 또는 '학동'이라고 하였다는 이 마을에는 55가구 가운데 60%가 오달제 선생의 가문인 해주 오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아간다. 해주 오씨의 입향조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마을에는 무관으로 시위사좌영호군 벼슬을 한 오희보 선생의 묘가 보인다. 그는 조선 초기의 인물로 전해지는데 그 무렵에 해주 오씨들이 이 마을에 자리잡지 않았나 추측한다. 오희보 선생의 묘 앞 문인석은 웃음을 머금은 모습에 긴 턱으로 조성해 익살스러운 표정이다. 또 마을에는 청주 한씨와 경주 정씨 등 집안이 서너 가구, 김씨, 공씨, 손씨 등도 한두 집 서로 어울려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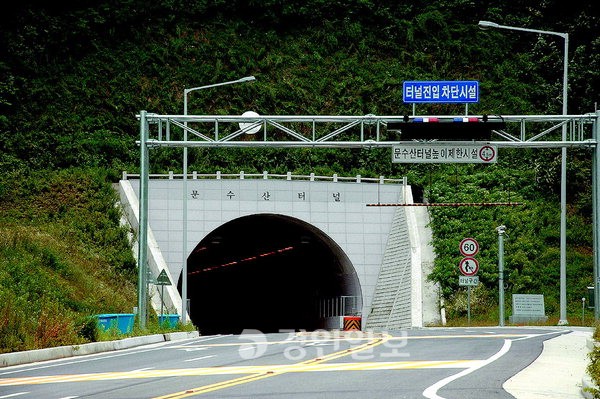
이 마을은 5년 전 정보화마을로 지정돼 40여 대의 컴퓨터가 지원됐으며 교육도 이뤄졌다. 노인회장인 오세승(74)씨도 자유게시판에 자주 글을 올릴 정도로 '소통'하는데 농사짓는 틈틈이 마을의 역사며 지명유래, 개인적인 소회 등을 담는다. 그는 "마을 노인회원이 51명이며 이는 마을 주민의 48%라며 여느 농촌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되었다"고 한숨이다. 65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회에 가입되니 그럴 만도 하다. 노인회 회원들은 늦가을부터 겨우내 경로회관에서 점심을 함께 한다. 마을 공동논에서 수확한 5~6가마니의 쌀과 시청의 지원을 받아 김장 등 밑반찬을 준비하고 별식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마을 부녀회에서 공동으로 노인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오세승씨 자신도 2만3천㎡(7천여평)의 논농사를 짓고 작은 복숭아밭도 가꾸는 등 아직은 '현직' 농부이다.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도 직접 사서 사용하는데 늘 할부를 갚고 나면 또 새 기계를 할부로 사야 하는 악순환에 시달린다. 이는 우리네 농촌 대다수의 현실이기도 하다.

# 정보화마을 학일리 체험
학일리 정보화마을 위원장인 오용근(60)씨는 오세승 노인회장의 손자뻘 되는데 이 마을이 청정마을이라며 자랑이 한창이다.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도 키우지 않는 농촌은 이곳밖에 없을 것이라며 올 봄에 양계장이 들어오려는 것도 막아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마을에서는 농촌 특유의 냄새가 없고 파리나 모기도 적은 편이다. 게다가 마을 위의 학일2호 저수지에서는 낚시도 못하게 한단다. 전에 낚시터로 개방했을 때는 늘 물이 썩고 냄새가 났는데 이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자랑이다. 다만 쌍령산 줄기를 따라 고압선이 지나는데 그 탓인지 계곡에 지천이던 가재가 자취를 완전히 감추었다고 슬픈 표정을 짓는다.
오용근씨 역시 1만6천㎡(5천여평)의 논과 4천900㎡(1천500평)의 밭농사를 짓는 농부이다. 그는 오토바이에 늘 삽을 달고 다니는데 꼭 자신의 논이나 밭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라고 한다. 역시 든든한 외모만큼이나 이장 겸 위원장으로서의 듬직함과 믿음이 가는 구석이다.

마을의 농사는 모두 유기농법으로 짓는다. 당장은 힘들고 수확이 적더라도 올바른 식탁을 위한 선택이며 후손에게 청정한 땅을 물려주려는 마음들이 뭉친 결과이다. 그래도 농사는 이문이 남지 않는 사업이다. 그래서 용인시청과 손잡고 이끌어가는 사업이 체험마을 운영이다.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장 담그기 체험부터 미꾸라지 잡기 체험이나 인절미 만들어 먹기 등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체험은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대부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더구나 시설이 좋고 잘 알려진 마을에 비해 이곳은 아직 덜 알려졌다. 그래도 연간 3천500여명의 체험객이 다녀간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황토방은 일종의 콘도식 펜션으로 33㎡(10평)짜리가 하루 묵는데 5만원, 72㎡(22평)짜리가 8만원이다. 가까운 사람끼리 와서 한적함을 만끽하기에는 좋은 여건이다. 또한 용인이나 수원, 서울에서 접근하기에 좋은 지리적 이점도 한 몫을 한다.

요즘은 도시건 농촌이건 사람이건 '튀는' 것이 유행이다. 그러나 학일리는 평범한 옛 농촌의 자취가 풍긴다. 큰 볼거리도 먹을거리도 없지만, 역설적으로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이자 살고 싶은 마을이다.

글/염상균 (사)화성연구회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