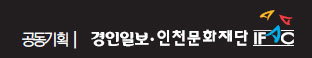[경인일보=글┃조성면(문학평론가·인하대 강의교수)]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세밑. 겨울을 재촉하는 막바지 체로금풍(體露金風)에 서울역 주변의 헐벗은 나목(裸木)들이 진저리를 치며 몇 개 남지 않은 나뭇잎마저 훌훌 떨어내고 있었다. 떠남과 이별이 어찌 수월하랴만 떠나야 만남이 있을 것이고, 오늘의 아쉬운 이별이 있어야만 내년의 신록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기차역은 이 같은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떠남과 귀환의 역설을 가장 잘 체현하는 곳이다.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정거장', 안정애의 '대전 블루스', 나훈아의 '고향역', 다섯손가락의 '새벽기차' 등 만남을 희구하는 이별의 노래들에서 유독 기차가 많이 등장하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리라.
한국철도의 상징 서울역은 만남과 이별을 가장 많이 겪은, 그리고 오래도록 지속하는 거대한 역설의 공간이다. 뿐인가. 경인선·경부선·호남선 등 모든 노선의 종착점이자 시발점이며 식민의 굴욕과 한국전쟁의 상흔과 고도성장의 영광과 무작정 상경의 아픔이 교차하는 살아있는 역사였으며, 또한 '서울의 봄'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신군부의 등장 같은 정치적 겨울의 빌미가 됐다는 점에서 서울역은 한국철도사와 한국현대사의 상징이요 모순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그 서울역이 철도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1900년 11월 12일 경인선 전통식과 함께 '남대문정거장'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개시하면서 부터이다. 그런데 아무리 언어생활의 편의성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남대문이란 말은 영 마뜩지 않다. 숭례문이란 어엿한 이름이 있는데, 남쪽에 있는 큰 대문이라니.

전통사회에서 공공건물과 기관의 이름은 절대로 범상한 것이 아니다. 그곳에는 우주의 철학과 동아시아의 사상이 배어 있으니, 근대 이전 도시공학이자 대원칙이었던 '주례'의 '고공기(考工記)'를 한 예로 꼽을 수 있다. '고공기'에 의하면, 도성의 공간구성은 좌묘우사(左廟右社)와 전조후시(前朝後市)가 기본적인 대원칙이다. 즉 왕성을 남향으로 향하게 하고 그 왼편에 종묘와 오른편에 사직단을 두고, 전면에는 조정과 관아를, 그리고 왕궁의 후면에 시장을 배치하는 공간구조가 바로 그러하다. 경복궁과 도성은 '고공기'와 풍수의 원칙을 절충하여 조성되었다.
그런가 하면 도성의 사대문은 철저히 음양오행론에 따라 명명되었다. 오행이란 목·화·토·금·수를 말하는데, 이를 방위로 환산하면 목은 동쪽이고 화는 남쪽이다. 토는 중앙을, 그리고 금과 수는 각각 서쪽과 북쪽이다. 이는 다시 인·의·예·지·신이란 유교의 오상(五常)으로 환원될 수도 있다. 한양의 주요 건물은 이 같은 음양오행론과 오상에 의거하였는데, 도성의 정문인 남대문은 남쪽을 뜻하는 글자인 예자를 따서 숭례문이라 했다. 동대문은 좌청룡인 낙산이 약해 이를 비보한다는 의미에서 동쪽을 뜻하는 인자에 갈지자를 더 추가하여 흥인지문으로, 서대문은 의자를 따서 돈의문으로, 북대문은 지자를 따서 홍지문(후일 숙정문이 정문으로 변경됨)으로, 그리고 도성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시간을 알려주던 종각은 중앙을 의미하는 신자를 취하여 보신각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이 같은 오행은 산에도 적용되는데 서울이 마주보고 있는 관악산은 오행의 관점에서 보면 불기운이 아주 강한 화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악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 숭례문의 현판을 세로로 세우고, 광화문 앞에 수신인 해태상을 조성해 두었으며, 숭례문과 서울역 사이에 큰 연못을 팠다고 전해진다. 남쪽이라 화기가 강한데 화산인 관악산을 마주하고 있으니 숭례문 보존의 핵심은 옛날부터 넘치는 화기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런 숭례문이 2008년 2월 10일 기어코 가슴 아픈 화재를 당하고 말았으니 참으로 공교로울 따름이다.
수도 서울의 관문이며 정문이었던 숭례문에 기차역이 들어선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긴 한데, 위와 같은 역사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를 남대문정거장이라는 편의주의적 이름을 붙였으니 이 역시 비주체적으로 맞이한 철도시대가 만들어낸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경인선의 정차역 남대문정거장이 게이죠 에키 곧 경성역으로 부상한 것은 1905년 1월 1일부터 경부선이 운행을 시작하면서부터이며, 도성의 상징이며 관문 앞에 거대한 역사를 세우게 된다. 경성역(서울역)은 일본 도쿄역과 한국은행 본점을 설계한 다쓰노 긴코(辰野金吾)의 수제자인 츠카모토 야스시(塚本靖)의 작품으로 1922년 6월 착공을 시작하여 1925년 9월에 완공되었다. 1923년 간토대지진으로 당초의 계획보다 1년이 늦어졌지만, 원형 돔 지붕과 화려한 네오 비잔틴 양식에 대지면적이 3만3천332㎡요 건물이 약 6천784㎡에 이를 만큼 웅장하였다. 이로 인해 경성역은 착공 당시부터 '아시아 제1역은 도쿄역이요 제2역은 경성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간에 큰 화제를 뿌렸다.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경성역 1등 및 2등 대합실도 주목거리지만, 국내 최초의 양식당으로 알려진 2층 그릴과 티룸(다방)은 한국 근대문학의 작품 무대로 심심치 않게 등장하였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국근대소설이라 할 수 있는 염상섭의 '만세전'(묘지란 이름으로 1922년 발표됐으며 1924년 만세전으로 개작됨)과 지독한 반어와 리얼리즘이 돋보이는 현진건의 '운수좋은 날'(1924)이 남대문정거장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라면, 한국 모더니즘 소설을 대표하는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34)과 이상의 '날개'(1936)는 경성역 시대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명동(혼마찌)의 미쓰코시 백화점, 인천의 각국조계, 그리고 경성역 같은 근대적 건축물과 풍물이 없었다면 아마 한국 모더니즘 문학은 성립되기 어려웠거나 실체 없는 관념의 문학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들이야말로 척박한 식민지 조선에서 우리 근대문인과 예술가들이 서구의 근대문화와 모더니즘을 경험할 수 있었던 희귀한 공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인선과 경성역의 등장은 한국 근대문화의 촉매였던 것이다.
남대문정거장에서, 게이죠 에키와 1946년 서울역에 이르기까지 숱한 파란을 겪었지만 경인선과 함께 시작된 서울역은 명실상부한 한국철도의 중앙역으로 또한 경성역 택시 노동자 파업과 1980년대 서울의 봄 당시의 최대 규모 군중 집회에 이르기까지 광장의 정치와 철도사를 연 역사의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마땅히 경인철도의 아니, 한국철도의 클라이맥스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