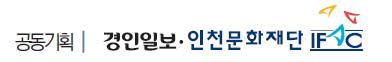[경인일보=글·사진┃조성면(문학평론가·인하대 강의교수)]황석영의 장편소설 '오래된 정원'에 이런 구절이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조용한 보통의 날들"이라는. 작가는 특별한 의식없이 이 문장을 썼겠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멋진 행복론이다. 행복은 미래의 일도, 특별한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이다.
멋지고 찬란한 내일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여기의 현실을 외면하고 살다가 몸이 아프거나 큰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조용한 보통의 나날들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절감하게 된다.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행복은 바로 그 순간에 역설의 베일을 벗는다. 조용하고 평범한 보통의 날을 잃었을 때 그 조용하고 평범한 범사가 참 행복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수인선도 그랬다. 작은 기차의 공백이 미처 이토록 클줄 몰랐다. 효율성과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문화적 비중과 정서적 가치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 철도문화유산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팔순을 앞둔 수인선 기관사였던 동네 아저씨와의 인터뷰가 불발로 그친 다음, 그런 반성과 자책과 함께 이제 더 늦으면 수인선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남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책임감에 공연히 마음이 조급해진다.
12월 12일 우리 가족의 수인선 답사는 그런 조급함 속에서 돌발적으로 이뤄진 심심한 여행이었다. 일단 가족들 중에서 수인선에 대한 경험이 제일 풍부한 아버지 남당(楠堂) 선생을 모시고 노선을 따라가면서 사진도 찍고 핑계김에 소래까지 가서 회 한 접시 먹고 내려오는, 밑져도 본전이요 빈손이어도 좋을 나들이 길을 나선 것이다.

우선 어린 시절 친구들과 '고새기'라 부르며 가끔 오가던 수인선의 첫 번째 정거장 고색역부터 가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시작부터 대박이었다. 아직 철거되지 않은 협궤열차 레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쾌재를 부르며 정신없이 셔터를 누르고 있는데, 일요일 오전 불각시에 운전기사로 끌려 나온 동생이 심드렁한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이 근방에 자기가 가끔 들르던 '수인선 닭발집'이란 맛집이 있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이제 얘기하느냐며 동생을 앞장 세웠다. 휴일 이른 시간이라 문이 굳게 닫혀 있어 음식을 맛보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세월에 맞서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인선의 건재가 여간 고마운 게 아니었다. 그와 동시에 수인선이 자취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이곳 고색역의 레일을 잘 활용하여 레일 바이크라도 놓고 가족 휴식공간으로 또 지역 명물로 키워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효율과 이익만 좇는 이 성장지상주의 시대에 늘 연착하면서도 여유를 잃지 않았던 수인선 시대의 느림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본다.

수인선의 두 번째 정거장 오목동역은 근동의 하천들이 오목하다고 해서 '오목내'로 불렀던 동네에 들어선 임시 정거장이었다. 맥수지탄(麥秀之嘆)이라더니 지형과 건물들은 그대로인데 이 근동 부대에서 복무하던 시절 동기들과 가끔씩 쉬어가던 다방들은 이미 다 사라지고, 수인선도 겨우 과거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곳 오목역은 임시 정거장이지만 수인선의 유일한 터널이 있었던 곳이다. 이상락의 단편소설 '천천히 가끔은 넘어져 가면서'에 보면 오목동역 터널에 얽힌 에피소드 하나가 등장한다. 이곳은 오래된 터널이라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샜고 그 바람에 철로가 미끄러워 기차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고가 잦았다. 그러던 어느 날에는 기차바퀴가 심하게 공회전을 거듭하는 바람에 불완전 연소된 매연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차장이 질식해 쓰러지는 사고가 난다. 급한 마음에 기관차 조수가 기름때 묻은 장갑을 낀 손으로 근처의 도랑물을 떠다 입에 떠먹여 차장을 살려냈고,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모두 내려 낑낑거리며 기차를 밀어 간난신고 끝에 겨우 터널을 통과했다. 터널이 빠져 나오긴 했으나 승객들의 옷이 엉망이 되었을 것임은 불문가지. 그러나 수인선 시대는 지금과 달리 무공해 인간시대라 수원역에 도착해서도 어느 누구도 항의하는 사람 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너털웃음을 웃으며 헤어졌다던가. 이 휴먼 트레인의 전설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터널이 있던 곳에는 국순당 공장이 들어서 있어 그저 무공해 인간들이 살던 시대의 인간적인 이야기만을 풍문으로 전할 뿐이다.

어천역은 이보다 더 인간적이다. 구한말까지는 어량천(於良川)이라 불리어오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동리 앞 하천에 고기가 많다 하여 어천리(漁川里)가 됐다 하는데, 아직도 시골의 한적함과 고즈넉함을 간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인선 시대의 역사(驛舍)며 통신선이며 건널목 표지판 등이 그대로 남아 낯선 방문객을 담담히 맞이한다. 수인선 어천역의 압권은 바로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어천역이다. 지금은 민가로 변해 사람이 살고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분들의 사생활을 절대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곳을 근대문화 유산으로 등재하는 것과 같은 보호조치가 꼭 취해졌으면 한다.
야목역은 경기도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시골마을이며 자연취락이다. 야목(野牧)이란 이름은 소나 가축을 많이 방목해서가 아니라 마을 앞에 넓은 들이 펼쳐져 있고, 산기슭에 초목이 무성하여 소를 키우면 좋겠다하여 야목리란 이름이 붙었다 한다. 마을회관 근동에 사는 한 어르신은 이곳은 원래 바다였는데 왜정때 간척지를 만들어 넓은 들이 생겼고 겨울이면 한량들이 이곳에 활을 쏘며 놀았다고 회고한다. 수인선이 다닐 적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수원이나 안산에 나가려면 차를 세 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오지가 되었다며 끌탕이시다.
좀더 취재했으면 더 좋았으련만 오후부터 산불대기 당직을 서야 한다는 공무원 동생때문에 칼국수로 서둘러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 가족의 수인선 답사 여행은 그렇게 심심하게 끝이 났다. 돌아오는 길 철인 맹자가 말한 군자삼락(君子三樂)은 고사하고 그저 부모가 계시고 형제가 탈이 없는 일상만 지속돼도 이 얼마나 홍복이냐하며 본가에서 대구탕이나 끓여 저녁이나 먹자고 했다.
우리에게 수인선은, 바로 그런 기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