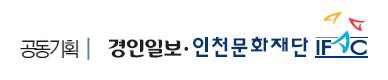[경인일보=글·사진┃조성면(문학평론가·인하대 강의교수)]사리가 문학적이고 일리가 지적이라면, 소래는 낭만적이다. 소래포구는 일단 포스가 다르다. 우선 해풍이 들려주는 노래와 속삭이듯 다가오는 풍경이 발길을 멈춰 세운다. 저녁노을과 잘 어울릴 것 같은 낡은 철교와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어선을 바라보노라면 왠지 허기가 느껴진다. 가슴 속에 있지만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옛 추억처럼 가져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공복감을 만들어내는 것이리라. 여기는 수인선 소래역이다.
철도의 등장은 이전까지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광경이었다. 열차가 질주하면서 시시각각으로 펼쳐지는 차창 밖의 파노라마와 터널과 교량들이 전에 없었던 새로운 산업적 풍경을 만들어내며 우리의 감각을 새로운 세계로 이끈다. 소래도 그렇다. 찰스 실러(Charles Sheeler)가 말한 테크노스케이프(Technoscape), 이른바 공업기술풍경이 바로 이 것 아니겠는가.
소래역은 테크노스케이프이긴 하되, 자연과 철도가 함께 빚어낸 합작 풍경화다. 이 그림 속에 들어서는 순간 왠지 이곳에서는 청년시절의 뜨거운 열정이 살아날 것 같기도 하고, 만인의 지탄을 받지 않을 수준에서의 가벼운 일탈 정도는 허용이 될 것도 같다. 잊고 지냈거나 잃었던 내 안의 낭만적 충동을 일깨우며, 현실인식을 잠시 무중력 상태에 빠뜨릴 정도로 소래의 풍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

이곳에 서면 일흔의 나이에 가정부 소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열렬한 사랑 고백을 했고 극심한 좌절 끝에 가스를 틀어놓고 생을 마감했다는 야사를 남긴 '설국'의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1899~1972)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젊음에 대한 사랑, 잃어버린 열정에 대한 전도된 그리움 같은 것.
연인 소피 폰 퀸의 환영을 쫓으며 그녀의 무덤 앞에서 밤새 적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길 반복하다가 불후의 로망스 '밤의 찬가'를 남긴 노발리스(Novalis, 1772~1801)의 열정과 광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윤후명의 장편소설 '협궤열차'나 단편소설 '협궤열차에 대한 보고서'에 나오는 로망스는 인정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이곳에 오면. 낯선 곳에서 아름다운 여인과의 사랑과 만남이라는 늘 반복되는 낯간지럽고 남우세스러운 작품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의 틈과 관용이 생긴다. 이것이 소래포구다.
그런데 이런 감상적 호사와 상념은 여기까지다. 철교를 건너 소래어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소래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얼굴이 바뀐다. 매서운 겨울 추위를 억척스러움으로 이겨내고 삶을 이어나가는 시장 상인들의 활기와 외침이 잠시 무중력 상태에 빠져 있던 우리를 다시 현실로 귀환시킨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의욕을 잃었을 때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그것은 시장이 낭만적이고 특별한 마법이 있어서가 아니다. 흔히 우리가 장터에서 얻어오는 삶의 활력과 의지는 어쩌면 상인들의 고단한 생존의 몸부림에서 나오는 에너지파를 자의적으로 곡해해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사실 장터에서 상인으로 살면서 사람과 상대하는 삶이 어찌 녹록한 일이겠는가.

소래가 포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1935년 무렵 천일염전이 들어서고 수인선이 개통된 1937년 이후부터다. 그 이전 소래포구는 월곶동을 오가던 작은 도선장이며 군사기지였다. 수인선이 개통되고 나서는 소금산지이며 해산물 집산지로 호황을 누렸다. 1974년 인천내항이 들어선 뒤에는 갈곳없는 소형어선들이 몰려들면서 경기도 최대의 새우파시로 떠올랐으며, 각종 젓갈과 싱싱한 꽃게 등으로 유명해졌다. 현재 소래는 수인선의 하이라이트인 소래철교로 인해 인천시민과 경기도민들의 부담 없는 당일여행지로, 생활의 쉼표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최용백의 포토 미셀러니 '마지막 협궤열차 수인선 소래철교 2009'에 잘 정리되어 있듯 소래(蘇萊)란 지명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지형이 소라처럼 생겨 나온 말이라는 설, 솔내(松川)에서 유래됐다는 설, 지형이 좁다 즉 솔다-좁다에서 비롯됐다는 설, 그리고 소정방이 백제를 공략할 때 산둥성 라이저우를 출발하여 이곳으로 왔다는 설 등 분분하다.

이민족 장수의 침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소정방에 대한 설화는 여러 지역에 걸쳐 분포돼 있다. 금강을 백마강이라고도 하는데, 이 백마강 낙화암 아래의 조어대는 소정방이 백마를 미끼로 용을 낚시로 잡았다는 전설이 그리고 부안 내소사도 소정방이 와서 '내소'란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올 정도이다.
소래포구의 명물 소래철교는 낡고 부식이 심하여 이제는 통행이 불가능하다. 그래도 철교 옆 해발 40m 댕구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소래철교와 포구의 모습은 압권이다. 다만 포구 건너 월곶 주변에 빼곡히 들어선 고층 아파트들이 감정이입을 방해하는 것이 흠이다. 댕구산은 고종 16년(1879) 인천으로 진입하는 이양선을 막기 위해 이곳에 3문의 대포를 배치하고 장도포대라고 불렀다고 한다. 장도포대(獐島砲臺)란 이름은 이 섬의 모양이 노루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것이라 하며, 댕구산은 직경 30㎝의 대완구(大碗口)가 설치되어 있어 붙여진 별칭이다. 예나 지금이나 서울에 인접한 서해바다는 전략적으로 쟁탈의 요처였으니, 이곳을 평화와 낭만의 바다로 만들고 가꾸는 일은 오롯이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일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에 젖어 발걸음을 소래역으로 옮긴다. 지난 2002년 8월 철도청과 인하대학교 박물관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발표한 발굴보고서 '수인선: 수원~인천간 복선 전철 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에는 분명히 소래역사가 있었으나 수년 전에 철거되었고 시내버스 종점이 되었다. 버스종점의 소래갯벌슈퍼에 들어가 껌과 과자 한 봉지를 사면서 주인아주머니께 SOS를 쳤으나 소래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을 뿐 빈손이다.

이 허전한 빈손을 채워주는 것은 가족이다. 기상천외한 장난질로 엄마를 소프라노 가수로 만들기 일쑤인 원희와 승희, 그리고 책상물림인 형이 미덥지 못해 큰 가족행사 때마다 기꺼이 동원되는 자칭 모범 공무원인 막내 동생과 조개구이와 칼국수로 늦은 점심을 먹고, 내처 영화를 보러갔다. 우리 여행의 여운이 이토록 길어지는 것은 필시 소래가 우리 안에 깊이 잠들어 있는 낭만적 충동과 모종의 심미적 허기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