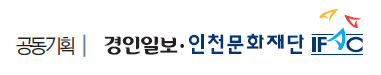[경인일보=글·사진┃조성면(문학평론가·인하대 강의교수)]수인선은 드라마 같다. 아름다운 장면들과 이야기가 있고, 시작과 끝이 있다. 또 플롯도 있다. 수원역과 수인역이 발단이자 대단원이라면, 야목역과 군자역은 전개요 소래역은 절정이다. 해변과 소나무 숲이 일품인 송도역은 지나간 소래포구의 풍경이 못내 아쉬운 관객을 위해서 한 차례 더 되풀이하는 유사유추반복(pseudo-iteratif)이다. 차창 밖에 펼쳐지는 파노라마들과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와 대화도 있는, 모두가 주인공이었고 모두가 관객이었던 작은 대하드라마였다.
수인역은 사람과 사람이, 이웃과 이웃이 모여 서로 안부를 묻고 소통하며 물정과 시국을 걱정하던 작은 광장이었다. 꼬마기차 수인선이 만든 이곳은 한동안 경기-인천의 아고라였던 셈이다. 야목리 쌀과 군자 천일염과 소래 방게와 동죽이 한데 모여 매일같이 작은 장터가 열리고, 경기도의 민심과 이야기들이 모여들던 곳. 이렇게 한 편의 이야기를 갈무리하고 또 다른 이야기 길을 떠날 채비를 하는 수인역은 꼬마열차가 연출한 드라마의 대단원(denouement), 곧 수인선의 데누망이다.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를 앞둔 겨울의 끝자락 신흥동 수인역을 찾았다. 수인역이 있는 신흥동은 1914년부터 화정(花町)이라 하다가 해방 후에 새롭게 발전하고 부흥하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인천에는 이름을 세 개나 가진 역이 두 개 있다. 축현역·상인천역으로 불리던 동인천역과 인천항역·남인천역으로 불리던 수인역이 그렇다. 1937년 개통 당시 수인역의 본래 이름은, 여주·이천 쌀과 군자·소래의 소금 수탈이라는 부설 목적이 반영되어 인천항역으로 명명됐었다. 그러다가 1946년 수인선이 국철로 흡수, 통합되면서 일제 때의 이름을 버리고 남인천역으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승객들은 남인천역 대신 수인역으로 부르면서 이것이 공식 이름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는 열차 노선이 하나 더 있다. 1957년 9월에 착공하여 1959년 5월에 준공된 3.8㎞의 화물 전용 노선 주인선이다. 주인선은 화물운송의 편의를 위해서 인천항과 주안역 사이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이로 인해 주인선의 남부(화물)역과 구별하기 위해서 남인천항역을 수인역으로 부른 것인데, 남부역을 남인천역으로 남인천역을 수인역으로 혼동하는 작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금 수인역은 광역버스 9100번의 종점으로, 또 남부역은 수원-안산-인천을 오가는 직행버스의 종점으로 변해 버렸다. 이 주변에 몇 개의 쌀집과 기름집들만 남아 이곳이 수인역이었음을 전하고 있다. 제법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평생 지켜온 삶의 관성으로 부천 계양에서 여기까지 기름을 짜러 찾아온 어르신 몇 분과 잠시 얘기를 나눴다.
군입대를 앞둔 인천의 장정들 집합장소인 수인역 인근 광장에서 많은 친구들을 전송했다는 쌀집 아저씨와 그 많던 보신탕집도 부쩍 줄어들어 서운하다는 노년의 어르신과 말씀을 나누며 수인역의 옛 흔적을 찾아 분주하게 카메라에 담았다. 보신탕을 함께 나눌 친구도 많이 남지 않았고 늙어 그런지 맛도 예전만 못하다며 추운데 부지런히 사진 찍고 가라신다.

문득 88올림픽 언저리에서 한국의 보신탕 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하던 동물애호가 브리짓 바르도(1934~ )가 생각났다. 동물을 보호하고 살생을 막자는 주장에는 백퍼센트 동의하지만, 과연 그가 한국의 독특한 음식문화와 견구론(犬狗論)을 이해했더라면 이렇게 까칠한 비판을 날렸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견구론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 재학하던 시절 직접 들은 한국문학계의 거목 조동일(趙東一) 교수의 오랜 지론이다. '견'은 애완견·마약탐지견·경비견처럼 뚜렷한 목적의식적으로 사육한 개를, '구'는 자연발생적으로 키우게 된 가축으로 변변한 이름조차 없던 개들을 뜻한다. 견은 식용이 될 수 없고, 오직 구만 식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견구론의 요체다.
매주 수요일 전쟁같이 격렬한 수업이 끝나고 어쩌다 보신탕집에 들르면, 대학원생들은 두 패로 나뉜다. 명철보신이란 사자성어를 차용하여 보신탕을 선택하면 '보신파'요, 삼계탕을 선택하면 '명철파'다. 매년 복날이면 문전성시를 이루는 명철파들의 독주를 지켜보면서 비록 보신파는 아니었지만, 음식문화와 취향마저 급격히 서구화하여 보신탕이 한국사회의 하위문화로 게토화하는 것이 정녕 서운하다.
수인선은 축소와 단축의 역사였다. 1973년 송도~수인역 간 5.l㎞와 1992년 소래~남동 간의 궤도 5㎞가 철거되었고, 1994년에는 한양대(일리역)~소래 간 운행이 정지되었다. 수원과 한양대 사이를 오가던 수인선은 1995년 12월 31일의 운행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수인선에 대한 대강을 간단하게 짚고 정리하는 것으로 수인선 여행을 종착역 수인역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수인선은 1937년 7월 19일에 개통되어 8월 6일부터 운행을 시작해 1995년 12월 31일까지 58년 동안 수원과 인천 사이를 왕복하던 중부내륙철도였다. 수원에서 서북으로 화성·시흥·안산·인천을 잇던 762㎜의 단선 협궤열차로 전장 52.8㎞였다. 개통 당시에는 임시정거장을 포함하여 열일곱 개의 역이 있었으며, 도보로 11시간이 걸리던 수원~인천 간을 1시간 40분으로 단축하였다. 다나카 죠오지로(田中常次郞)가 사장으로 있던 경동철도회사가 부설한 사설철도였으나 해방 후 국철로 편입되었다. 초창기에는 혀기 등 증기기관차가 운행되었지만, 1977년 9월 1일부터 디젤동차가 도입되었다. 대표적인 서민열차로 서해안과 경기내륙지역민들의 발로 그 소임을 다하였으나 1976~77년에 걸쳐 인천~수원을 잇는 국도 42호선 포장사업이 완료되면서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결국 폐선되었다.
"하나로 시작됐으나 하나로 시작된 바 없다, 하나로 끝났으나 하나로 끝난 바 없다(一始無始一 一終無終一)"는 '천부경' 일구(一句)대로 세상사 모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되는 법. 이제 수인선이 끝나자 또 다른 수인선이 시작되려 한다. 경기네트워크의 데빠르(depart) 수인선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