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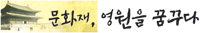
군 초소·회각로도 발굴 축조시기 400~500년 앞당겨
전란 대비 임시궁궐 등 역사·학술적 가치 큰 유적
도, 복원 기초자료 확보 유네스코 유산 신청 탄력
조선 유림 대표적 명소 누각 '산영루' 이달 재탄생
시민 휴식공간 개방… 복합문화공간 탈바꿈 기대
지난 7월 31일 북한산성(사적 제162호)에서 성벽 발굴에 대한 현장설명회가 열렸다. 그동안 조선시대에 축조된 부분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산성에서 고려시대 성벽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은 최초로 북한산성 대서문~수문 구간과 부왕동 암문 구간의 성벽절개지를 조사한 결과, 조선 숙종 37년(1711년)에 축성한 현재 성벽 아래에서 고려시대에 세워진 중흥산성의 기저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문화재연구원은 이번 발굴로 북한산성 축성방법이 규명됐을 뿐만 아니라 중흥산성 기저부의 존재를 확인, 현재 남아있는 북한산성이 처음 축조된 시기를 400~500년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굴조사를 주관한 경기문화재연구원 북한산성문화사업팀은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북한산성의 연구, 정비, 복원,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산성이 지닌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를 발굴해 풍부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를 실시, 문화재 정비와 복원을 통해 북한산성 전체를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제가 수도를 하남 위례성으로 정했을때 도성을 지키던 북방의 성인 북한산성은 백제 개루왕 5년(132)에 토성으로 축조됐다. 이어 고려 우왕 13년(1387)에 중흥산성이 세워졌고 1711년 석성으로 개축되면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서울 일대 북쪽을 방어하는 주요 시설로 사용됐다.
11세기초 거란의 침입 당시 현종이 고려 태조의 관을 북한산성으로 옮겨 오기도 했고 고려 고종 19년(1232)에는 몽고군과의 격전이 벌어진 곳이다. 우왕 13년(1387)에 다시 고쳐 지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도성 외곽을 고쳐 짓자는 의견이 나와 숙종 37년에 왕명으로 토성을 석성으로 고쳐 지었다.

북한산성이 위치한 북한산(837m)은 지난 1968년 북한 특수부대 요원이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 이후 민간인의 거주를 극히 제한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 그 원형이 고스란히 잘 보전돼 있다.
북한산성문화사업팀은 지난 2012년부터 행궁지에 대한 발굴조사에 들어가 지난해 10월 행궁 내전지 1차 발굴조사와 관련한 현장발굴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발굴된 행궁 내전지는 1712년(숙종 38)에 준공돼 사용되다 1915년 산사태로 매몰돼 일부 파괴됐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지(北漢誌))'에 따르면 행궁 규모는 내전이 좌·우 상박 각 2칸, 대청이 6칸, 사면퇴 18칸을 합한 총 28칸이었다. 이 정전 외에 또 좌·우각방·청·대문·수라소 등의 부속건물이 35칸이나 됐다.
외전 역시 내전과 같은 규모의 정전 28칸, 내행각방 12칸을 위시한 누(樓)·청·고간(庫間)·대문 등 총 33칸의 부속 건물이 있었다. 북한산성 행궁지는 경기도 기념물 제160호(1996년 7월 22일)로 지정됐다가 사적 제479호(2007년 6월 8일)로 변경, 지정됐다.
북한산성내에는 중흥사를 비롯한 12개의 사찰과 99개의 우물, 26개의 작은 저수지, 그리고 8개의 창고도 있었다.
북한산성내에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7호인 '북한산성금위영이건기비 (北漢山城禁衛營移建記碑)'가 있다. 북한산성내 대성암이란 암자 아래에 놓여있는 비로, 수비를 맡고 있던 금위영의 터를 옮긴 후 이를 기념해 세운 것이다.원래 금위영은 동소문안에 있었으나 그 지대가 높아 무너지기 쉬워 보국사(輔國寺) 아래로 자리를 옮겼다.
화강암인 이 비는 누워있는 일종의 와비(臥碑) 형태로, 뒷면은 흙속에 묻혀 있고 비몸 한쪽으로 낙수면을 새긴 지붕돌이 있다. 비에 새긴 명문으로 보아 숙종 41년(1715년)에 세웠다.

고려말 태고보우국사에 의해 중수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중흥사는 본래 30여칸의 작은 사찰에 불과했지만 북한산성이 완성된 1715년 당시 증축해 136칸의 큰 사찰이 됐다. 당시 조정에서는 8도의 절에 명을 내려 1년에 6차례 번갈아 의승을 뽑아 산성내 절에 주둔시켰다.
승군들이 주둔했던 용암사, 노적사, 경흥사, 보국사, 보광사, 부왕사, 원각사, 국녕사, 서암사, 태고사, 진국사, 중흥사를 관리했던 중요한 곳이었다. 1894년 화재, 1915년 홍수로 큰 피해를 입어 현재는 주춧돌과 축대만 남아있다.
북한산 서원사지(경기도문화재자료 제140호)는 수문일대의 산성 수비 역할을 담당하다가 19세기말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눈에 띄는 것은 조선시대 북한산 유림의 대표적 명소였던 누각 산영루(山映樓·경기도기념물 제223호)가 이달 안에 복원돼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방된다는 것이다.
산영루는 북한산성내 태고사 계곡과 중흥사 계곡이 만나는 바위 위에 세워진 누각으로, 고려말 북한산성 개축과정에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때 불에 탄 뒤 18세기 초 스님들에 의해 복원됐으나 1915년 대홍수로 유실돼 10개의 초석만 남아 있었다.
'산 그림자가 물에 비치는 곳'이라고 해서 '산영루'란 이름을 갖고 있다. 북한산의 수려한 경관을 조망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 있고 조선시대 도성에 인접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북한산 유람의 대표적인 명소였다.
이밖에 북한산성 입구에서 백운동계곡을 따라 대남문으로 가는 길 용학사 아래에는 20여개의 비석이 있다. 이것이 바로 북한산성선정비군이다. 이 곳의 비석들은 북한산성 관리 최고 책임자가 재임할 당시의 선정과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글=김신태기자
/ 사진=조형기 프리랜서













![[문화재, 영원을 꿈꾸다·10]평택·화성의 관방유적](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07/883302_444100_0003.jpg)
![[문화재, 영원을 꿈꾸다·11]안성 칠장사와 죽주산성](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08/885469_446277_3359.jpg)
![[문화재, 영원을 꿈꾸다·12]파주 자운서원·파산서원](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08/887772_448504_513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