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산업 역군(?)'으로 한껏 치켜세워졌던 기지촌 여성들. 하지만 이면에는 멸시와 천대의 시선이 깔려 있었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그들은 어느샌가 잊고 싶은 존재, 부끄러운 존재로 전락했다.
아프지만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우리 현대사의 한 단면, 기지촌 여성들의 애환을 통해 '르네상스 휴먼'을 조명한다. 편집자 주, 관련기사 2·3면
기지촌은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미군 병력이 대거 주둔하면서 의정부와 동두천, 파주, 평택 등 주요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6·25 전쟁 이후 피폐한 경제상황속에서 미군기지는 달러가 쏟아져 나오는 '노다지'나 다름없었다.
부대 주변에는 자연스레 미군을 상대로 한 상권이 형성됐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양복점, 세탁소, 술집, 클럽 등 한국인이 운영하는 영업점이 부대 주변에 운집했다.
더욱이 기지촌에는 풍부한 미군 물자들이 쏟아져 나와 당시 우리 경제사정으로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 미군 물자의 외부 유출은 공식적으로는 금지됐지만 기지촌을 통해 일반시장으로 암암리에 흘러들어 유통됐다. 1960~70년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미제'는 대부분 이런 유통경로로 거래됐고 미군 물자 거래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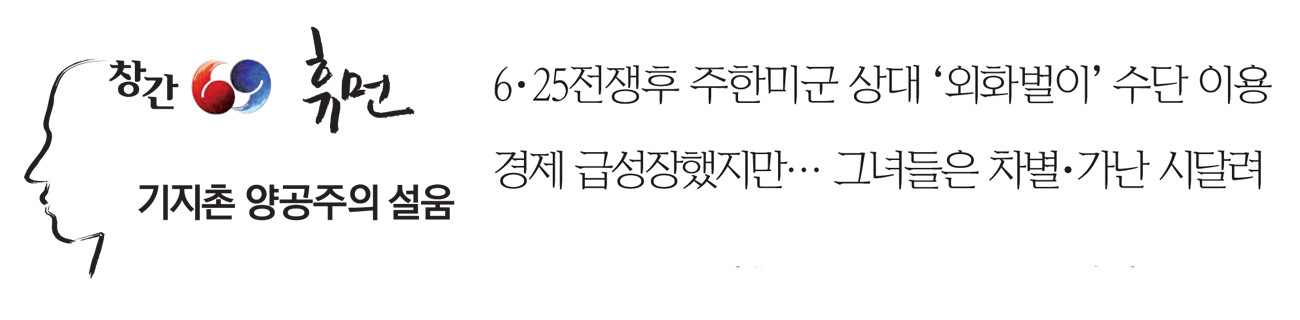
기지촌에서 가장 호황을 누린 곳은 유흥업소들로, 기지촌 상권의 핵심이었다. 유흥업소의 호황이 절정이던 1960년대 업소들은 인력난을 겪게 되자 전국을 다니며 여성 영입에 나섰다. '큰 돈을 벌 수 있고 잘하면 멋진 미군을 만나 미국으로 이민갈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많은 여성들이 넘어갔다.
이들이 바로 '양공주', '양색시'라 불리던 기지촌 여성들이다. 이들은 업소뿐만 아니라 기지촌 전체에서도 중심 역할을 했다. 경제적으로 이들 여성은 당시 '외화벌이'의 산업역군이었던 셈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도 기지촌을 보듬어 안았다. 기지촌 관할 보건소를 통해 기지촌 여성들에게 콘돔을 무상으로 나눠주거나 무료 성병검사 등 건강검진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들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들 '양공주'를 멸시하면서도 뒷돈까지 대주며 미군 물자를 빼돌리는 데 이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호황은 영원하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국내외 환경변화와 주한 미군부대 재편 등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에 기지촌도 쇠락의 길을 걸었다.
기지촌 여성들도 거의 떠나버리고 남은 여성들은 질병과 가난을 안고 쓸쓸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 기지촌 굴곡의 역사속에 남은 것은 황폐함뿐이었다.
한때 산업역군으로 치켜세우던 세상은 이들을 등졌고, 아직 기지촌에 남아 외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기지촌 할머니들은 여생이나마 작은 안식처를 얻고 싶은 바람뿐이다.
의정부/윤재준·최재훈·공지영기자













![[르네상스 대한민국·휴먼]열악 환경·황당 신고… '그래도 사람이 먼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09/894173_455045_1403.jpg)
![[르네상스 대한민국·휴먼]세상이 외면한 양공주, 쉴곳없는 恨평생](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09/894178_455072_3431.jpg)
![[르네상스 대한민국·휴먼]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 어떤 곳?](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09/894180_455081_4655.jpg)
![[대한민국 르네상스·휴먼]'산재보험 시행 50년' 산업현장 실태 보고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09/894215_455103_2410.jpg)
![[대한민국 르네상스·휴먼]'4포 세대' 청년실업 현주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09/894216_455105_0215.jpg)
![[대한민국 르네상스·휴먼]고려인 러 이주 150주년, 그들을 만나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09/894217_455108_3213.jpg)
![[대한민국 르네상스·휴먼]인터뷰/'희망 개척 고려인 3人'](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09/894218_455127_43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