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가의 문갑도 어린시설
집안 간첩사건에 충격
아픈 상처 詩로 쏟아내
납북어민 인천 비중높아
연좌제로 가족도 비참
주홍글씨 수십년 몸서리
한때 최고 어장 덕적군도
그 많던 색주가 작부도
밀물처럼 모두 빠져나가
파시는 희미한 기억만…
가진것 없는 이들의 터전
점점 황폐해져 가지만
섬은 엄연한 '삶의 현장'
문갑도 선착장에서 바다를 보면
대이작도, 소이작도, 영흥도의 늘어선 모습이
한눈에 잡힌다.
문갑도 선산 너머에는
연평도, 대청도, 백령도들도
멀리서 줄지어 엎드린 듯 보인다.
'입동(立冬)'이던 지난 7일,
덕적도를 거쳐 문갑도엘 갔다.
'태생적 고향'은 문갑도이며
'영혼의 고향'은 덕적군도라고 말하는
시인 이세기(51)의 '글 밭'을 찾아서였다.
덕적군도는 1950~70년대 국내 최고의 어장이었다.
민어, 조기, 새우 등이 그물 가득이었다.
그물을 내렸다 올리면 배는 곧 만선이 됐고,
뱃사람들의 주머니도 두둑해졌다.
"인천에서 배를 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인천의 섬과 바다에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에서 물고기,
아니 돈을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김진규(70)씨는 아버지 때부터 문갑도에서 배 사업을 크게 했었다. 김씨는 "지금은 문갑도에 70명 정도 살고 있지만 어업이 잘 됐던 1960년 후반에는 주민이 650명을 넘었었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도 꽤 많았다. 어족자원이 풍부했던 덕분에 사람도, 배도 문갑도로 몰렸었다"고 회고했다.
바다가 늘 넉넉하게 베풀기만 한 것은 아니다. 태풍이 몰아쳐 어민의 생명줄인 배를 한순간에 망가뜨리고, 목숨마저 앗아가기도 했다. 김진규씨 집안도 태풍에 배를 모두 잃고 사업을 접어야 했다. 덕적군도 바다에는 숨겨진 얼굴이 하나 더 있다. '납북어민'들에게 새겨진 간첩이란 '주홍글씨'다.
그해에는 삼월에도 눈이 내렸습니다//가랑눈은 인적 없는 바닷가에 내리고/간간이 눈발이 날리듯/그해에//배를 타고 월북을 하였던 둘째 작은아버지는 반공법으로/월남에서 돌아온 매형은/목발을 한 채/이틀 밤을 묵고 섬을 떠났습니다//무서운 밤이 지났습니다 (…중략…) 배를 탈 수 없었던/털보 작은아버지와 넙적이 작은아버지는 인천으로/아버지는 목포로 갔습니다 (…중략…) 피 묻은 뱃사람이 거적을 뒤집어쓴 채/마을로 올 것만 같은/밤이 지나고//그해의 상수리나무 숲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후략…) <이세기의 시 '서쪽' 중에서>
이세기는 어린 시절 고향 문갑도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1972년이었다. 군경이 간첩을 잡겠다면서 문갑도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했다. 납북어민 즉, 간첩으로 몰린 이세기의 작은아버지도 그 수색 대상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수십 명의 군인과 경찰은 이세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9살 이세기는 부모님과 문갑도를 떠나 인천으로 왔다. 그에게는 또 연좌제라는 굴레도 따라붙었다.
이세기는 "등단하고 이듬해 우연히 문갑도를 찾아갔다. 27년 만에 고향을 간 것인데,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상처를 건드린 것인지 이후에 벼락같이 시가 쏟아졌다"고 했다.
바다와 섬은 아픈 상처에서도 시를 쏟아내는 풍성한 시의 밭이기도 하다. 이세기는 그 모순과 역사적 아이러니에 가득찬 '바다'를 꼭 붙들고 있다.
이세기 시인은 "인천 바다는 남·북해양경계선과 닿아 있어 납북어민 중에는 인천 어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좌제가 사라지기 전까지 납북어민과 그 가족들은 매우 비참하게 살았다. 가장들은 다시 배를 탈 길이 없어 일자리를 잃었고,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문갑도에서 만난 김종석(74) 씨의 삶도 험난했다. 공식 기록으로는 아직까지도 집단 월북한 것으로 되어 있는 김 씨는 문갑도에 남은 유일한 '간첩'이다. '납치'된 것이라는 주장은 소용없었다.
부인도 남편 김 씨 등 일행이 바다로 나간 사이 누군가 와서 "남편의 뱃일 대가"라면서 건넨 돈을 받았다가 그만 간첩이 되고 말았다. 김종석 씨는 반공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이후 무기징역, 15년형으로 감형받았다.
김씨는 스물두 살에 옥살이를 시작해 서른일곱에 풀려났다고 했는데, 그의 수사 기록에는 1972년 4월 서른한 살에 감옥살이를 시작한 걸로 돼 있다. 기억과 기록의 차이가 크다. 젊을 때 다시 세상에 나왔지만 고문으로 망가진 몸, 간첩 낙인은 이겨내기 어려웠다.

"나는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지금도 나를 슬슬 피해. 똑같은 땅에 사는데 나는 사람 아닌 취급을 당하며 살고 있는 거지. 공작금을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아내도 7년 형을 살고 나왔어. 지금도 사람 무서워하고 싫어해. 못 믿는 거지. … 자식들? 다섯 명을 낳았는데 헤어져 산 지 오래야."
당국의 발표대로 그와 함께 1968년 5월 북한으로 넘어가 약 6개월간 머물다 돌아온 덕적도 어민 8명은 모두 납북이냐 간첩이냐를 따질 것도 없는 저세상으로 갔다. 이제 김종석 씨만 남아 46년을 옥죈 그 '주홍글씨'에 몸서리치고 있다.
'간첩'의 굴레를 쓴 '납북어민'과 그 가족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세기의 시는 사실적이어서 더 아프게 한다.
마을에선 누구도 말을 걸지 않던/당너머 집//조깃배를 타던 쌍둥이 아들이/월경을 하였다는/소문이 들리던 그 겨울 이후/그 집에는 밤마다 부엉이가 운다고 하였다//벌써 삼십여 년/쌍둥이 아들은 배를 타고 나간 후/돌아올 줄 몰랐다//다만 관에서 나온 소식 몇 자/이제는 옛일이 되었지만/요시찰인가라는 딱지만 없었더라도 잊었으리 (…후략…)<시 '당너머 집' 중에서>
김종석 씨는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을 다시 조사해 진상규명을 하는 모임 '지금 여기에'의 도움을 받아 재심 재판을 준비 중이다.
'지금 여기에' 관계자는 "납북어민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존재한다. 때문에 납북어민들은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진짜 간첩 활동을 했는지 아닌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납북어민들이) 평생 실제 지은 죄보다 훨씬 무거운 벌을 받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이세기의 시선은 섬사람에 가 있다. 평생을 바다에 순응하며 살았듯이 힘 없이 '납북'도 되고, 또는 '간첩'도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도시에서 떠밀려 시골 섬 구석까지 찾아들어 웃음을 팔아야 하는 '늙은 아가씨'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남겨야 하겠기에 그렇다.
대청도 부둣가 엄지다방에/서울 용산에서 왔다는 귀화라는 이름의 다방 아가씨/짙은 화장에 동백꽃 같은 연지를 하고//텅 빈 다방에 앉아 창 너머/선창가를 보는데//이삼 일을 못 버티고 짐을 싸고 돌아가는/신참 아가씨 뒷모습이 애닯다 한다 (…중략…) 연평도/백령도/대청도/안 거쳐온 곳이 없단다//애처로이 객선을 타고/외딴섬 부둣머리를 떠도는 객지의 몸이 되어/이제는 먼 데 바다를 바라본다 <시 '귀화 이야기' 중에서>
이세기가 섬 기행 중 찾은 엄지다방과 그곳에서 만난 다방 아가씨 귀화 이야기는 '파시(波市)'의 흔적이다.
섬 여행가 강제윤의 말이 아니더라도, 덕적군도는 일제강점기 초부터 굴업도 민어어장과 울도 새우어장을 발견해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다. 덕적군도 파시는 크게 열렸다. 파시에는 어판장과 수십 개의 색주가(色酒家), 잡화점, 숙박시설들이 자리했다.
특히 덕적도 민어파시에는 색주가 작부들만 200명이 넘을 정도로 술 장사가 호황이었다. 맨몸으로 고된 노동을 견뎌낸 뱃사람들은 주머니에 돈만 생기면 술 생각에, 여자 생각에 색주가를 찾아 탕진했다.
20여년간 배를 탔다는 문갑도 주민 김웅현(71) 씨는 12일 전화통화에서 "배에서 내리면 곧장 술집으로 가는 뱃사람들이 많았다. 육지가 그리운 걸 술로 푸는지 밤을 새면서 술을 마시는 일도 허다했다. 배를 타면 제법 돈을 만졌는데 술값으로 다 쓰는 경우도 흔했고, 심지어 술값이 모자라 배나 그물을 잡히기도 했다"고 술회했다.
물고기가 몰리면 돈도 몰리고, 돈이 몰리면 자연히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다. 물고기는 무한한 바다 자원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욕심이 그 물고기의 씨를 말리고 말았다. 내 배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심산에서였다.
어린 물고기가 크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결국 물고기는 사라졌고 돈도 오지 않았다. 돈이 없으니 사람도 떠났다.
덕적군도의 파시는 먼 옛날얘기가 되었다. 색주가 작부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섬은 텅 비었다.
이세기 시인은 "덕적군도가 어업 호황기를 벗어나자 밀물처럼 모든 것이 빠져나갔다. 파시도 이젠 희미한 기억으로 남았을 뿐"이라며 "사람들은 섬을 한번쯤 가보고 싶은 곳, 관광지로 본다. 하지만 섬사람들에게 섬은 별로 가진 것 없는 이들이 맨몸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점점 더 황폐해져가고는 있지만 엄연한 삶의 현장"이라고 했다.
글 = 박석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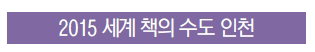













![[책 읽는 인천, 문학속 인천을 찾다·38]김중미 '괭이부리말 아이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10/907877_469406_2942.jpg)
![[책 읽는 인천, 문학속 인천을 찾다·39]박영근과 노동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10/909893_471653_3549.jpg)
![[책 읽는 인천, 문학속 인천을 찾다·40]윤후명 '협궤열차'](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10/912084_473793_1242.jpg)
![[책 읽는 인천, 문학속 인천을 찾다·41]조세희 '난쏘공'](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411/914039_475896_38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