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은 선생 탄생100주년 맞는 해
당대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만의 외길 걸어온 시단 사표
산과 새, 해와 돌을 통해
끊임없이 생명과 자연을 노래한
청록파로서 서정시의 대가

1939년에 시작된 박두진 선생의 시력(詩歷)은 꼭 60년을 채우고 마감되었다. 그동안 선생은 자연의 발견을 누구보다 역동적으로 이루어낸 청록파 시인으로, 의연하게 당대 현실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문단 정치와는 무연하게 자신만의 외길을 걸은 시단의 사표로 각인되어왔다. 오래전 필자는 선생을 몇 차례 자택으로 찾아뵌 일이 있는데, 지금도 정원을 가득 채웠던, 국토 구석구석에서 선생이 정성껏 수집해온 수석들이 기억에 새롭다. 선생은 수석을 일러 ‘壽石’ 대신에 꼭 ‘水石’이라는 표기를 고집하였는데, 그 질서정연한 수석들의 도열은 꼭 선생이 걸어온 생의 일관성을 은유하는 것 같아 보였다.
선생이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경기도 안성의 고장치기 마을은, 들판 한가운데 스물 남짓한 오막집이 엎드려 있는 가난하고 쓸쓸한 곳이었다. 그 마을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선생 형제들 정도였다. 선생의 집도 농가는 아니었지만 댓 마지기 남의 땅을 소작하며 가난한 생활을 이어갔다. 일요일이나 방학 때면 지게를 얻어 지고 나무를 하러 산으로 다니던 선생은, 새소리 물소리를 따라 혼자 산골짜기로 들어가면서 자연에 대한 강렬한 애착과 멀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동경을 배워갔다. 열여섯 살부터 습작을 시작한 선생은 ‘시’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준 은총이며 시로써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신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이 시기부터 강하게 가졌다. 선생은 우리 현대 시가 너무나 감상적이고 퇴폐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다 더 스케일이 크고 싱싱한 야성의 시를 쓰리라 마음먹는다. 열아홉 되던 해에 누님 권유로 교회의 문에 들어선 선생은, 흰옷 입은 조선인들이 모여서 우리말로 기도하는 모습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아, 수탈과 억압으로 특징지어지는 당대 상황을 초시대적 구원의 이미지로 극복하는 상상을 한다. 선생은 스물네 살이 되던 1939년 정지용에 의해 추천을 받아 본격적으로 시단에 발을 들여놓는데, 이때 추천자인 정지용은 “박 군의 시적 체취는 무슨 삼림에서 풍기는 식물성의 것”이라며, 시단에 하나의 ‘신자연’을 소개한다고 평가하였다.
1946년 선생은 박목월·조지훈과 함께 ‘청록집’을 간행하였으며, 이후 10여 권의 시집을 내는 등 정력적인 창작활동을 펴나갔다. 4·19 직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해직되었고, 박정희 정부 때는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에 반대한 서명 문인 1호가 되었다. 정부 간 청구권을 동결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사상계’가 중심이 된 지식인 반대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만큼 선생의 삶과 시는 높고 정결한 ‘고산식물(高山植物)’의 세계였다고 할 수 있다. 선생의 시적 인식이 지니는 시사적 의의는 자연의 생명 이미지, 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능동적 상상력, 한국어가 가지는 소리의 다양성과 리듬, 그리고 시를 시대나 윤리와 동일한 것으로 꿰뚫는 시정신의 추구에 있다. 또한 시어의 특이한 구사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반복 유형에 의한 리듬의 되울리는 효과, 모음과 자음의 유포니, 의성어와 의태어가 문장 속에서 조응하는 기능은 한국어의 표현력과 운율의 풍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결국 선생의 시는 우리 근대시사에서 밝고 힘찬 남성적 기상과 종교적 상상력의 깊이를 불어넣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자신의 기억처럼 선생은 ‘산’과 ‘새’, ‘해’와 ‘돌’을 통해 생명을 줄곧 노래하면서, 그것들을 통해 보다 더 밝은 앞날을 예견한 예언자적 시인이었던 셈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유 의지의 실현이자 유토피아에 대한 강한 충동의 형상화였다. 그렇게 선생의 언어는 지금 고향 안성에서 매년 개최되는 박두진문학제를 통해, 청록파라는 유파를 떠나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의 권역을 이룬 대가(大家) 시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내년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기다리는 소이이다.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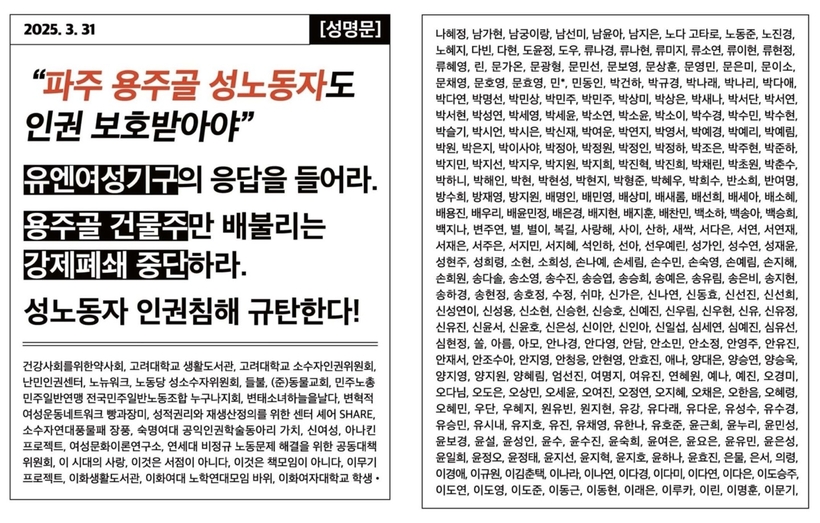





지금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