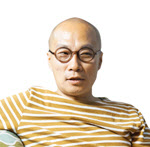
국악관현악단에 지휘자는 꼭 있어야 할까? 서양의 오케스트라는 필수적이다. 서구고전음악이 작곡의 역사라면, 한국전통음악은 연주의 역사다. 모두 창작이 존재하지만, 그의 주체와 방식이 다르다. 국악은 그간 연주자들에 의한 창작적 전통을 중시했다.
국악관현악단은 어떻게 더 생생한 연주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국악관현악단의 단원들이 주체가 되면 가능하다. 지금처럼 지휘의 ‘통제’ 아래서 음악을 만드는 방식을 지양하면 가능하다. 비유컨대, 서구의 오케스트라가 과거 전근대적 연극의 제작방식이라면, 국악관현악단은 배우가 주체가 되는 현대적 방식이라 하겠다. 연출이 있지만 지시하기보다는 유도하는 ‘공동창작’의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에서, 단원들이 만들어낸 관현악 형태의 산조가 이를 증명한다. 지휘자의 통제를 받은 곡과는 사뭇 달랐다. 음악적 생기와 활력이 객석에 그대로 전달되었다.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누군가는 단순한 악곡만이 지휘 없이 가능하다고 반문할지 모른다. 이건 편견이다. 국악관현악단에서 파트간의 호흡이 맞는다면, 오히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음악을 들으면서 청중들은 더 큰 감동을 받는다. 국악관현악을 서구 오케스트라로만 바라보는 관습적 편견에서 벗어나자. 지휘봉의 통제를 따르는 국악관현악을 비(非) 전통적이고, 전(前) 근대적으로 단정 짓진 않겠다.
국악관현악단의 기존 레퍼토리를 제대로 모두 살려내고, 더 나가 국악관현악단의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낼 사람은 누구인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에게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서양음악을 전공한 지휘자들이 영입되면 해결될까? 음악적인 정교함은 상승될지라도, 한국을 대표할 국악관현악 형태를 만들어내리라는 보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지금 국악관현악단은 상임지휘자가 있다. 상임지휘자가 예술감독을 겸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악단의 경우, 지속해서 음악적인 성장을 이루는 모범적인 사례를 들 수 있는가? 오히려 예술감독과 지휘자가 분리된 체제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지금 국악관현악단과 관련해서, 가장 간과하는 것은 ‘단원’이다. 국악관현악단의 중심체는 ‘단원’이다. 그들이 국악관현악단의 성장동력이다. 그들에 의해서 바로 각 악단마다 음악적인 ‘색깔’이 만들어진다. 과연 지금까지 국악관현악단의 지휘자가 악단의 음악적인 색깔을 만들어냈을까?
작금의 국악관현악단은 몇몇 지휘자들에 의한 ‘순환보직’이라고 말하면 성날까? 그간 국공립단체 지휘자들의 면면을 살피면 누구든 인정한다. 당장 국악관현악단의 지휘자를 없애야 하고,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한국음악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당대적 상황을 인식한다면, 국악관현악단에서 지휘를 ‘제어’할 방법을 점진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에서, 지휘가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한 작품을 지속해서 계발해야 한다. 어렵지 않다. 서구오케스트라의 고정된 비교에서 벗어난다면, 다양한 가능성과 실행방법이 보인다. 국악관현악단의 주체는 악기의 생명력을 살려내는 연주가(단원)다.
/윤중강 평론가·연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