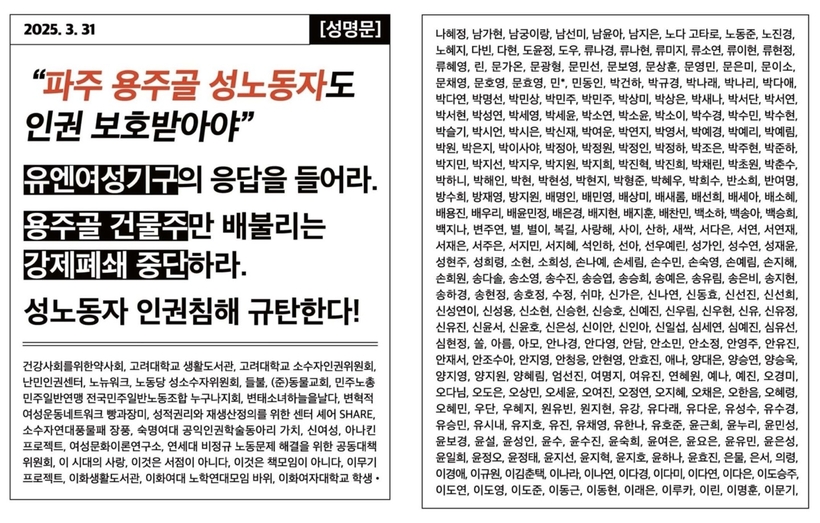영화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구로공단에서 카나디아 공단까지,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자본과 공권력에 맞서 싸운 여성노동자들의 각각 다른 시간과 공간의 기억을 상징적 이미지로 연결하여 주제를 드러낸다. 영화제 아닌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것이 이해가 된다. 특히 인터뷰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수건이나 보자기, 손으로 눈을 가리고 걸어가는 자매가 등장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수출의 여인상’이 가려지는 첫 장면에서 암시하듯, 이들 여성노동자들의 삶과 역사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영화를 나의 어머니와 여성 노동자들에게 바칩니다.’ 영화가 끝날 때 화면에 떠오른 자막을 보고 있노라니 착잡한 기분이다. ‘한국 여성들은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국가 발전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남성들에게 기생해서 혜택만 누리려 한다’라는 일부 여성혐오자들의 주장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인간의 인권이란, 천부인권이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존중받고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국방이나 납세의 의무 이행과는 아무 상관없다. 게다가 산업기반시설이 없던 과거 우리 경제를 일으킨 주역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한 봉제공장과 가발공장의 여공들이었다. 중공업 현장의 남성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에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이 이끌기도 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물론, 엄연히 역사에 기록된 사실이다. 그리고 바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니 세대들의 살아있는 역사이기도 하다. 왜 이 사실을 모를까.
극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나는 고등학생 시절에 배웠던 국사 교과서를 꺼내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 부분을 찾아 보았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건설 현장과 중공업 공장에서 일하는 남성 노동자들의 사진만 실려 있었다. 어디에도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서술과 사진은 없었다. 아하, 이래서 편향된 역사 교과서로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되나보다. 참고로, 나의 국사교과서는 1982년에 초판 발행된 국정교과서다.
/박신영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