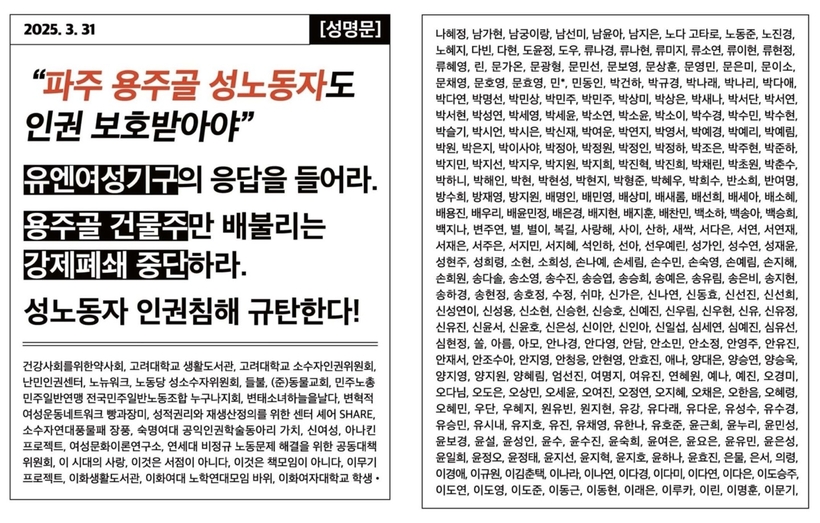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풍수’는 자연과의 조화와 최적의 장소를 찾기 위한 생활철학이다. 그럼에도 풍수를 허황된 잡술로 보거나 땅에 대한 학문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명당을 찾는 기복적 잡술로 보든 땅과 공간에 대한 감여학(堪輿學)으로 추켜세우든 어쨌든 풍수는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사고와 생활을 지배해 온 오랜 관습임에 분명하다. 조선 건국 이래 수도의 지위를 지키고 있는 서울도 왕궁은 남쪽 방향으로 둔다는 군자남면설(君子南面說), 왕궁 앞에는 조정을 두고 뒤편에는 시장을 둔다는 전조후사(前朝後肆), 좌측에는 종묘를 우측에는 사직단을 둔다는 좌묘우사(左廟右社) 등의 원칙을 밝힌 ‘주례’와 음양오행설에 따른 사대문의 배치와 작명 등 철저하게 풍수설에 따라 조성된 도시다. 상왕(上王)의 도시 수원은 유학과 풍수설에 입각하여 조성된 작은 한양이었다. 청계천처럼 도심의 한복판을 흐르는 수원천이 있고, 도성과 궁궐에 버금가는 화성과 행궁이 있으며, 보신각에 해당하는 여민각을 뒀다. 또 좌묘우사의 원칙에 준해 행궁 좌측에 화령전을, 우측에 향교를 갖췄으니 수원은 유학과 풍수설이 합작해 만든 조선 최대의 계획 신도시였던 셈이다.
그렇다면 수원의 풍수는 어떨까? 바로 이 점이 기존의 인문학에서 놓치고 있거나 오불관언(吾不關焉)하고 있는 대목이다. 수원화성에서 눈여겨봐야 할 풍수의 포인트는 화성행궁과 동북각루, 곧 방화수류정이며 명당이 아닌 곳을 명당으로 조성하려 한 선조의 지혜다. 우선 수원 토박이들이 ‘용두각’으로 부르는 방화수류정은 수원화성의 절정이며 지기가 뭉치고 응결된 곳에 세워진 예술품이다.
총 576칸에 달하는 화성행궁 역시 조선 최대의 행궁으로 양기풍수와 비보풍수의 절정을 보여준다. 수원의 진산은 광교산이고 팔달산은 주산인데, 화성행궁은 팔달산에 의지하고 수원천을 앞에 두는 배산임수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화성행궁은 명당이라 할 수는 없으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한 풍수적 지혜의 결정체다. 이곳에 이렇게 멋진 건축물과 신도시를 건설했으니 수원의 화성행궁은 장풍도 잘 되지 않은 공간을 명당으로 만들어내고자 한 비보풍수의 전형이다. 화성행궁은 근원적으로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진다(氣乘風則散)는 풍수적 결함을 안고 있었지만, 이 같은 결함을 천기로 이를테면 동녘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과 밤하늘을 밝히는 북두칠성의 기운을 잘 받도록 설계함으로써 극복한 것이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는 이처럼 기초와 기본을 착실하게 확인하고 다져나가는 것이리라. 그간 우리가 미신이며 잡술이라고 폄하했던 전통사상과 관습이 최고의 권위를 지닌 왕궁·왕릉·행궁 등에 깊고 넓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합리적인 설명 체계를 갖추고 보완하는 일 또한 손님맞이 못지않게 종요로운 일이다.
/조성면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