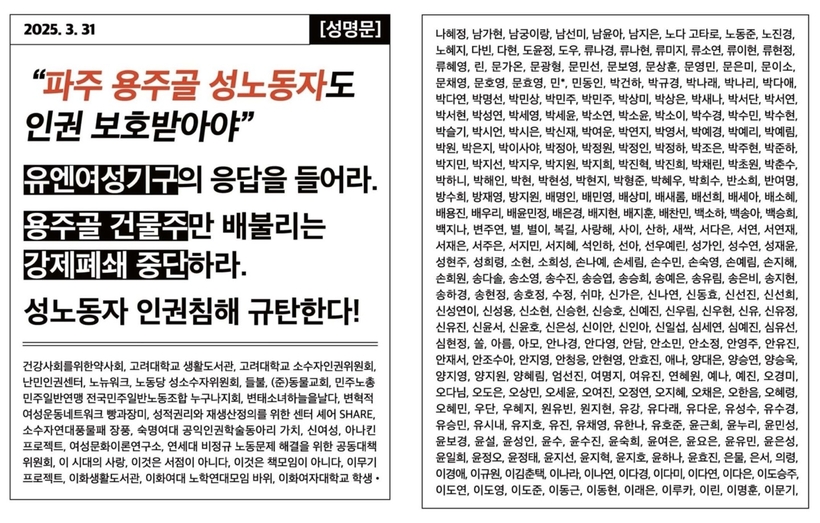인사 총무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이 ‘노사 화합’을 빙자해 노조 동향을 공유하고 ‘부적절한 대책’을 세우기도 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 중 하나다. 그런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관할 지청의 반 노조 행태를 덮는 것이 더 급했던 모양이다.
‘노동조합 효과’라는 것이 있다. 공단에서 노조 조직률이 높고 노조 활동이 활발해지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자연스럽게 지켜진다. 사업주들이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근기법 정도는 알아서 지키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사업주들은 알아서 임금을 올려주기도 한다. 사전에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다. 이런 것이 노조 효과이고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이다.
실제로 2015년 봄, 민주노총이 실시한 8개 공단의 근기법 위반율을 보면 울산지역은 근기법 위반율이 70%로, 안산(92.0%)이나 인천(92.2%)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도 안산과 인천은 각각 41.4%, 45.9%나 되지만 울산은 그보다 ‘적은’(?) 16.7%다. 휴업수당 미지급률도 안산과 시흥은 30.2%, 25.0%나 되지만 울산은 6.5%다. 울산에서의 조사라고 큰 사업장에서 한 것이 아니다. 안산, 인천과 동일하게 중소규모의 3, 4차 하청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 공단에서 조사했다.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다. 노조 조직률, 노조 영향력 차이다. 노조의 영향력이 악화되면 근기법 위반율은 올라간다. 하지만 노조 영향력이 강화되면 반대로 위반율은 내려간다.
이 사실을 아는지 8개 공단 실태조사 결과를 접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토론회 자리에서든 국정감사 자리에서든 민주노총과 협의하겠다고 공언했다. 2013년 서울단지에서 노동조합과 지역사용자단체, 지자체와 관할지청이 맺은 ‘근로기준법 준수 협약’이 모범사례라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지청의 태도는 볼썽사납다. 스스로 공언한 기초고용질서 확립 - 불법파견 근절 사업조차 하다만 모양새다. 400여 개에 이르는 파견업체들이 있지만, 안산지청은 고작 44개 업체만 근로 감독하려 했고, 민주노총이 추가 진정하고 문제 삼으려 하자 50~60여 개 업체를 추가로 조사했을 뿐이다. 그러면 일벌백계로 집행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노동자들이 체감한 건 거의 없었고 제조업 파견업체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민주노총 안산지부가 40여 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진정을 넣었지만, 이 역시 안산지청은 ‘자료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기법을 준수하라는 ‘지도공문’ 한 장 발송하는 것으로 끝냈다.
고용노동부 지청 관계자들은 종종 “근로기준법 준수” 소리만 나오면 “감독관 수가 모자란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볼멘소리부터 한다. 하지만 근기법 준수율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근로감독관 수가 모자란다는 말은 핑계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건 대기업의 하청납품단가 결정 과정을 모르고 하는 무지의 소치일 뿐 더러 뒤집어 보면 “근기법을 위반해 지역경제를 유지하자!”는 부도덕한 주장을 하는 것이기도 해서 이들이 할 소리도 아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율 92.0%… 이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