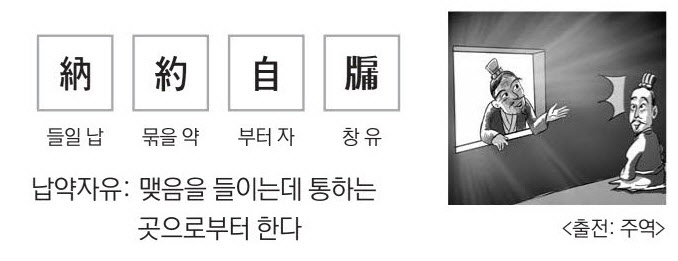
똑같은 이야기인데 저쪽 말은 안 듣고 이쪽 말은 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람 심리가 왜 그럴까? 이에 대한 주역의 답이 창문이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척희(戚姬)를 사랑하여 태자를 바꾸려 할 때 이야기다. 여러 신하들이 간언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장량이 꾀를 내어 말하길, 상산사호(商山四皓)만 초빙할 수 있다면 일은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하였다. 상산사호는 당시 상산(商山)에 살던 네 노인으로 모두 눈썹과 머리카락이 희었다는데서 붙여진 명칭이다. 유방이 깜짝 놀라 산에서 내려온 이유를 묻자 그들은 태자의 덕이 뛰어나 돕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비추었다. 그러자 유방이 생각을 고쳤다는 이야기다. 이 대목에서 張良의 계책은 탁월했는데 그건 바로 납약자유(納約自牖)의 도리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건물에 난 창은 밝음이 통하는 소통처이다. 벽은 막혀서 밝음이 통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소통할 때는 창문으로 해야지 벽에다 대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의 건물로 보면 마찬가지로 가려진 벽처럼 통하지 않는 곳이 있고 열린 창문처럼 통하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당시 유방은 사랑에 가려 간언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막혀있었다. 그 때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창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이 평소 흠모하고 존중했던 상산사호라는 인물이었다. 그가 바로 유방에게는 소통의 창문인 셈이다. 그걸 안 장량의 계책은 참으로 탁월하다. 신하가 임금에게 간언을 하든 친구간에 충고를 하든 간에 이치는 동일하다. 창을 찾아 그리고 관계를 맺어야 하니 이것이 맺음을 들이는데 통하는 곳으로부터 한다는 뜻이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문서숙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