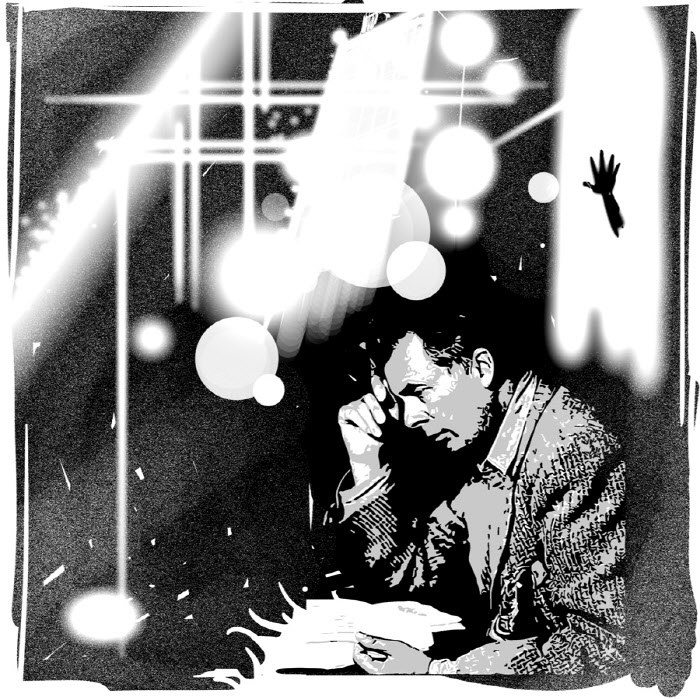
죽음마저 익숙해진 세상에서
인간이 잃어버린 존엄성과 자유
우리는 멋진 세상을 위해
예술적 직관과 상상력,
그리고 인문적인 통찰력
그 축적된 힘 중요함 알아야

때는 서기 2545년, 장소는 영국 런던이다. 인간은 초고도로 발달한 테크놀로지로 인해 모든 재앙에서 자유롭다. 인류는 가난과 질병에서 이미 벗어났고, 죄나 고통 따위에 주눅 들지 않는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사람들은 '소마'라는 약을 먹으면서 감정을 조절하고 행복한 마음을 유지해간다. 하지만 인간이 생겨나고 자라고 사라져가는 프로그램은 모두 인공적 시스템이 수행한다. 인간은 인공적으로 부화되고, 기계에 의해 길러지고, 또 획일적 속성을 부여받는 과정을 밟는다. 그러나 이 '멋진 신세계'는 곧 '우울한 세계'임이 입증된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 생겨나고 길러진 인간에게는 부모나 고향이나 자기 기원(origin) 같은 것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사사로운 감정이나 고유한 편견, 고집, 주장 등도, 진정한 사랑이나 신을 향한 신앙도 사라져버린다. 이곳에 처음 오게 된 존은 처음에는 '멋진 신세계'에 감동하지만, 곧바로 그것이 소수의 통치자들에 의해 조작된 행복임을 간파하고는 절망한다. 그는 새로운 인간 사회를 위해 예술적 직관과 상상력의 고유함을 주장하는데, 결국 헉슬리는 그를 통해 미래 인류 사회의 재앙을 미리 경고한 셈이다.
어쩌면 우리는 '멋진 신세계'가 예언하고 구체화한 세계로 한 걸음씩 들어서고 있는지 모른다. 헉슬리의 예측과 경고가 정확한 탄환이 되어 날아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테크놀로지를 일체 부정하면서 자연 그대로를 향해 멋지게 퇴행할 수만도 없다. 다만 우리는, 비록 인간적 존엄과 가치가 상당 부분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테크놀로지의 맹목적 발달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켜왔고 또 이끌어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질문해야 한다. 그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육신의 편안함만 남은 유토피아가 훨씬 더 비극적인 세계임을,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갈등하는 지상의 삶이 더없이 '멋진' 세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 소설이 과학이나 공학으로 대변되는 학문 세계나, 과학기술이 인류를 진보시켜온 긍정적 순기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해진 운명에 순응함으로써 이룬 행복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되물음으로써 인문학적 정점의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이다. 가족이라는 유대도 없어지고 죽음마저 익숙해지도록 길들여지는 세상에서 인간이 잃어버리는 것은 존엄성과 자유일 것이다. 그러한 존엄과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멋진 세상을 위해 우리는, 테크놀로지가 과잉 지시하는 '멋진 신세계'를 넘어서, 예술적 직관과 상상력과 인문적인 통찰력을 쌓아가야 할 것이다. 그 축적된 힘이 결국 우리를 존엄하고 자유롭게 할 것이니까 말이다.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이슈추적] 불법 용도변경 ‘매입자 덤터기’ 사라지나](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08/news-p.v1.20250508.32c12c47e94645d3930c2931f4a45183_R.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