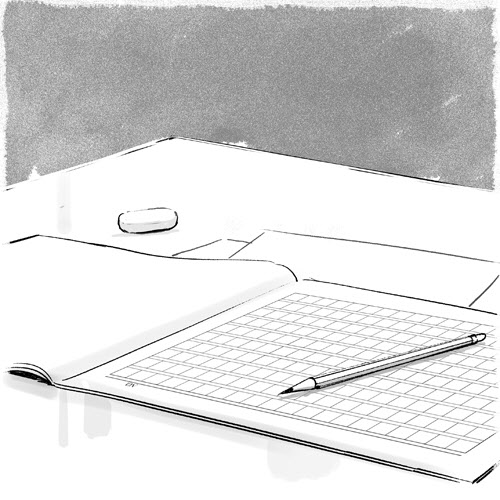
학생들이 소설을 쓰기전에
막연함을 걷어낼 수 있도록
힘있는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문학의 모호함을 고백하며
도대체 그런건 전달되는 것일까
회의하면서 수업을 마치곤 한다

졸업 무렵의 학교는 뭔가를 얻은 곳이 아니라 잃은 곳이었다. 연애는 뜻대로 되지 않았고 준비도 부족한데 학교에서 나가야 하는 시간은 가까워졌다. 소설을 쓰고 싶었지만 결국 소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사회로 던져졌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패배감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보면 소설이란 충분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시기였는데, 모든 게 늦었다고 느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모교가 아니라 나의 이십 대가 미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 수업을 나가면서 그때의 나에 대해 떠올리게 된 건 장소뿐만 아니라 강의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 때문이었다. 거기에는 십오 년 전의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있고 세련되고 인상도 좋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지만 왠지 거기에는 내가, 여전한 불만과 불안을 견디지 못해 창백해져 있는 내가 앉아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대학 시절 문학 수업의 장면들, 내내 졸다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나로서 '나임'을 찾는 동시에 '우리임'도 자각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던 선배의 모습이나, 문학은 약자를 위한 것이고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선하다고 믿는다던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다. 2011년에 우리 곁을 떠난 소설가 김용성 선생님이 그런 문학에 대해 가르쳐주신 분이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분명 가슴이 뛰었지만 그런 문학의 사명도 그 시절의 나를 완전히 구원하지는 못했다.
강의를 하면서 자꾸 오래전 나를 떠올리는 건 결국 수업 시간 동안 좋은 '선생'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닐까. 나는 소설에 관해 무언가 선명하고 자신감 있는, 학생들이 소설을 쓰기 전에 가지고 있을 막연함을 걷어내 줄 수 있는 힘 있는 말들을 해주고 싶지만 그럴수록 문학이라는 것의 모호함, 불가해함에 대해 고백하며 수업을 마치고 만다. 대체 그런 건 전달이 되는 것일까, 회의하면서. 나는 분명 전달 받았는데 그 전달 받음의 세세한 과정은 삭제되고 전달 받았음의 마음만 남아 있다. 말은 사라지고 마음만 남은 상태,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충분히 정확하게 전달된 소설 수업의 형태일까.
아무튼 스무 명의 학생들은 여름이 오기 전 모두들 한편씩 소설을 쓰기로 약속했고 그중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설을 쓴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결국 자기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내면을 스스로 인화하는 과정이고 타인과 기꺼이 공유하겠다는 마음이다. 출석부 이름과 소속, 학번, 그리고 두터운 점퍼 안에 가려져 있던 그 마음이라는 것이 점점 따뜻해질 계절의 온도와 함께 전달될 것을 생각하다보면 기대로 부푼다. 그러니 이렇게 학교로 돌아간 것은 나를 위해서도 잘된 일이 아닐까. 그 시절에 대해 전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할 테니까. 물론 스무 살의 나는 여전히 강의실에 앉아 있다가, 뭔가를 전달하고 싶어 끙끙대는 나를 보며 손을 번쩍 들어 질문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학은 정말 그러한가요, 하고. 지금 얘기하는 문학이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하고.
/김금희 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