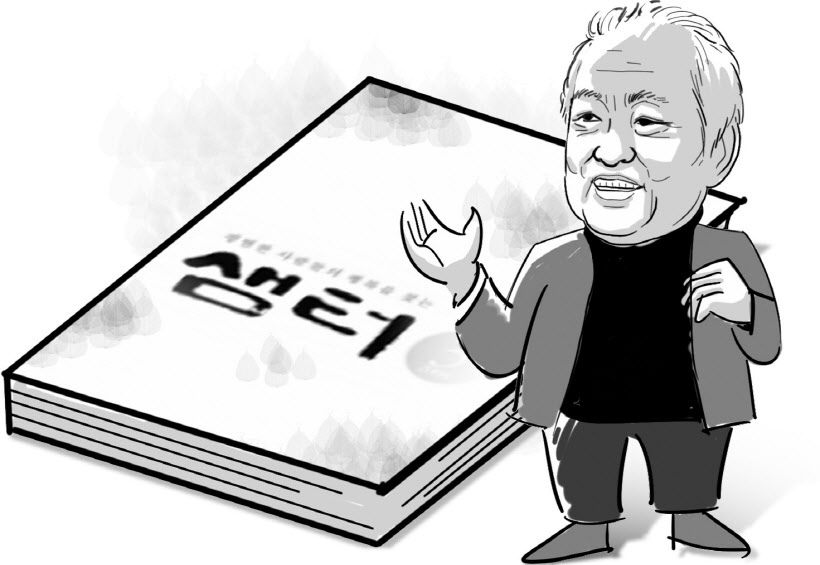
월간지 샘터가 지난 5월 창간 46주년을 맞았다. 오랜기간 이웃들의 가슴 찡한 사연을 소개하며 '삶속의 작은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깨우쳐 주었던 샘터가 내세운 건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교양지'였다. 미국에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샘터'가 있었다. 모든 게 척박하기 이를 데 없던 1970년대, 샘터가 또 다른 월간지 '뿌리깊은 나무'와 함께, 한국인의 교양을 무한하게 확장시켜 준 공로를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
고 최인호의 소설 '가족'이 월간 샘터에 처음 실린 것은 1975년 9월호였다. 2009년 10월호에 마감하기까지 402회를 연재하는 동안 걸린 시간은 무려 35년이었다. 샘터에 수록된 모든 글들은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국민들에게 큰 용기와 감동을 주었다. 수필가 피천득과 오천석, 법정 스님, 이해인 수녀 등 국내에선 글 좀 쓴다는 사람들은 모두 '샘터'에 글을 연재했다. 법정 스님은 1980년부터 96년까지 '산방한담(山房閑談)'을 120여개월 동안 연재했고, 이해인 수녀는 지금도 '흰구름 러브레터'를 연재하며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 주고 있다.
특히, 고 장영희 서강대 교수도 '샘터'의 단골 필진이었다. 그녀의 글들은 '내 생애 단 한 번'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도 출간해 지금도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 타인을 위해 삶의 빛을 밝힌 사람들의 실화 들을 엮은 오천석 전 문교부장관의 '노란손수건'에 수록된 번역 글들은 70년대를 힘겹게 살아가던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샘터'는 작았지만 강한 잡지였다. 샘터가 그 오랜기간 결호 없이 출간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암(友巖) 김재순(金在淳) 창간인 덕분이다.
샘터를 통해 '한글쓰기' '고운 우리말 찾기'에도 앞장 섰던 우암이 지난 17일 93세로 영면했다. 1993년 '토사구팽(兎死狗烹·토끼를 잡은 사냥개도 쓸모가 없어지면 잡아먹는다는 뜻)'이라는 말을 정치계에 유행시켰던 그는 7선의원의 정치가로도 족적을 남겼다. 생전에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든, 그가 있는 곳이 어디든, 거짓없이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의 말이나 글에는 감동이 있다. 감동을 아는 사람은 강하다"고 말하곤 했다. 늦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영재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