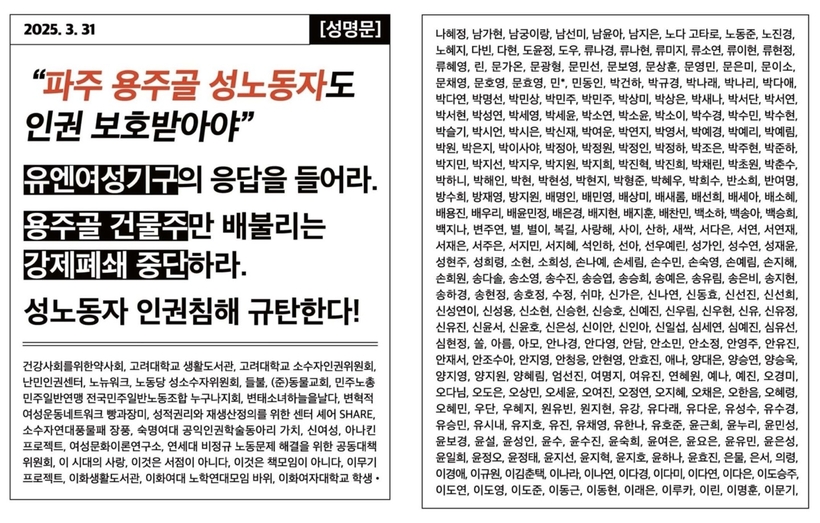미국의 기념일은 조지 워싱턴 탄생일(2월 22일), Epiphany(구세주 主顯祭→1월 6일)처럼 붙박이로 정해진 날이 거의 없다. 부활절(Easter)도 그 날이 보름달이 아니면 다음 보름달 이후의 최초 일요일로 밀려 3월 21~4월 25일 사이가 되고 노동절도 9월 첫째 월요일, 어머니날도 5월 둘째 일요일, 추석 격인 추수감사절도 11월 넷째 목요일이다. 그런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혼(忠魂) 오시는 날이자 충성기념일인 Memorial Day(전몰장병기념일→현충일)마저 5월 마지막 월요일인 건 좀 불경(不敬)스럽고 불손한 듯싶다. 금년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5월 30일 알링턴 국립묘지)의 오바마 대통령 연설이야 그럴듯했지만….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병력을 통솔하는 것보다 큰 책임은 없고 우리 병사들을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 것보다 엄숙한 책임은 없다'는.
영국도 1차대전 휴전 기념일(Armistice Day)인 11월 11일 직전 일요일, '기억의 일요일(Remembrance Sunday)'이 현충일이지만 고정된 날이 아니다. 우리의 현충일이야 해마다 6월 6일이라 메모리얼 데이로 기억하기도 좋다. 다만 예수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악의 상징인 666 숫자를 연상케 해 좀 그럴 뿐이다. 아무튼 해마다 현충일만 되면 구슬픈 가곡 '비목(碑木)'과 모윤숙의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가 아니더라도 가슴이 저며지듯 아프다. 1950년 6월 25~53년 7월 27일 휴전까지 3년 1개월 2일 간의 골육상쟁 동족상잔(同族相殘)으로 생때같은 목숨을 조국에 바친 우리 국군 전사자만도 13만7천899명이다. 낙동강 최후 방어전선에서 꽃잎처럼 산화한 수백 명의 학도병, 자유대한을 지켜주기 위해 멀리 이국땅으로 날아왔다 전사한 16개 참전국 4만 용사의 넋은 또 어찌 위로하랴!
'전우야 잘 자라' 노래를 아무리 불러준들 그들 충혼이 잠들 수 있을까. 하늘을 우러르며 땅을 치도록 북녘이 밉고 억울해 65년 66년 긴 세월 단 한 숨도 못자고 뒤척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서울 현충원 6·25 묘역 영령 80%는 연고자가 없다고 했다. 그러니 애타게 그 이름 불러줄 사람 하나 있을 리 없다. 현충일을 노는 날로만 아는 세월의 변색은 또 얼마나 안타까운가.
/오동환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