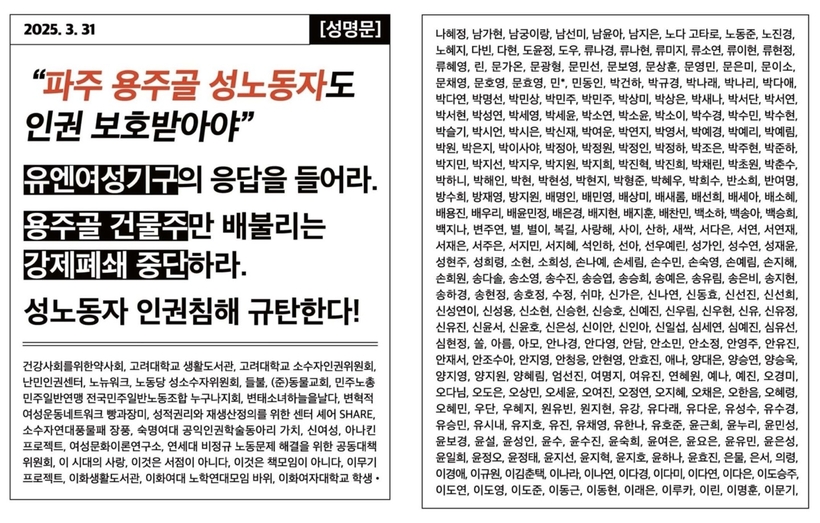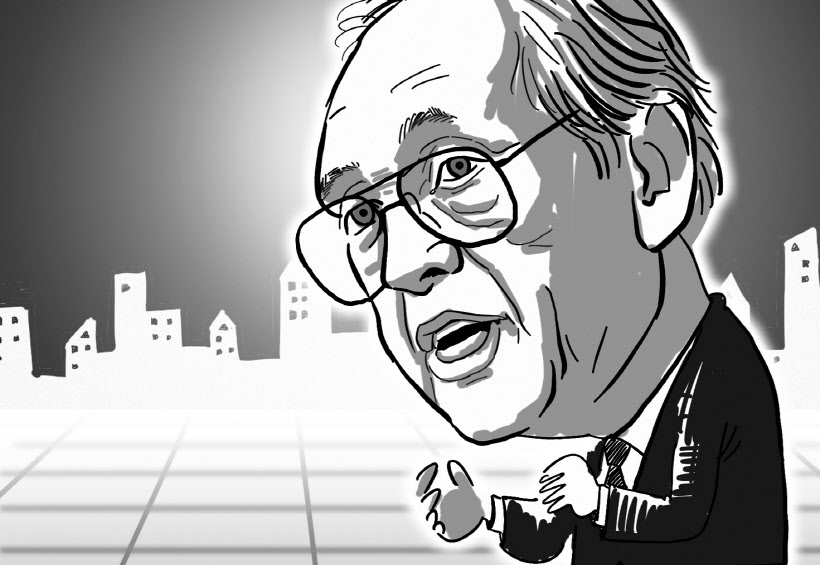
"냉전기간중 세계는 미국과 소련, 비동맹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러나 공산권이 몰락한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국가간의 문화적 요인에 의한 결속과 문화의 차이에 의한 대립이 두드러질 것이다. 따라서 이젠 서구문명이 아닌 다른 문명이 부상할 것이며 동아시아, 특히 중국이 주목의 대상인데 만약 중국이 부강해지면 아시아지역의 모습이 중국이 지배하던 역사의 옛 모습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역술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정치학자 입에서, 그것도 20년 전 했던 얘기다. 정치학자이며 미래학자 새뮤얼 헌팅턴의 명저 '문명의 충돌'은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지만, 놀랄만큼 정확한 예측으로 헌팅턴은 일약 세계적 석학이 됐다.
헌팅턴이 미래 정치를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졌다면, 그보다 한살 어렸던 앨빈 토플러는 디지털, 정보통신, 기업의 미래 등 경제를 예측하는데 있어 누구도 따라 오질 못할 탁월한 혜안을 가졌다. 미래학이란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다. 토플러는 늘 "변화는 미래가 우리 생활에 침투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가 타계했다. 향년 87세. 그의 예측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특히 우리에겐 더욱 특별해서 대한민국의 정보혁명을 빼고 그를 논할 수 없다. 그는 생전에 한국에 관심이 많았다.
1982년 당시 벽돌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두툼했던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이 준 충격은 컸다. 그는 이 책에서 수천년의 시간을 걸쳐 진행된 '제1의 물결'과 3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산업혁명의 '제2물결'과 달리 '제3의 물결'은 정보화 혁명으로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류 사회가 제조업 기반의 경제에서 지식과 데이터 위주의 사회로 이동해 갈 것이라는 그의 예측은 정확하게 들어 맞았다. 토플러는 우리나라의 정보기술 발전에 늘 감탄했다. 한국도 여러 번 방문해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2007년 방문때 그는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공장 근로자로 일했던 경험, 다독하는 습관, 세계를 돌아다니며 접한 다양한 문화가 미래학자가 될 수 있었던 영양분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저서 '권력이동'에서는 세계는 폭력이라는 저품질 권력에서 돈이라는 중품질을 거쳐 지식이라는 고품질 권력으로 이동한다고 정의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영재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