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낯선 한국학교 적응돕기
절반은 특성화 교육과정
최대 1년간 머물며 공부
무언가 주려는 생각 보다
이해 하려는 마음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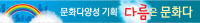
복도에는 이집트, 터키 등 각국에서 보내온 그릇, 장신구, 인형 등이 있어 여느 박물관 못지 않았다. 지난 25일 찾아간 전국 최초의 기숙형 다문화 대안학교인 공립 인천한누리학교(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풍경이다.
이 학교 박형식 교장은 기자를 만나 8개국어로 된 학교 설명자료를 내밀며 어느 나라의 언어인지 맞혀 보라고 했다.
기자는 자신 있게 러시아어라고 답했지만, 틀렸다는 답이 돌아왔다. 몽골어였다.
2013년 문을 연 이 학교에는 외국인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중도 입국 청소년,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탈북자 자녀 등 26개국에서 온 200명의 초·중·고교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낯선 한국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가르침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정규 학교의 교육과정과 특성화 학교의 교육과정을 절반씩 섞은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학생들은 6~12개월의 한국학교 적응교육이 끝나면 원래 소속된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어다.
박형식 교장은 "아이들이 한국 땅에서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한국말과 문화를 배우는 것"이라며 "각자의 모국과 한국의 다리를 놓는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보물 같은 아이들이다"고 했다.
이 학교의 장점은 일반 학교와 달리 적응기 학생의 스트레스를 덜어 줄 수 있도록 한국어 실력에 따라 '사랑방', '디딤돌' 등 수준별 한국어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인 캄보디아에서 온 고교 1학년반 A(16)양은 "선생님들이 나를 이해해줘 조급함 없이 천천히 한국말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도 많아 좋다"고 했다. 같은 반 학생이 10명인데, 9개 나라에서 왔다고 한다.
이 학교에서 이중언어 강사로 일하는 김사랑(33·러시아어)씨와 장향화(41·중국어)씨는 학생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고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어울리며 꿈을 키워 갈 수 있는 것이 학교의 장점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모두 각자의 집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엄마이기도 하다.
중3과 고2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장씨는 "다문화 가정의 엄마로 한국에 살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도하지 않은 차별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경험을 되새기며 이곳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내가 나고 자란 옛 소련 국가들에서는 다른 민족이나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구분 짓는 '다문화'라는 단어조차 없다"며 "한국에 첫 적응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만큼 어려움을 덜 겪도록 여러 선생님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문화 교육 현장에서 강사로 다문화 가정의 엄마로 살며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있는데, 다문화 정책이 가장 필요한 것은 '다문화'로 불리는 대상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평범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씨는 "달라 보인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더 주어야겠다는 정책이나 시선보다, 다문화가 무엇인지 배우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나 다문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이 기사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인천문화재단이 협력해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