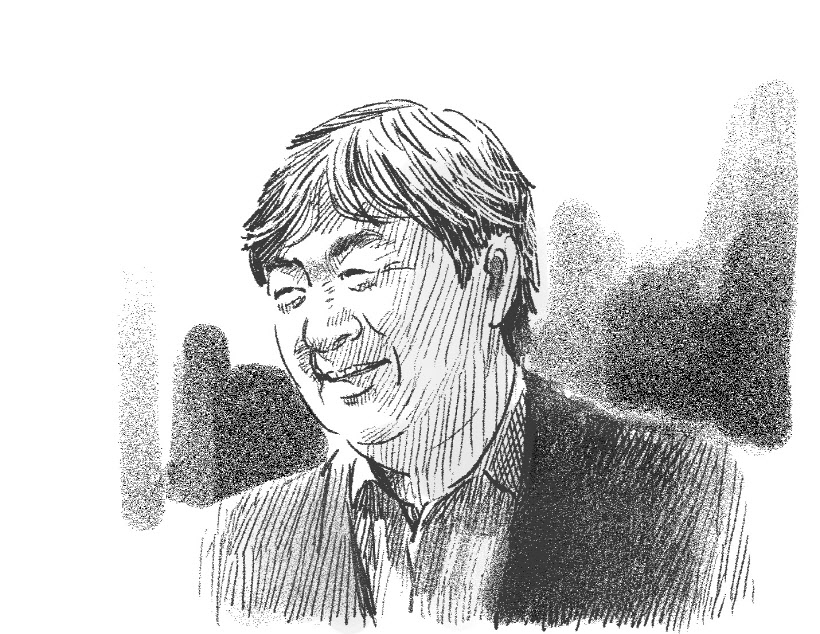
시인 '최동호'는 젊은 시인들의
시에서 느껴지는 부정적 징후
난삽·혼종·환상·장황을 지적
대안인 '극서정시'란 용어 사용
서정시 본연의 절제와 여백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하고 있어

시인이자 평론가인 최동호는 극서정시에 대한 의욕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젊은 시인들의 시에서 느껴지는 부정적 징후들 예컨대 난삽, 혼종, 환상, 장황을 지적하면서,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극서정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 이면에는 서정시 본연의 절제와 여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강조가 담겨 있는데, 그만큼 그는 번다한 수사를 제거한 서정시의 응축적 묘미를 살림으로써 고도의 시적 긴장을 유발하게 하는 원리로서 극서정시를 제안한 것이다. 요컨대 극서정시란, 시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단형으로 구성된 시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최동호는 21세기 디지털이 지배하는 시대의 시대정신을 집약한 결실이 극서정시라고 명명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 시의 중요한 미적 대안을 성찰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극서정시의 필요충분조건이 짧은 길이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형식으로 시를 구성하는 생략과 응축의 방법론이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퍽 자연스럽다. 그리고 단일한 전언과 이미지가 강렬하게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훨씬 효과적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극(極)'이라는 접두어에는 물리적 극소(極小)의 의미보다는 극도(極度)의 집중성과 응축성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이 모든 사례가 최동호 스스로 밝힌 "여백과 서정이 극소의 언어 끝"('시인의 말', '얼음 얼굴', 2011)에서 완성된 성취들일 것이다.
물론 일정한 길이를 가지면서 그 안에 복합적 의식이나 시간의 오랜 흐름을 담는 양식 또한 우리 시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새로운 충격과 전율을 통해 미학적 경험의 새로운 파문을 깊이 있게 만드는가가 핵심 관건일 것이다. 그 점에서 작품의 길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비유하자면 짧은 과잉도 있을 수 있고, 기나긴 결핍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극서정시의 미학적 가능성은 서정시 본연의 절제와 여백이 불필요한 수사를 제거하고 서정시의 응축적 묘미를 살려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극서정시는 학계에 보편적 동의를 얻은 양식 명칭은 아니다. 다만 최근 왕성하게 창작되는 난해하고 긴 시편들과는 철저하게 반대편에서, 언어와 사유를 응집하는 방향에서 씌어지는 시편들을 방법적으로 명명한 것일 따름이다.
극서정시의 관점에서 볼 때, 최소한도의 응축이 없이 시는 존재할 수 없다. 문학이 공공연히 상품 미학의 후광을 입고 유통되는 소비의 시대에, 작가들이 문화 산업의 일원임을 떳떳하게 자임하는 이 시대에, 시에 대한 이러한 본질주의적 관점은 시의 정체성에 대한 심층적 사유를 가능케 해줄 것이다. 그래서 극서정시는 한국 현대시의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게끔 하는 유력한 방법론적 범주로 부상해갈 것이다.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