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그들의 선한 이야기가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가 하는점
이번엔 다수의 기계적 선택 아니길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지않은 사람보다 많은게 '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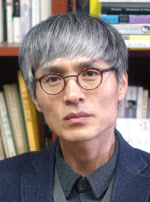
"고을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좋지 않다."
"고을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좋지 않다. 고을 사람 중에서 선(善)한 사람은 그를 좋아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미워하느니만 못하다."
공자의 대답은 뜻밖이다. 고을의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대답이야 수긍할 수 있다 쳐도 고을의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오히려 공자는 선한 사람은 좋아하고 불선한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반드시 비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공자의 말대로라면 고을에서 선한 사람의 수가 불선한 사람의 수보다 많아지면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무엇이 선인지는 예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각기 다른 견해를 내놓았을 만큼 풀기 어려운 문젯거리다. 이를테면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에우다이모니아는 모두 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각기 다른 견해다. 16세기 조선의 성리학자 이황과 기대승이 8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다퉜던 주제도 다름 아닌 선과 욕망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이었다.
그런데 고대 동아시아인들이 어떤 것을 선이라고 생각했는지는, 선(善)이라는 문자의 자의(字義)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한자의 선(善)은 양(羊)자와 공(公)자가 위아래로 배치된 글자다. 여기서 양(羊)은 뿔 달린 양을 그린 글자이고 공(公)은 함께 나눠 먹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 글자다. 따라서 나눠먹으면 선(善)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선(不善)이다. 사람과 사람의 평화로운 공존을 뜻하는 화(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화(和)자 또한 본래 벼를 그린 화(禾)와 공(公)이 합쳐진 글자(和의 옛글자는 '禾公'이다)로 수확한 벼를 나눠먹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선과 평화는 가진 것을 나누는 데 달려있다는 것이 이 두 글자에 들어 있는 오래된 진리다.
나눔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고을은 선한 사람이 불선한 사람보다 많은 고을이다. 그런 고을에서는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많다. 이것이 선한 고을의 본모습이다.
불행히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지금의 이 나라는 선한 고을과는 거리가 먼 듯하다. 빈부의 양극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자살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노동시간 또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긴 나라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헬조선이나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세간의 말들을 그냥 귓가로 흘려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라의 불선(不善), 불화(不和), 불의(不義)는 심각하다.
올해는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헌법재판소 판결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지만 광장의 민심을 헤아려보면 현재로서는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은 저마다 공약을 내걸고 자신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적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면면을 살펴보면 그 어느 때보다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아 보인다. 어떤 이는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사회수당을 강조하고, 어떤 이는 일자리 확대가 답이라고 주장한다.
지향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모두 나눔을 더 늘리자는 이야기이니 공자가 말한 좋은 사람이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가 싶다. 문제는 그들의 선한 이야기가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가 하는 점일 것이다. 이번에는 다수의 기계적 선택(選擇)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뽑는 '선택(善擇)'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거니와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이 선한 고을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