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언론이 인정하는 '사실' 조차 부정
정치적 저항보다 존재론적 축제일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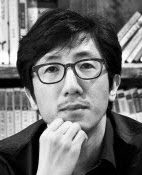
그들은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믿는다. 대통령 주변의 일들을 대통령은 의도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생도 충분히 가질만한 이런 의문을 그들은 외면한다. '억울한 사람이 왜 피하는가?' 억울한 사람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기회(자리)일 것이다.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마다한다면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통령은 사법 제도와 모든 언론이 열정적으로 제공하려 한 그 기회를 전부 거절하고 어느 인터넷 방송국 진행자를 독대했다.
온 세상이 함께 검증한 사실도 부정하고 명백히 의심스러운 것도 외면하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정신병리학이라면 망상(delusion)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는 '대통령과 우리는 부당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식이니까 피해망상이 되겠다. 의학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다. '주변 사람이 아무리 그 잘못을 지적해도 교정되지 않으며 또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망상의 내용을 가지고 논쟁하지 마라.' 환자는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그들을 '피해망상증 환자'로 규정하고 대화를 포기하면 그만일까?
그러고 싶다는 유혹을 느끼면서도 그 유혹에 저항하려 애쓰고 있다. 그 대상이 누구건 어떤 이들을 간편하게 '규정'하고 '배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폭력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내가 본 것은 서울 시청 광장에서 노숙하며 태극기 농성을 하는 분들의 인터뷰였다. 세상의 모든 언론에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 계엄령의 필요성까지 역설할 때, 그들의 어조는 분명 분노에 차 있었지만, 그 순간 그들에게서 내가 감지한 정서는 어떤 벅찬 충만감이었다. 그것은 아주 오랜만에 '살 맛 나는' 시간을 보내는 중인, 삶의 입맛을 되찾은 이의 에너지였다.
애초부터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들이 대통령을 '호위'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용'하고 있다고 느꼈다.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누구나 무엇을 이용한다. 공허한 삶을 '의미'로 채우기 위해서는 이용할 무엇이 필요하다.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 그 일을 할 때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살 가치가 있다는 것… 그런 느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삶은 얼마나 충만해지는가.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태극기 집회는 정치적 저항이라기보다는 존재론적 축제일지도 모른다.
김현경의 책 '사람, 장소, 환대'에 따르면 '인간'과 '사람'은 다르다. 인간은 그냥 '자연적 사실'의 문제이고 사람은 '사회적 인정'의 문제라는 것. 한 '인간'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며,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 우리 사회가 장년층, 노년층을 사회적 인정의 장에서 배제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삶의 의미를 생산해내는 거대한 발전소를 만든 것이라면, 그것은 단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기만 할까. '사회적 인정'의 영역에서도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는 날들이다.
/신형철 문학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