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글씨
일본인들 '우물에 독약 타 폭동'
유언비어 퍼뜨려 6천명 넘게 학살
슬픔을 '기억'하는건 되레 과거를
현재로 되살려 내려는 힘 지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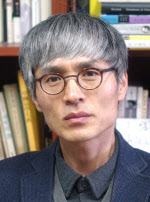
연구팀을 이끄는 분은 올 초 서울대 의대를 퇴임한 황상익 명예교수다. 황 교수는 의사이긴 하지만 의사학(醫史學) 전공자이기에 어디를 가든 답사가 기본이라 걷는 거리가 상당하다. 이번에도 하루 평균 17㎞ 정도를 걸었다. 덕분에 최근 오래 앉아 있어서 생겼던 허리통증이 씻은 듯 사라졌다. 의사와 함께 다니면 이렇게 덤으로 얻는 이득이 있다.
박물관에 도착했지만 개관까지는 시간이 한참 남아 있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외쳤다. '옳거니! 오늘은 아침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여의치 않았다. 문을 연 식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곳은 문을 열었지만 '준비중(準備中)'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던 편의점에 들어가 먹을거리를 찾았다. 나는 따끈한 우동국물이 먹고 싶어서 우동 사발면과 삼각 김밥을 골랐다. 계산을 하고 나서 부스럭거리며 음식을 꺼내 먹으려고 하는데 지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편의점 안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며 우리를 내보낸다. 쫓겨난 우리가 거리에서 엉거주춤하고 있던 차에, 나는 오던 길에 공원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 일행에게 공원에 가서 먹자고 제안했다.
공원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벤치에 앉아 각자 고른 음식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내가 고른 우동은 육수까지 포장되어 있었는데, 살펴보니 육수 포장지에 냉(冷)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내가 바라던 따끈한 우동이 아니라 차가운(冷) 우동이었던 것이다. 얼핏 냉(冷)자 위에 우리를 쫓아낸 지배인 얼굴이 겹쳐 보였다.
허기를 해결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한쪽에 비석이 세워져 있는 게 보였다. 무슨 비석인가 싶어 가까이 가보니 '추도(追悼)'라는 두 글자가 큰 글씨로 새겨져 있고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라고 새겨져 있었다. 가슴이 아리고 목이 메어왔다.
"아, 이 비석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따뜻한 아침을 먹지 못하게 했구나."
비문을 읽어보니 위령비를 세운 것은 1973년의 일이라 한다. 그러니까 대지진 이후 50년, 일본군국주의가 패망한 지 28년이 지나서야 세워진 것이다.
1923년 9월에 일어난 대지진 당시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타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무려 6천명이 넘는 조선인을 학살했다. 학살을 주도한 자는 조선인 폭동 단속령에 따라 각지에서 조직된 자경단(自警團)이었다지만 학살이 가장 먼저 자행된 도쿄와 가나가와현에서는 군대와 경찰이 중심에 있었다.
비 앞에서 묵념하면서 당시 조선인들이 느꼈을 절망감이 어땠을지 생각해보았다.
그들은 평시에도 일상적 차별로 인해 생존이 쉽지 않았을 터인데, 지진이라는 자연 재앙을 만났으니 보통의 일본인들보다 두려움이 훨씬 더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웃이 갑자기 자신들을 폭도로 몰아 죽이려 했으니 억울함과 두려움이 몇 배 증폭되었을 텐데 일본이라는 국가는 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도리어 학살을 방관하거나 자행했으니 그 공포와 절망감은 이루 다 짐작조차 못할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비에 새겨진 추도(追悼)의 '도(悼)'는 그런 절망감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다. 도(悼)는 본디 '현재의 슬픔'을 가리키는 글자이고 추(追)는 '기억한다'는 뜻이다. 곧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기억을 가리키는 말이 추도다. '추(追)'자는 어떤 말의 앞에 놓이면 그 말을 과거로 밀어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추도라는 말에는 그런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슬픔을 '기억'하는 행위는 도리어 과거의 일을 현재로 되살려내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비 앞에 멈춰 섰다. 저 비에 새겨진 슬픔을 지나간 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글자도 나는 생각해내지 못할 것이다.
/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지금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