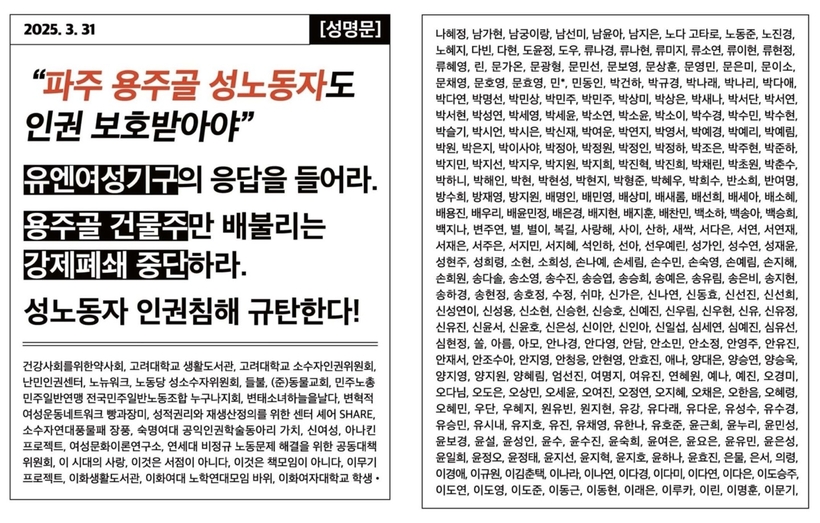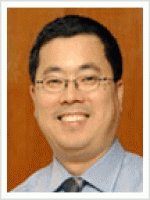교육에 정치색 덧칠한 그의 정책 '파열음'
개혁안 5~10년 못 버틸 '반쪽짜리 상품들'

유례가 드문 1박 2일 청문회 행군에도 김상곤 후보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꼿꼿하고 당당했다. 논문 표절 의혹은 '당시에는 연구 관행', 사회주의자란 이념 공세에는 '나는 자본주의 경제학자'라고 맞받았다.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 먼저 주저앉은 건 야당 의원들이다. 헛심만 쓰다 제풀에 쓰러졌다. 야당은 후보자에게 화력(火力)을 집중할 수 없었다. 여당 의원들과 힘겨루기를 하느라 그나마 남은 배터리를 소진해 버렸다. 여느 청문회와는 다른 양상이다. 야당 의원들은 과녁 반대쪽으로도 화살을 겨눴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싸우고, 후보자는 지켜보는 해괴한 청문을 봤다. 호남이 절실한 국민의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도왔다. '부적격하다'는 꼬리표를 달고.
대통령이 그를 지명했을 때 직감했다. 낙마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다른 교육장관 후보자에게는 사약이 됐을 논문표절 논란도 (그에게는) 별 게 아닐 것이다'. 그의 지인들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철벽 내공(內功)을 잘 알고 있기에.
경기교육감 시절 일이다. 당이 다른 보수 정치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무상급식과 학교용지분담금 등 사사건건 그와 맞섰다. 결과는 백전백패. 당시 교육 업무를 맡은 도청 간부는 교육감 때문에 김 지사에게 수차례 꾸지람을 들었다. 합의된 것으로 알고 보고했는데 교육감이 언제 그랬느냐며 오리발을 내미는 바람에 바보가 됐다는 거다. 김상곤 특유의 애매한 발언을 섣불리 단정해 빚어진 참사다. 그 간부는 '정신 바짝 차리는데도 늘 당하기만 해 스트레스가 엄청났다'고 한다.
교육감인 그와 식사를 했다. 대게 밥 사는 쪽 어른이 대화를 주도하고 얻어먹는 쪽은 말 수가 적은 게 상례이지만, 그는 달랐다. 시종 듣기만 했고, 이것저것 물어봐도 대답은 짧았다. 옅은 미소에 온화한 표정으로 허리를 곧게 폈다. 내내 같은 자세다. 보는 것으로도 숨이 차오른다. 가만 앉아서도 상대를 질리게 하는 등선(登仙)의 경지다. 다른 자리에서도 그런가 했더니,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수년 전 지역의 한 교육청은 유례없는 승진 인사로 들썩였다. 교육장은 부교육감으로 영전했고, 교수학습국장은 교육장이 돼 옆 방으로 옮겼다. 교육장이 부감이 된 거나 국장이 해당 교육장이 된 것 모두 전례 없는 파격이다. 과장(사무관)은 국장(서기관)이 돼 부임지로 떠났다. 부감이 된 교육장은 교육감과 동향이었다. 내 사람 챙기기와 인사를 통한 조직 장악의 혁신 사례다.
그가 교육부 관리들을 다루고 조직을 휘어 잡는데 긴 시간은 필요치 않아 보인다. 학생운동에, 교수에, 교육감을 지냈다. 이미 먹던 밥이다. 교수를 하면서도 시민운동을 했고, 전교조와도 가깝다.
스타일은 구겼지만 공력(功力)으로 무장한 '김상곤 호(號)'는 얼마간 순항할 것이다. 정권 초기의 추진 동력이라는 든든한 원군도 있다. 어지간한 저항 군(軍)은 막아설 '깜'이 못 된다.
문제는 편향(偏向)이다. 한쪽만 바라보니 다른 편은 아우성이다. 취임하자마자 '특권교육을 청산하고 교육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청사는 그의 철학을 담아내려 바쁘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자사고·외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교육에 정치색을 덧칠한 그의 정책엔 찬반 꼬리가 붙는다. 자사고 폐지는 국민 절반이 찬성하지만, 40%는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이를 두고 진보와 보수가 또 파열음을 낸다.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 정책은 혼란과 불신만 키웠다. 국민들은 '이번에는 제발 바꾸지 못할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내놓으라'고 한다. 그런데 그가 꺼낸 개혁안은 5년, 길어야 10년을 못 버틸 반쪽짜리 상품들이다. '김상곤 선장'의 출항에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까닭이다.
/홍정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