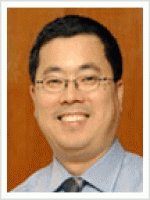수주현장의 불공정 유발인자 안 보이는것 같다
'뻔한 적폐' 못 보는건지 안 보는건지 왜 놔둘까

그는 건설업체로부터 3차례 8천만원을 받고 평가위원 명단을 알려줬다.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키 맨(Key Man)'인 그를 돈으로 유혹했다. 금품과 명단이 교환됐다. 건설사는 새벽부터 평가위원 집 앞을 지키다 돈다발을 건넸다. 평가위원인 대학 교수가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자폭하면서 탈이 났다. 건설사 간부와 직원, 평가위원, 공무원 등 17명이 처벌을 받았다.
다른 업체가 평가위원 후보자 25명에게 2~3년간 향응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리한 비리도 드러났다. 29명이 무더기 사법 처리됐다. 건설업체와 교수, 공기업 직원, 공무원, 현역 군인이 연루된 '먹이 사슬'이 공개됐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토목·건축·도로·교통 등 23개 분야 전문가 200여 명으로 운영된다. 기술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공무원, 대학교수,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다. 2년 임기에 공모를 받아 선발된다. 경기도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대형 사업의 기술심사를 한다. 발주처는 심의위가 산정하는 기술점수 60점에 가격점수 40점을 더해 수주 업체를 정한다.
심의위가 구성되면 건설사는 학연·혈연·지연을 통해 탐색에 나선다. 직원 한 명이 2~5명씩 전담 마크를 한다. 치밀하고도 집요한 접근전이 전개된다. 이들은 '노출된 만남'을 극히 꺼린다. 꾸준하고 은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게 업계의 불문율이다.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과는 10년이 넘도록 인연의 끈을 놓지 않는다. 사무관, 서기관이 되면 밥값을 하게 된다.
300억원이 넘는 관급공사는 대기업과 지역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야 한다. 도 조례로 정했다. 지역 업체 지분은 최대 49%다. 삼성 현대 등 국가대표가 종종 3부리그 선수와 어깨동무를 하는 이유다.
합체한 '식구(食口)'는 역할을 분담한다. 기술심사 평가는 대기업이 전담한다.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이나 재무제표는 쓸모가 없다. 도 조례에 지역 업체를 평가하는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결정타를 날리는 건 3부리그 선수라는 게 업계 정설이다. 대관(待官) 업무에, 심의위원들을 움직이는 정무(政務)에서 지역 업체 간 우열(優劣)이 갈린다.
올 상반기 경기도 신청사 입찰에는 3개 컨소시엄이 나섰다. 특정 컨소시엄이 유력하단 설이 돌았다. 주관사만 보면 도급순위가 아래다. 수차례 전투에서 승리한 도내 3부리그 선수가 '한 식구'였다. 예상은 맞았고, 뒷말이 남았다.
발주 공고가 나면 지역 업체가 대기업에 먼저 손내미는 게 상례지만 반대일 때가 있다. 잘나가는 회사라면 사정이 다른 것이다. 정보를 미리 캐내 대기업에 선 제안을 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초기 비용을 지역 업체가 냈지만 n분의1이 많아졌다. 대기업이 쏠 때도 있다. 위상이 달라지면서 갑과 을이 바뀐 것이다.
몇몇 특정 지역 업체의 싹쓸이 이면에는 '불공정 게임 룰'이 작동한다. 시공능력과 재무제표가 소용없으니 정무에만 매달린다. 유능한 현장 기술자가 아닌 퇴직 공무원을 중용하는 이유다. 수주만 하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지분을 챙길 수 있는 '일그러진' 구조다. 이러니 국가대표가 3부리그 선수 눈치를 보는 거다. 무능해도, 공사현장을 몰라도 되는 법과 제도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없다.
중앙부처 관리들은 건설산업법을 줄줄 외운다. 도(道) 공직자들은 조례안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긴다. 새 정부와 여당은 '적폐 청산'을 입에 달고 다닌다. 그런데 이들 눈에는 관급공사 수주 현장의 불공정 유발인자(誘發因子)는 안 보이는 것 같다. 왜 뻔한 적폐를 그냥 놔두는가. 못 보는가, 안 보는 건가.
/홍정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