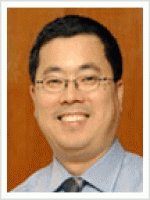어린 시절, 여름방학이 끝나갈 즈음에는 산으로 들로 나서야 했다. 곤충을 잡아 모으기 위해서다.
1970년대 시골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의 여름방학 숙제는 일기 쓰기와 곤충채집이 단골 메뉴다. 방학 내내 퍼질러 놀다가 개학 날이 가까워지면 산수 문제풀이에 밀린 일기장 채우는 게 걱정이 되는데, 곤충채집이 제일 난감했다.
지금이야 잠자리채를 쉽게 살 수 있지만 그때는 직접 만들어야 했다. 망으로 쓰기에는 모기장 쪼가리가 딱 좋은데, 여간 귀한 게 아니었다. 엄마에게 꾸지람을 들어가며 잠자리채를 만들었어도 날개 있는 곤충을 잡기란 쉽지 않았다. 나비와 잠자리, 벌 정도는 쉽게 볼 수 있는데, 10종이 넘는 곤충을 다 잡으려면 2~3일은 쏘다녀야 했다. 다가가면 도망치고 또 날아오는 잠자리 때문에 약이 올라 꼭 잡고야 말겠다며 날뛰기도 했다. 끝내는 형이나 누나들의 도움을 받고서야 숙제를 할 수 있었다.
곤충은 4억 년 전 고생대 데본기에 처음 등장한 뒤 지구촌 전역에서 번성했다. 인간의 조상은 고작 200만~300만 년 전이니 선배도 이런 대선배 종(種)이 없다. 같은 모양의 벌과 나비인 것 같아도 이들의 진화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무려 120만 종류나 된다. 그 숫자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무수하다. 지구촌 전체 동물은 125만 종이다. 갑각류가 지배하는 바다를 제외하면 수와 종류에서 지구별을 지배하는 동물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약 1만2천여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분류되지 않은 미확인 종도 많다고 한다.
다 큰 아이들이 귀뚜라미를 보고도 징그럽다고 소란이다. 푸른 숲과 개천이 없는 콘크리트 도시에서 나고 자란 까닭이다. 곤충 생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복잡하고 조화롭다. 징그러운 번데기가 우아한 나비로 변신하는 우화는 경이롭다. 모기와 진드기 등 해충(害蟲)들도 생태계의 당당한 주역이다. 자연 생태계의 하부 구조를 튼튼하게 떠받치는 게 곤충 세계다. 인간은 살충제를 뿌려가며 없애려 하지만 정작 곤충들이 사라지는 건 도시화와 서식지 환경 악화 때문이다. 무려 75만 종 이상이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 곤충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인간은 어찌 될까.
/홍정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