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정을 알고 불쌍히 여기고
가난해 자식 낳아도 못 거두면
길러줘 백성의 부모노릇 해야
이땅의 목민관 정치인·행정가등
다산의 마음 조금이라도 가졌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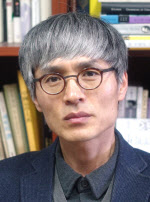
목민심서는 지방 수령이 부임(赴任)에서 해관(解官)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할 덕목과 지침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실무서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지방행정학 개론이나 원론 쯤 되는 책이다. 그런데 그런 행정실무지침서를 읽고 감동하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요즘의 그런 책들은 대개 영혼이 빠져 있는 글들로 채워져 있기에 하는 말이다.
다산의 목민심서는 그렇지 않다. 읽고 있으면 한 편의 문학작품을 읽는 것처럼 마음이 움직인다. 어느 대목에서는 불에 덴 것처럼 깜짝 놀라기도 하고, 때론 백성을 사랑하는 다산의 마음이 전해져 가슴이 먹먹해지거나 눈시울이 촉촉해진다.
다산은 먼저 목민관의 존재 이유를 물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목민관은 왜 있는가? 오직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 명제는 절대적이다. 수천 년 이어져 온 유학의 역사에서 이보다 위에 있는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무리 실무에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해도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자라면, 그런 자는 목민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산은 "다른 벼슬은 구해도 되지만 목민관의 자리는 구해서는 안 된다" 고 이야기한다. 오직 백성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진정성을 가진 자만이 목민관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산의 진정성은 역설적으로 그가 폐족의 신분이었기에 확인된다. 역모로 처벌받은 그는 절대 목민관이 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산은 목민하고자 하는 마음만은 끝내 저버릴 수 없었다. 이 책의 이름이 심서(心書)가 된 까닭은 다산이 그런 마음을 실어 쓴 글이기 때문이다.
다산의 마음이 보이는 대목을 몇 군데 들어보자.
해마다 망종(芒種)날이 되면 백성을 구휼하는 일에 수고했던 이들을 모아 잔치를 베푼다. 다산은 그 의미와 시행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이 잔치는 큰일을 끝내고 나서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지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므로 그저 한잔 술과 한 접시 고기로 수고한 이들을 대접하는데 그쳐야 한다. 죽은 자가 셀 수 없이 많고 산 자도 병에 걸려 신음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때에 어떻게 즐긴단 말인가. 큰 흉년 뒤에 수령이 잔치를 베풀면 백성들이 장구소리와 노랫소리를 듣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성낸 눈으로 질시하니,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춰서는 절대 안 된다. 수령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어찌 이런 짓을 하겠는가?"
흉년에 범죄를 저지른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흉년에 도적질한 자는 그 다음해에는 대개 양민이 된다. 이로 보건대 그들을 죽이는 것은 애석한 일이니 그 사정을 알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 맹자가 '흉년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사나워지고 풍년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순해지는 것은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했으니, 어찌 이들을 반역의 무리들과 견주어 같다고 할 것인가. 그런 자들은 유배시켰다가 풍년을 기다려 풀어주는 것이 좋다."
세금 징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봄에 곤궁한 백성을 구제하는 일은 마치 자식을 대하듯 하고, 가을에 세금 거두는 일은 마치 원수를 대하듯 해야 한다."
백성 중에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을 때 수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다.
"백성들이 가난하여 자식을 낳아도 잘 거두지 못한다. 흉년이 들면 자식 내버리기를 물건 버리듯 하니, 거두고 길러주어 백성의 부모노릇을 해야 한다."
다산은 자신의 글이 세상에 반드시 전해지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백년을 기다려도 좋다는 뜻으로 호를 사암(俟菴)이라고 한 적도 있다. 이제 다산이 세상을 떠난 지 181년이 지났다. 지금 이 땅의 목민관이 된 정치인, 행정가, 법관, 선생들은 다산의 마음을 만분의 일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다산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