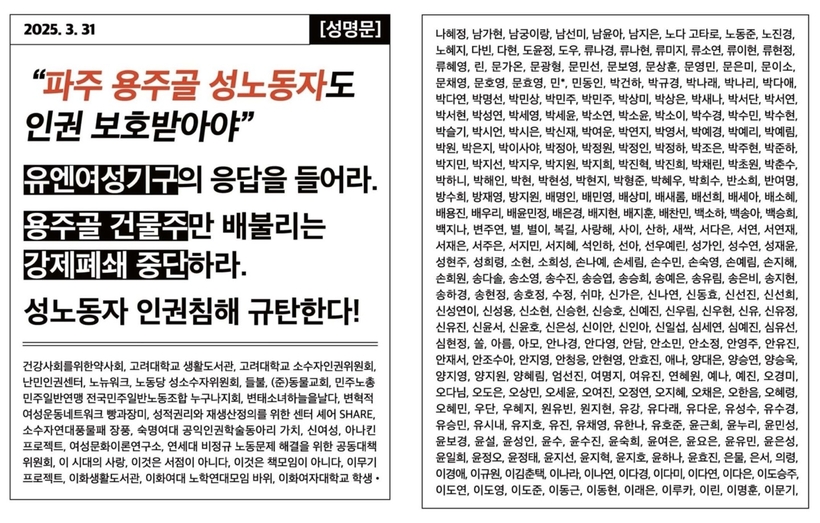보수정권들 권력 사유화·헌정농단 가능
근본적 치유위해 적폐 행위자 단죄 필요

적폐수사는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이 냉전반공주의에 편승하여 사회의 특권과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시켰던 과거 청산의 출발에 불과하다. 권위주의적 사회 운영 방식의 타파도 적폐청산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이번에도 수구세력의 저항과 반동에 의해 적폐가 묻힌다면 사회의 왜곡된 구조의 변혁은 불가능하다. 적폐청산과 한국사회의 미래가 동의어인 이유이다. 적폐청산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공직자·민간인 사찰 의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은 물론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과 군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조작 등 국가기관의 반헌법적 행위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MB 정부 국정원과 청와대의 블랙 리스트와 화이트 리스트 관여는 물론 BBK에 대한 다스 투자금 회수 개입 등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MB 정부 국정원과 군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규명을 위해 MB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의 최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적폐청산을 '감정풀이'와 '정치보복'의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수구보수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며 정치적 희생양 코스프레로 국면전환을 꾀하고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대의기구가 탄핵을 의결한지 1년이 된 시점에서 논평 한 마디 내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그릇된 관행과 왜곡되고 일탈된 퇴행적 행위를 바로잡는 일에 기간의 제한은 가당치 않다. 해방 직후 친일세력이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일제의 잔재는 청산되지 않았고 이후 권위주의 정권의 냉전주의에 편승한 기득권 세력의 특권화는 결국 적폐를 낳았다. 또 다시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작된 지난 '보수'정권들의 헌법유린 행위에 대한 수사는 이제 불과 4개월을 넘지 않았다. 일부 보수언론과 수구세력을 중심으로 적폐청산 피로감이 언급되는 등 수사의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적폐수사의 피로감은 세월호 때 등 주요 국면마다 등장하곤 했다. 피로감 프레임을 통해 국면전환을 꾀하는 반역사적 행태다. 연말이라는 시기는 적폐청산과 아무 관련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적폐수사를 '청산을 빙자한 정치보복'이라며 보수와 진보의 대결구도로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다. 프레임의 전환을 통해 반전을 노리는 정치공학이 현실정치(real politik)의 일부라는 점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에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냉전반공주의에 편승하여 각종 사회경제적 자원을 독점했던 세력의 기득권화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가속화시키고, 불평등 구조의 고착화로 이어진다. GDP 규모에 걸맞지 않는 사회적 불평등과 이기주의의 만연, 사회적 연대와 배려의 실종, 계층간 갈등의 심화는 지난 보수정권들의 권력의 사유화와 헌정농단의 토양위에서 가능했다.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적폐의 주된 행위인자들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필요하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을 대치시키는 구도는 뒤틀린 프레임이다. 반민특위의 해체의 명분은 안보위기와 국론분열이었다. 유신독재는 안보와 국민총화를 내세우고 정치적 배제와 억압을 일상화했다. 국론분열과 안보위기를 내세우는 낡은 보수의 역사적 퇴행에서 불의한 정권을 지탱했던 수구의 데자뷰를 본다.
/최창렬 객원논설위원·용인대 교육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