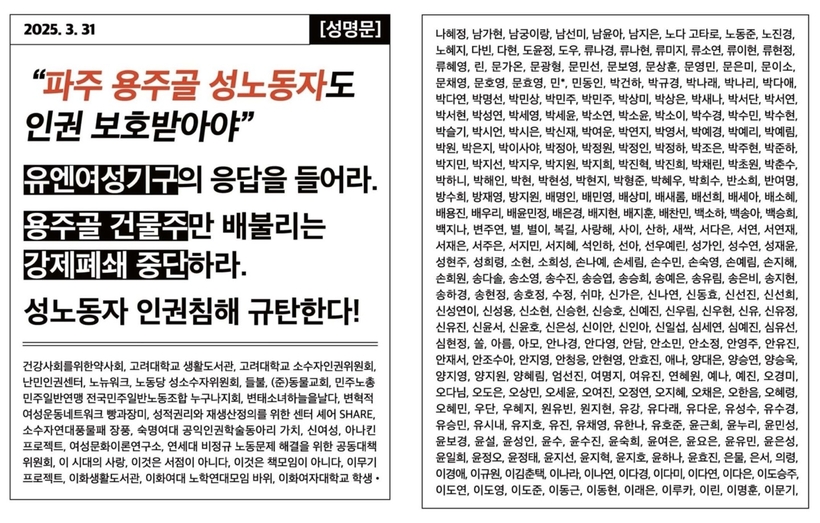어느 순간 상업도 사라지지 않을까 두렵다
창조적 파괴에 따른 서민경제 위축 더 큰일

요즘은 만나는 자영업자들마다 이구동성으로 경기가 외환위기 때보다 나쁘다며 한숨을 쉰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문구점과 식료품가게는 12%, 신발가게는 13%, 가전제품 매장은 3%씩 줄었다. 골목상권을 위축시켰던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위험지경에 처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는 향후 3년간 신규출점 중지를 선언한 상황이다.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지만 국민총소득은 꾸준하게 늘었다. 국민들이 소득이 늘어도 미래가 불안해서 함부로 지갑을 열지 못하는 것이 결정적 원인이다. 갈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는 와중에 언제 일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는 지경인데 함부로 소비지출을 늘릴 간 큰 사람들이 있겠는가. 금년 2분기의 총저축률이 36.9%로 1998년 3분기 이후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시사하는 바 크다. 소탐대실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초래한 결과이다.
전자상거래의 급신장은 설상가상이다. 시간을 허비하며 발품 파는 수고는 물론 점포 내에서 물건을 뒤적이다 주인 눈총을 받는 부담도 없으니 얼마나 좋은가. 오프라인상점 보다 가격이 매우 저렴한 것은 금상첨화이다. 상인들도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길목 좋은 점포를 지닐 필요가 없다. 무일푼의 구글 창업자들이 남의 집 차고에서 창업한 것이 상징적인 사례이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확산도 주목된다. 특히 중국의 공유경제 활성화가 이채롭다. 자전거, 우산, 휴대폰 배터리, 세탁기, 헬스기구, 수면방 등 사업영역이 전방위로 확산 중인 바 공산주의시절 경험과 맞물려 공유경제는 혁신적인 사업모델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자본 진출 등의 여파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각국 정부들이 규제에 팔을 걷어붙이는 추세이나 대세는 거를 수 없어 장기적으로 유통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해외직구 열풍은 국내의 '돈맥 경화'에 한몫 거들었다. 지난달 전세계 네티즌들을 유혹했던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光棍節)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이 기간 중에 해외직구가 최고조에 달했다. 파격적인 가격 덕분인데 미국과 중국의 유통업체들은 쇼핑기간 중에 제품 값을 무려 10분의 1까지 인하했던 것이다. 65만원 짜리 명품청소기를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주목되는 것은 국내의 해외직구 증가속도가 경이적이란 점이다. 2001년 1천300만 달러로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0.07%에 불과하던 해외직구 금액은 지난해에는 16억4천만 달러로 격증했는데 금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돌파할 예정이다. 해외직구는 대행업체나 오픈마켓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나 갈수록 소비자와 소비자간, 소비자와 제조업체 사이의 직거래 물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매킨지글로벌연구소(MGI)는 지구촌의 총생산(GDP)이 매년 1%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반면에 2030년까지 최대 8억 명이 실직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한경쟁에다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가성비에 주목한 스마트몹(smart mob)들의 맹활약이 세계물가 인하에도 상당히 기여했다. 아직은 사이버 상거래업체의 주가가 상종가이나 이 업태 또한 낙관은 금물이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드론 등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이 코앞에 닥친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미용이나 음식점 등 비교역재를 취급하는 서비스업을 제외하면 유통업이 빠르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룡처럼 어느 순간에 상업도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그나저나 창조적 파괴에 따른 서민경제의 위축이 더 큰일이다.
/이한구 수원대 교수·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