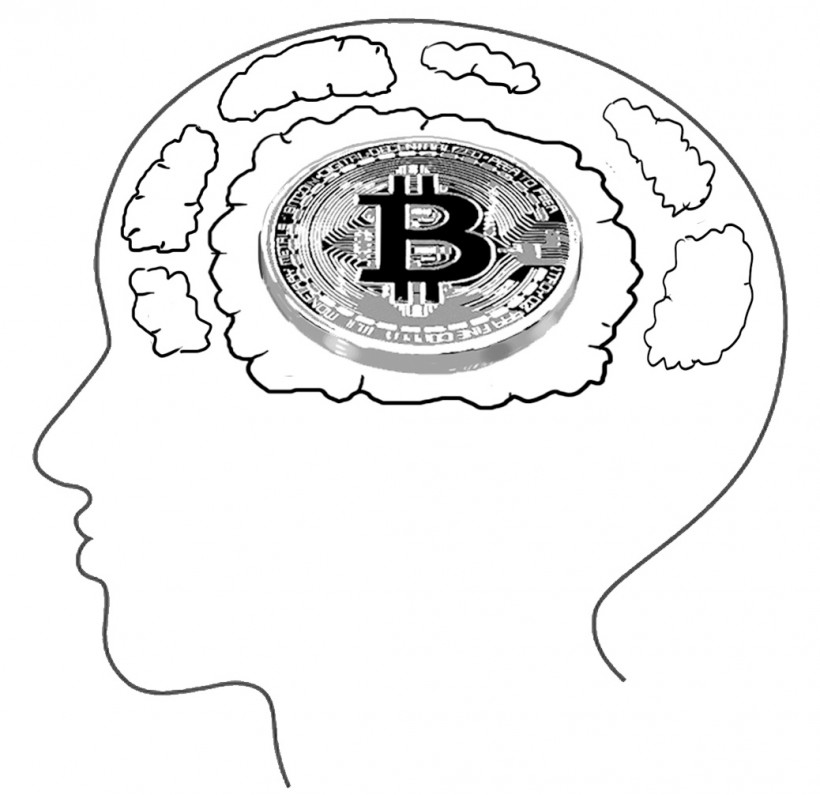
'소확행(小確幸)'은 글자 그대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일컫는 단어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1986년에 발간한 수필집 '랑겔 한스 섬의 오후'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에도 하루키의 책에 등장하곤 했다.
하루키는 소확행을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넣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쓸 때의 기분' 등으로 표현했다.
생긴 지는 꽤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2018년 소비의 주요 흐름으로 소확행을 제시하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사실 소확행이 뜬금없이 나타난 트렌드는 아니다. 2000년대 초의 '웰빙', 2010년대는 '힐링'이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고, 2017년에는 '욜로'가 등장하면서 각박한 세상에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을 대변한 것인데, 올해는 소확행이 그 계보를 잇게 됐다. 비싼 돈을 들여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보다는 자주, 가까이에 동네 맛집이나 핫 플레이스에 방문하는 것, 많은 비용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소확행의 핵심이다.
그런데 소확행을 실천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몰두했다가 낭패를 본 20~30대의 분노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배되고 있다. "한 학기 등록금을 날려 휴학해야겠다"든지, "전세금을 투자했다 마이너스 50%가 넘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는 것. 심지어 투자 실패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일부러 컴퓨터, 욕실, 각종 세간살이를 손과 망치 등으로 부수며 인증샷까지 올리는 네티즌들도 있다.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이들은 소확행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경제 양극화 속에서 사는 젊은이들이 오늘 하루 점심값을 벌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몇 십억을 벌었네, 몇 백억을 벌었네"하는 말에 현혹돼 한방에 팔자를 고치려고 가상화폐에 몰두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일이다. 안타깝지만 자신이 내린 결정은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김선회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