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오랜 지적 전통을
복원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
내가 되살리고 싶은 것은
오랫동안 지켜온 삶의 문법이고
그중 하나가 이름에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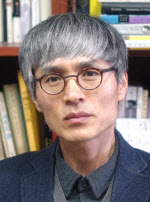
옛사람들은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명나라 말기의 학자 방학점(方學漸)은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방이지(方以知)'라는 구절을 따서 손자의 이름을 지었다. 올바른 도리를 지켜 지혜로워진다는 이름 덕택인지 방이지(方以智)는 고금과 동서의 지(知)를 망라하는 대지식인이 되었다. 그 자신의 이름인 학점(學漸)도 주역의 점(漸)괘에서 착안한 것으로 삼대가 주역학자였던 집안다운 이름 짓기라 하겠다.
방학점의 선배격인 명나라 중기의 유학자 담약수(湛若水)의 이름은 장자의 군자지교담약수(君子之交淡若水)에서 따온 것으로 '담(淡)'을 자신의 성(姓)인 '담(湛)'으로 바꾼 것일 뿐이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맑다는 뜻인데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다.
18세기 조선의 인물 중에는 멋진 이름을 가진 이가 많다. 그 중 단연 돋보이는 건 다산 정약용이다. 그의 이름 '약용(若鏞)'은 서경에 나오는 말이다. 다만 '약용(若鏞)'이라는 표현 그대로는 안 나오고 '약금(若金)'으로 찾아야 나온다. 서경 열명편에는 은나라의 고종이 부열을 등용하면서 "만약 쇠붙이일 것 같으면 너로 하여금 숫돌이 되게 하리라(若金 用汝作礪)"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 쇠붙이라면'이라는 뜻인 '약금(若金)'을 취한 것이다. 다산의 아버지는 이에 착안하여 아들형제의 이름에 모두 쇠금(金)자를 넣어서 '약전(若銓)', '약용(若鏞)' 등으로 지었다. 세상을 바로 잡는 저울(銓)이 되고 세상을 울리는 큰 종(鏞)이 되어 사람들을 깨우치라는 마음을 담았을 것이다. 이름이 좋아서인지 두 사람은 모두 이름값을 했다.
'청장관전서'를 남긴 이덕무(李德懋)의 이름도 서경에서 따온 것이다. 서경 중훼지고에는 탕임금의 공덕을 들면서 '덕이 훌륭한 사람에게는 관직을 주어서 덕에 힘쓰게 했다'는 덕무무관(德懋懋官)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덕무의 이름은 덕무(德懋)이고 자는 무관(懋官)이다. 합치면 덕무무관(德懋懋官), 서경의 글귀와 똑같다.
'북학의'를 지은 박제가(朴齊家)의 이름은 제가(齊家), 자는 수기(修其)였다. '제가'는 대학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제가이고, '수기(修其)'는 수기(修己) 또는 수신(修身)과 같은 의미로 재수기신(在修其身)에 따온 이름이니 자와 이름을 모두 대학에서 취한 것이다. 이 두 사람 또한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이름이 좋다고 반드시 이름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 현대 신유학자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양수명(梁漱溟)의 아버지는 이름이 제(濟)였고 자가 거천(巨川)이었다. 이 또한 서경 열명편에서 "만약 큰물을 건널 것 같으면 너로 하여금 배와 노가 되게 하리라(若濟巨川 用汝作舟楫)"고 한 대목 중 큰물을 건넌다는 뜻인 '제거천(濟巨川)'에서 따온 것이다. 양제의 아버지는 아들이 큰물을 건너는데 쓰이는 훌륭한 재목이 되라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하지만 양제는 청나라가 망하자 서세동점의 큰물을 건너지 못하고 적수담에 몸을 던져 자결하고 말았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나는 아들의 아명을 '웅비(熊비)'라고 지었다. 본명을 짓는 것은 할아버지의 몫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아명을 지었는데, 곰 웅(熊)자와 곰 비(비)자를 썼다. 웅비(熊비)는 시경의 시 사간(斯干)에 "곰 꿈을 꾸는 것은 사내아이를 낳을 조짐이다(維熊維비 男子之祥)"라고 한 데서 따온 것이다. 아들아이를 낳기 전 아내가 태몽으로 곰 꿈을 꿨기 때문이다. 시경의 구절대로 태몽을 꾼 셈이니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기만 하다.
/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