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선
교내 출입통제 강화하거나
경찰관 배치하는게 아니라
빵과 물 나누는 따뜻한 마음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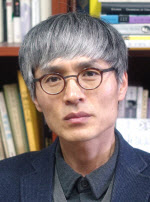
인질극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아이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에 돌아가기만을 빌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아이뿐 아니라 용의자 또한 무사히 검거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 나에게는 경찰이 건넸다는 빵과 물이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무슨 숭고한 물건인 것처럼 여겨졌다. 그 빵과 물은 인질극이라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게도, 인질로 잡힌 아이에게도 건네져야 할 신성한 무엇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빵과 물은 예사 물건이 아니다. 용의자는 주림과 갈증을 해소하는 빵과 물을 건네받고, 또 그것을 아이에게 건네면서 순간이나마 마음이 느슨해졌을 것이다. 아이도 긴장과 공포와 갈증에서 잠깐 한숨 돌리는 순간이 되었을 테니, 둘 사이에 오간 팽팽했던 시간의 틈새가 극적인 해결을 가져왔으리라.
그러다가 나는 만약 용의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누군가 그에게 빵과 물을 건넸다면 인질극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현실이 아닌 허구이지만,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에게 누군가 빵과 물을 건넸다면 어땠을까. 그가 빵을 훔쳐 감옥에 갈 일도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며칠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이 내 머릿 속에서 잊힐 무렵 마침 50주기를 맞이하여 새로 출판된 '김수영 전집(이영준 엮음·민음사)'을 펼쳤다가 저 일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김수영의 산문 '양계 변명'을 읽게 되었기 때문이다. 성북동에서 마포 서강 강변으로 이사해 살던 김수영은 생활고를 줄여볼 요량으로 닭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둑이 들었다. 가난한 시인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만 내가 더 놀랐던 것은 시인과 도둑의 첫 대화가 존댓말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거 보세요, 이런 야밤에…" 대화의 첫 마디에 따라 이후의 상황이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도둑 또한 존댓말로 "백번 죽여주십쇼,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었다. 이어서 시인은 도둑에게 집이 어딘지 물었고 도둑은 우이동이라 답했다. 우이동 사는 사람이 왜 이리로 왔느냐고 물으니 도둑은 그 이유는 자신도 모르며 여기서 잘 수 없는지 되물어왔다. 시인은 그가 취한 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보, 술 취한 척하지 말고 어서 가시오." 했더니 도둑은 두서너 발자국 걸어 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고 한다.
기막히게도 철조망을 넘어온 도둑이 어디로 나가야 하느냐고 물은 것이다. 시인은 도둑의 이 마지막 물음이 끝내 잊히지 않고 귀에 선하다고 했다. 도둑의 말을 단순히 문이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철조망을 넘어온 도둑이 다시 철조망을 넘는다면 그뿐이지만, 나가는 문을 물어 그리로 나간다면 적어도 다시 도둑질을 하러 가는 길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살아나갈 길이 있을 것인가.
결국 시인은 자신이 닭을 키우는 것도 도둑이 철조망을 넘어온 이유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며 자신과 도둑의 처지를 바꾸어 말하기에 이른다. 그는 이어 스스로 도둑이 되어 이렇게 말한다.
"백번 죽여주십쇼, 백번 죽여주십쇼,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김수영의 짧은 글 '양계 변명'은 이렇게 갈 곳 없는 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의 물음으로 끝난다.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할지는 사람마다 다를 테지만 나에게는 시인의 도둑과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인물로 겹쳐 보였다. 어디로 나가느냐고 묻는 도둑이 더 이상 도둑일 수 없는 것처럼, 인질에게 빵과 물을 건네는 인질범은 더 이상 인질범으로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p.s. 우리의 아이들이 참으로 안전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출입통제를 강화하거나 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일이 아니라 빵과 물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용의자는 아이를 붙잡으며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