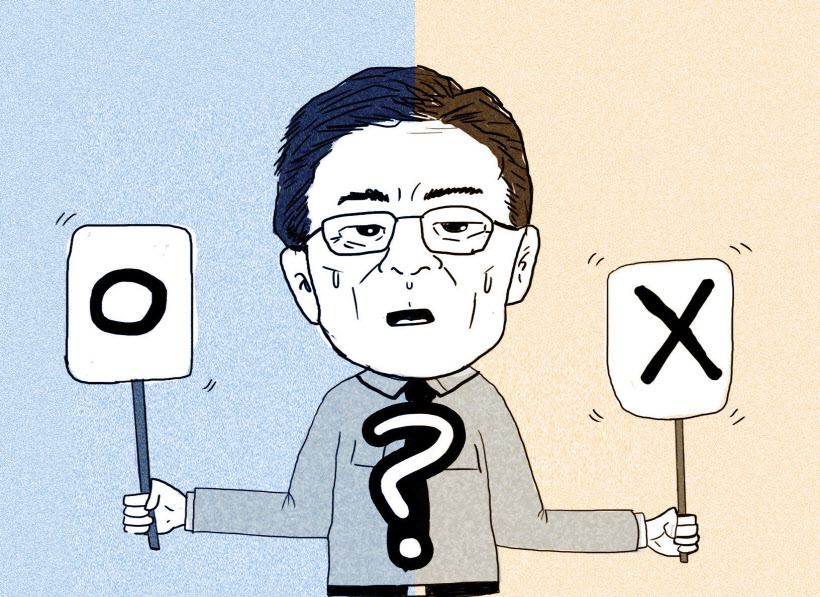
결정장애는 넘쳐나는 정보와 기회에 갇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현대인의 심리현상을 설명하는 신조어다. 지난해 한 취업포털 업체는 직장인 80.6%가 결정장애를 겪었다는 설문조사를 밝혔는데, 메이비족(Maybe族)은 이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독일 저널리스트 올리버 예게스가 '결정 장애세대(Generation maybe)'에서 처음으로 쓴 단어로, '글쎄요'라며 결정을 유보하는 신세대의 경향을 규정한 것이다.
사람들의 심리는 시장에 반영된다. 소비자의 결정장애를 치유하는 메뉴가 넘친다. 짜장면과 짬뽕 사이의 딜레마는 짬짜면으로 극복했고, 치킨집의 '양념반 프라이드 반' 메뉴는 위풍당당하다. 커피 마저도 컵을 반으로 나누어 아메리카노와 라떼를 반반 담아주기에 이르렀으니 가히 듀얼푸드의 전성시대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한판 위에 육·해·공 식재료가 한꺼번에 올라간 한국형 피자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낀다고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녁 회식 메뉴와 장소를 찾기위해 수많은 먹방프로그램을 순회하며 탈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결정장애를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것이다. 결정 과정의 스트레스는 물론 결정의 결과에 따르는 책임을 벗어던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결정의 위임은 주체의 상실로 이어진다. 자기의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사회적 신뢰를 잃기 쉽고, 사회성을 잃은 사람이 행복할리 없다.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우유부단함이 습성화된 사람 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말한대로다.
최근 권력핵심의 결정장애 현상이 눈에 띄어 걱정이다. 김상곤 부총리의 교육부는 대입제도개편안의 결정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미뤘다. 국방부는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필요한 장비반입 결정을 시민단체의 반대농성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압권은 청와대다. 김기식 금감원장 거취 결정을 중앙선관위에 위임했다. 결국 선관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장고 끝에 김 원장의 '5천만원 셀프 기부'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원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정무적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권력의 권위만 초라해졌다.
/윤인수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