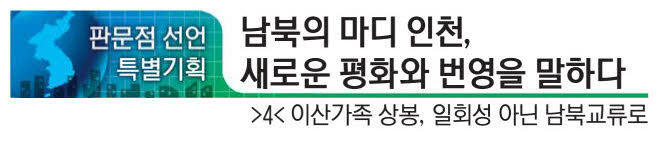
실향민들은 이번 상봉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고향 땅 방문과 상봉 정례화 등 차원 높은 교류로 발전하길 바라고 있다.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사는 김정애(여·62)씨는 지난 1월 황해도 벽성군 출신 실향민 아버지를 하늘로 떠나보냈다.
생전 고향 땅에 다시 가보는 게 소원이었던 김씨의 부친은 4·27 판문점 선언을 보지 못하고 향년 89세로 눈을 감았다.
평소 '눈물 젖은 두만강'을 즐겨 불렀던 그였다.
김씨는 "이렇게 빨리 대화가 진행될 줄 몰랐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마 회담 장면을 100번은 더 되돌려보셨을 것"이라며 "나중에 남북 교류가 활성화돼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이 온다면 아버지를 고향 땅에 다시 모셔 마음 편히 눈 감게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실향민 1세대는 대부분 사망하거나 고령에 접어들어 첫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던 1985년과는 상황 자체가 달라졌다. 실향민을 위한 획기적인 방식의 남북 교류가 필요한 시점이다.
1988년 13만1천896명에 달했던 남한의 이산가족 신청자는 30년이 흐른 지금(올해 4월 말 기준) 그 절반 이상인 7만4천772명이 사망했다.
그나마 생존자 5만7천124명 가운데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3만6천442명으로 63.6%에 달한다. 이 때문에 과거와 같은 '행사' 중심의 이산가족 상봉보다는 방북과 서신 교환 등을 비롯해 실향민 2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폭넓은 교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2016년 통일부 실태조사에서 이산가족들은 전면적 생사 확인, 사진과 유품 등 기록물 수집·보존사업, 기념관 건립, 민간 교류 허용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 실향민 이인창(89) 할아버지는 "고향에 동생 둘을 두고 온 실향민으로서는 희소식인데 옛날처럼 몇백 명 골라서 만나는 행사를 열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 마나"라며 "앞으로 자유롭게 서신을 왕래하고 선산에 성묘라도 가거나 고향 땅을 방문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적십자회담 개최 이후 이산가족 상봉 시기와 장소, 규모,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1985년 처음 시작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15년 10월 금강산 상봉행사를 끝으로 중단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남북이 함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선 이산가족들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교류방안도 지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