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대별 익혀야 할것들 팽개쳐 둬
싹 자라기는 커녕 더 말라가기만
사회구조 바뀌지 않는한 파행 지속
유일한 방법은 학생들 변화시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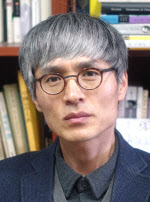
어떻게 해야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를 수 있는지 묻는 제자에게 맹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로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른바 알묘조장(알苗助長, 싹을 뽑아 자라는 것을 도와줌)의 고사로 '맹자'에 나온다.
호연지기는 한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도덕적 끈기와 유사한 것으로 플라톤이 이야기한 용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한 철학자답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것이 양심(良心)이다. 하지만 양심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얽히면 쉽사리 양심을 저버리고 이익을 취하기 일쑤다. 양심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호연지기는 이런 양심을 떠받치는 힘이다. 그러므로 호연지기를 기르지 않으면 양심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올바른 행위를 할 수도 없게 된다.
맹자가 예로 든 알묘조장의 뜻은 이렇다.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는 곡식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속성으로 기르다보니 호연지기가 길러지기는커녕 도리어 말라죽고 말았다는 얘기이다. 맹자는 이어 세상에 조장하지 않는 이가 드물다고 탄식했다.
지금 이 나라의 교육자나 학부모 중에도 아이들의 싹을 뽑아 올리는 조장(助長)을 하지 않는 이가 드물다. 모든 교육과정이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연령대별로 꼭 익혀야 할 것은 팽개쳐 두고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학습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조장도 이런 조장이 없다. 그러니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 대부분이 말라죽어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대학도 조장에 나서긴 마찬가지다. 방학 중에 진행되는 이른바 계절 학기는 한 학기 16주 동안 진행되는 강좌를 15일로 압축한 단기속성과정이다. 대학의 당국자들은 전체 강의시간만 같으면 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특히 인문교양 과목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4년간 기다린다 해도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한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인문교양 과목은 당장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내용을 가르치기 때문에 전공보다 훨씬 긴 호흡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학 당국은 인문교양을 비롯한 다수의 학과목을 속성과정으로 개설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 또한 싹이 자라기는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말라가기만 한다. 당연히 학생들을 탓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대학 당국의 잘못으로 돌릴 수만도 없다. 교육을 기능인 양성 정도로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파행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만든 오래된 주범들은 교육부 관료들과 기업, 언론으로 보이지만 그들도 구조의 일부일 뿐 권력과 자본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니 도무지 그런 구조를 바꿀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학교 당국자가 교육의 근본 취지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려면 당장 언론의 대학평가를 거부해야 하고 교육부의 지원을 포기해야 하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내가 알기로 학교의 어느 관계자도 그런 모험을 할 생각이 없고 그럴 만한 용기도 없다.
이런 현실을 느낄 때마다 대학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다. 하지만 결국 학생들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 내가 바라는 건 결국 학생들을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유일한 방법이다.
오래전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희생'을 보다가 마태수난곡이 나오는 마지막 장면에서 끝내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영화의 도입부에는 옛날 어느 수도사가 말라죽은 나무에 정성껏 물을 주었더니 마침내 죽은 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내가 만나는 학생들도 정성껏 물을 주면 정말 수도사의 나무처럼 꽃을 피울까?
정성껏 물을 주면, 정성껏 물을 주면….
/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