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도 함부로 통행 못하는 지역
생태·문화 유적지등 그대로 간직
국민적 관리·보전방안 논의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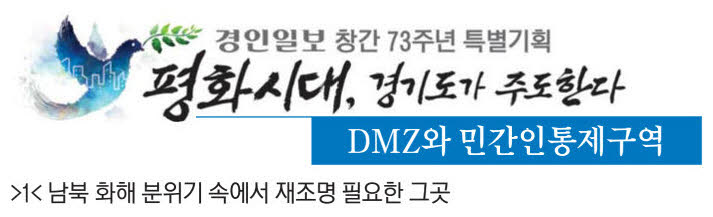
정기적으로 코레일에서 하루에 1차례 운행하고 있는 '평화열차 DMZ 트레인'이나 차량으로 안보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방문할 때만 잠시 시끌벅적할 뿐 고요하다.
도라산역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건 역사가 들어서 있는 위치가 '민간인통제구역 안'이기 때문이다.
도라산역 북쪽으로 차로 5분을 달리면 한국 군인들조차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이하 DMZ·Demilitarized zone)가 나타난다.
일반인들에게 DMZ로 알려져 있는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3년간의 전쟁을 잠시 멈추기로 합의하면서 탄생했다.

한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한반도에 있지만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방문할 수 없는 곳이다. DMZ는 군사분계선을 사이로 남과 북으로 2㎞씩, 동서로 248㎞에 걸쳐져 있다.
도라산전망대에서 DMZ를 바라보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수풀이 우거진 산지와 평지, 습지가 나타난다.
DMZ가 수풀로 우거질 수 있었던 건 갈 수 없는 땅이기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 안에 어떤 식물이 자라고, 어떤 어류와 조류가 서식하며, 한반도에 터를 잡고 반만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한민족의 흔적인 문화재 등이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민통선도 마찬가지다. 민통선 지역에 민간인들이 마을을 조성해 살기 시작한 지 30여년이 되어 가지만 생태와 문화재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잊혀져 있던 땅 DMZ와 민통선이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현재 비무장지대에서는 남북한, 북미간 대화가 이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북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민통선엔 안보관광을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사회는 DMZ와 민통선에 대해 화해의 시대에 어떻게 관리하고 보전해 나갈지 아직까지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냉전시대 서독이 통일 이후 휴전선인 그뤼네스반트(Grunes Band) 일대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했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연천에서 만난 김학용(64)씨는 "민통선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개발도 필요하지만 잘 보전해서 후손들에게 물려 줬으면 하는 마음이 많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DMZ는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곳이다"고 말했다.
/취재반
■ 취재반 : 김종택 부장(사진부), 김종화 부장(문화체육부), 이준석 기자, 배재흥 기자(이상 사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