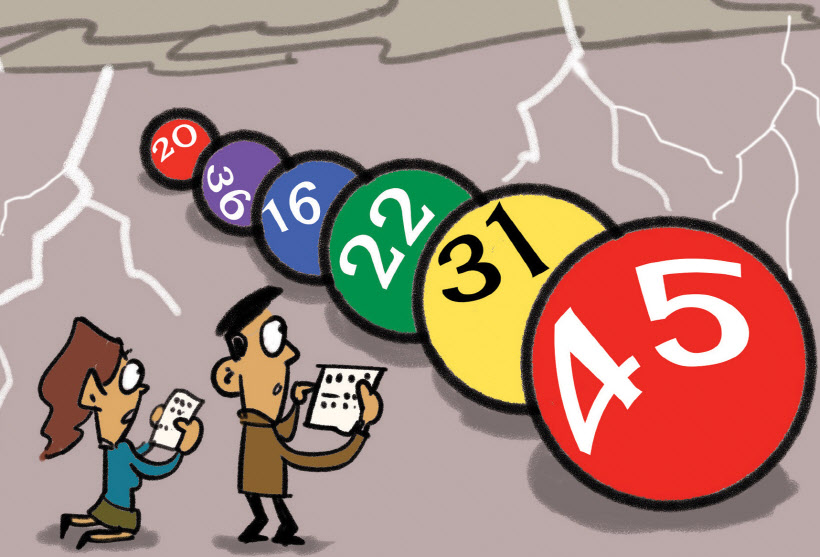
복권을 '빈자(貧者)의 세금' '희망(希望) 세금'이라고 한다. 구매자 대부분이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서민이고 희망고문만 할 뿐, 당첨이 어려워 돌려받지 못하는 세금과 같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에는 총 31만 6천679회의 벼락이 떨어졌다. 이 벼락에 4명이 맞았는데 확률은 7만 9천169분의 1이었다. 골프에서 150야드 파 3홀 기준으로 홀인원 확률은 일반인 1만 2천500분의 1, 투어프로는 2천500분의 1로 알려졌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천060분의 1이다. 액수가 높아질수록 그 확률은 더 낮아진다.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은 1947년 14회 런던 올림픽 경비마련을 위한 올림픽 후원권이다. 액면가 100원에 1등 100만원으로 모두 140만 장이 발행됐다. 이후 재해 대책자금, 전쟁 후 산업 부흥및 사회복지자금, 박람회 기금 마련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단기적인 복권발행이 이뤄졌다. 최초의 정기복권인 '주택복권'이 등장한 건 1969년이었다. 매달 액면가 100원에 발행하기 시작해 1983년까지 1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실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었다.
로또 복권이 등장한 건 2002년이었다. 건설교통부 등 10개 기관이 연합해 로또를 탄생시켰다. 당시 로또는 당첨자가 없을 때 이월되는 규정에 따라 1등 당첨만 되면 최대 수백억 원까지 손에 쥘 수 있어서 '인생역전'의 상징이었다. 로또복권 최고 당첨금은 407억 원으로, 2003년 4월 춘천에 사는 경찰관이 세금을 빼고 무려 318억 원을 수령했다. 세계 최대 복권 당첨금은 2016년 1월 미국 파워볼의 15억 8천700만 달러였다.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이 3조 9천65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경기와 로또 판매가 비례한다는 속설에 비춰보면 그리 반가운 소식도 아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울수록 서민의 발걸음은 복권 판매소로 향한다. 추첨이 있는 토요일 명당자리로 알려진 판매소는 몰려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다. 요즘엔 로또가 가난한 서민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직장인에게도 큰 인기다. 로또를 구매한다고 해서 이들의 '작은 희망'을 '허황한 꿈'으로 폄하해선 안된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앞으로 큰돈 벌 길이 보이지 않는 서민들에겐 그나마 로또가 인생역전의 유일한 동아줄이기 때문이다.
/이영재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