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속 '우유를 따르는 여인' 만큼
사회 노동자들이 하는 일 매우 중요
연간 1천여명 작업장에서 죽어가
기계로 인해 일터에서 목숨잃는 한
우리에겐 희망을 가질 자격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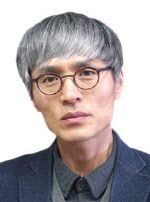
레이크스 미술관의 이 여인이 / 세심하게 화폭에 옮겨진 고요와 집중 속에서 / 단지에서 그릇으로 / 하루 또 하루 우유를 따르는 한 / 세상은 종말을 맞을 자격이 없다(베르메르, 최성은 옮김)
시인은 베르메르의 그림에서 고요와 집중을 읽어내고 있다. 하지만 그림의 장소는 하녀가 일하는 주방이다. 비록 테이블 위에 놓인 빵에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고 있지만 그림의 작업장이 고요하거나 따뜻할 리 없다. 그림 오른쪽 아래에 놓여 있는 발난로를 보더라도, 장식이라곤 없는 벽을 보아도 그곳은 춥고 지저분하며 시끄러운 곳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시인은 그림 속의 풍경에서 우유가 쪼르르 흘러나오는 소리를 또렷이 들었을 것이다. 그림 속의 여인이 따르는 우유와 테이블 위에 놓인 빵은 아마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닐 게다. 그럼에도 하얗고 가느다란 우유 줄기에서 그녀의 집중이 분명히 보인다. 그것은 누군가를 공양하기 위한 그녀의 정성이자 세상을 지탱하는 숭고한 힘이다.
그러기에 시인은 저 여인이 "하루 또 하루 우유를 따르는 한 / 세상은 종말을 맞을 자격이 없다"고 받아 적은 것일 테다.
아름다운 그림 한 폭과 그에 맞춤한 아름다운 시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이 이야기를 지배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 여인에게 이 일이 이토록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니까 너는 평생 우유나 따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순식간에 성자는 노예가 되고 숭고는 마취제가 되고 만다.
그림 속의 여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가 하는 일, 이를테면 택배기사나 편의점 점원이 하는 일은 그림의 여인이 하는 일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숭고한 노동으로 떠받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들 노동자를 대하면 어떤 서사가 만들어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는 일이 고객에게 그토록 중요하니 물량을 맞추기 위해 밤새도록 배달하고 손님이 없어도 자리에 앉지 말고 일하라고 요구한다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김용균씨의 죽음은 바로 그런 자본주의적 서사의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결말이다. 고용노동부의 확인에 따르면 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주변의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한다. 우리는 그런 희생 아래 만들어진 전기를 쓰면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비단 김용균씨의 비극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연간 1천여 명의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죽어가고 있다. 올해에 들어서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숨지고, 자동문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문틈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끼이고 깔리고 떨어져 목숨을 잃는 것이 이 나라 노동자의 처지인 것이다.
일하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계속 돌아가야 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있다면 그것은 악마의 맷돌이다. 그런 세상 어디에도 숭고는 없다. 이것이 내가 이 아름다운 그림과 시를 마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거나 읽지 못한 이유다.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가 있는 한, 기계로 인해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있는 한 우리에겐 희망을 가질 자격이 없다.
/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