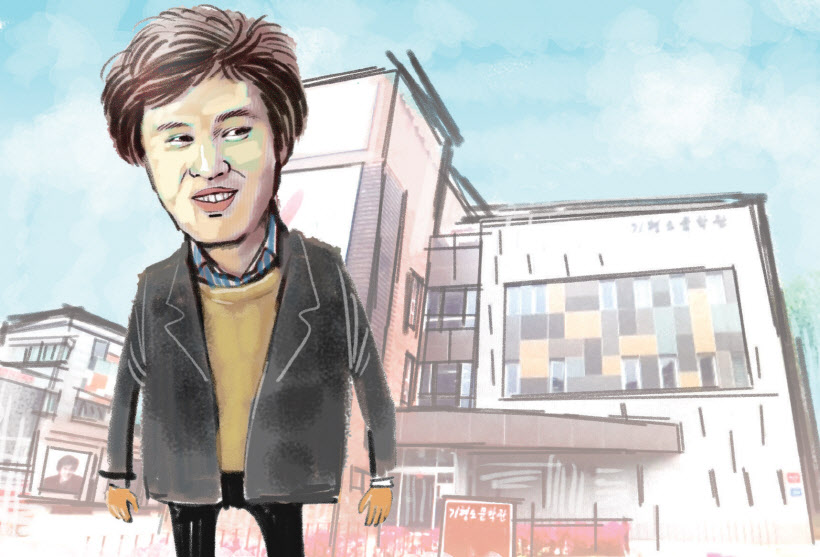
86년 초 공적이지도 그렇다고 사적이지도 않은 자리에서 그를 처음 보았다. 함께 자리했던 내 친구이자 그의 초등학교 동창은 "저 머리 긴 애 있지. 기형도야. 너도 알지? 그 '안개'라는 시"라며 안개처럼 내 귀에 속삭였다. 기형도는 별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1989년 3월, 신문지상에서 우울한 모습의 그를 다시 보았다. 종로의 한 허름한 극장. 숨이 막히는 어두운 공간에서 기형도는 잠 자듯 쓰러졌으며, 새벽 극장을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미 사늘하게 식어버린 그의 시신을 발견했고, 그의 나이가 이제 겨우 스물아홉이라는 그날의 부고만큼 슬픈 기사를 본 적이 없었다.
3·1절 날 광명에 있는 '기형도 문학관'에 다녀왔다. 안양에서 광명 방향으로 안양천을 지나는데 천변 위를 올라탄 거대한 도로와 천변을 따라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만 보일 뿐, 기형도의 시 '안개'에서 묘사됐던 그 슬픈 천변 풍경은 어디에도 없었다. 생전 단 한 권의 시집도 없이 유고시집 한 권만 남긴 시인치고 문학관은 알차게 꾸며져 있었다. 기형도가 중앙일보에 첫 출근하던 날 입었다는 빛바랜 양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오는 7일은 기형도 30주기 되는 날이다. 그를 기리는 행사들이 그의 고향 광명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제는 그가 잠들어 있는 천주교 안성 추모공원에서 '기형도 30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내일 광명시민회관에서는 '정거장에서의 충고'라는 이름으로 30주기 추모 콘서트가 열린다. 매년 그랬듯 가수 장사익이 찾아와 '엄마의 걱정'을 부를 것이다. 7일에는 그의 모교 연세대학교에서 '신화에서 역사로-기형도 시의 새로운 이해'라는 학술 심포지엄도 열린다.
시간이 흐르면 기억도, 첫 사랑도 모두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형도의 열기는 식지 않고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기형도라는 나무의 뿌리는 더욱더 견고하고 잎사귀는 이제 하늘을 가릴 만큼 풍성하다. 지칠 법도 한데 유고시집 '잎 속의 검은 입'은 스테디셀러 반열에 오른 지 오래다. 검은색은 줄기차게 내리쬐는 빛을 견디지 못해 퇴색하면서 마침내 하얀 백지가 된다. 하지만 기형도는 한 올의 흐트러짐이 없이 그 검은 빛을 3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마침내 그의 고향 광명에 아름다운 문학관이 생겨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꾸역꾸역 찾아오는 것을, 나는 '기적'이라고 믿는다.
/이영재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