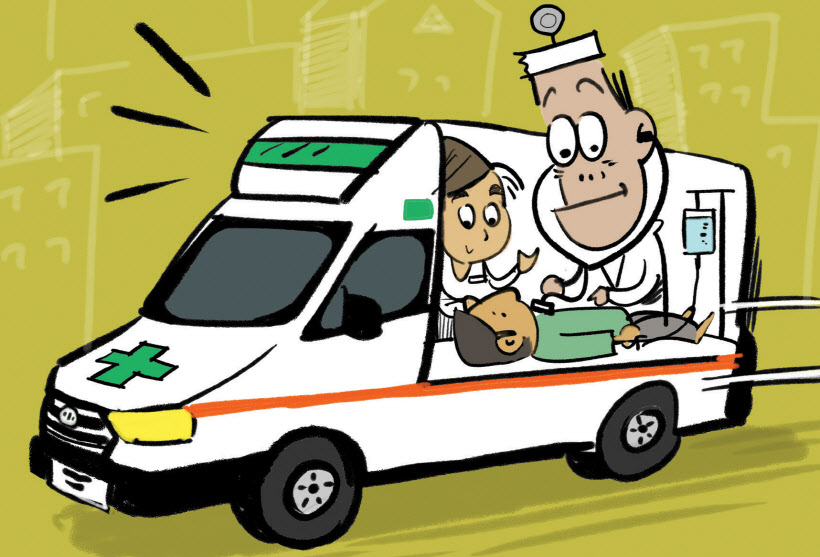
"자네 아버지는 한국 사람처럼 살았고 한국 사람처럼 죽었네."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벽안(碧眼)의 청년이 아버지의 지인에게서 들었던 말이다. 응급구조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에선 길에서 허무하게 죽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택시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의사의 권유로 더 큰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숨졌다. 이후 청년은 전 세계 각국을 돌다가 선진화한 미국 텍사스의 응급구조시스템에 큰 감명을 받게 된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15인승 승합차부터 사들였다. 이어 목수, 철공 기술자와 함께 집 뒷마당에서 승합차를 구급차로 개조하는 일에 매달렸다. 대한민국 1호 구급차는 이렇게 탄생했다. 이때가 1993년이다. 사실 이전에도 구급차는 있었다. 1972년 전북 전주소방서를 시작으로 1973년 부산 동래소방서 등 일부 소방서에서 구급차를 운영했고 1982년 3월 서울소방본부에서 구급대를 창설하면서 119구급 서비스 시대가 열렸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38년 경성교통안전협회의 의뢰로 경성모터스주식회사가 제작한 구급차가 운행되기도 했다. 당시 백미 240가마를 살 수 있는 '거금'이 투입된 이 구급차는 중상자 2명이나 경상자 4명을 동시에 이송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구급차는 단지 환자를 이송하는 운송수단에 불과했다. 차 안에 의학 설비를 갖춰 응급처치가 가능토록 한 전문 앰뷸런스는 청년이 제작한 구급차가 최초다. 그 청년이 이제는 60대로 접어든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이다. 1895년 외조부가 선교를 위해 제물포 땅을 처음 밟은 것을 시작으로 4대째 한국에서 살고 있다. 그가 뚱땅거리며 만든 구급차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며 구급차의 개념을 바꾸어놓았다. 그리고 2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응급구조시스템에서 볼 수 없었던 신개념의 구급차가 또 한번 선을 보였다. 가천대길병원이 지난 1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에 들어간 '닥터-카'다. 전문의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이 응급구조사와 함께 탑승한다는 것이 응급구조사만 타는 기존의 구급차와 다른 점이다. 중증환자를 골든타임 내에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장비도 갖춘 터라 '달리는 응급실'이라 할 수 있다.
진작 '닥터-카'가 길 위를 달렸더라면 인요한 소장 아버지의 지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자네 아버지가 한국에서 살아서 그나마 다행이네."
/임성훈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