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사건에 묶인 '동혁의 삶'
오태석의 '자전거' 윤정목도 유사
현기영 '순이삼촌'·이산하 '한라산'…
역사의 과정 아직도 못다한 말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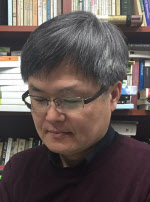
연극 '잃어버린 마을'은 두 축의 시간이 흐른다. 하나는 극 중 현재인 1979년의 시간이다. 다른 하나는 극 중 과거인 4·3사건이 일어난 시간이다. 두 축의 시간대가 교차하며 연극은 진행된다. 2019년의 관객은 동혁이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사연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4·3사건을 만나게 된다. 관객을 그 진실로 안내하는 출입문은 동혁과 아들 재구와의 갈등이다. 관객이 그 문을 열고 들어서게 되면 잃어버린 마을을 목도하게 된다.
동혁의 삶은 30년 전 사건에 묶여 있다. 그는 마을에서 혼자 살아남았다. 후한 값을 치르겠다는 제안에도 땅을 팔지 않는 까닭은 그가 고향에 남은 마지막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나중에서야 밝혀지지만 그는 살고 싶어 서북청년단에 협력했다. 그가 불을 지른 것은 아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을이 사라지고 난 뒤였다. 그렇게 살아남았던 것이다. 그 후 30년 동안 그의 시간은 멈춰있다. 주변에서 "30년 지켰으면 됐다"라거나 "네가 붙들고 있는 게 뭔지 안다"라는 말로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서.
연극 '잃어버린 마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 인물을 중심인물로 다룬다는 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부정적 인물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목록에 올릴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동혁과 같은 인물이 연극사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4·3사건을 다룬 연극이 극히 적다는 점, 제주도가 아닌 서울에서 공연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동혁과 같은 인물을 형상화하는 것은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위한 시도인지도 모른다.
연극 '자전거'(오태석, 1983)에도 유사한 인물이 나온다. '자전거'의 윤정목은 제삿날이 되면 사금파리로 자신의 얼굴을 긁는다. 한국전쟁 당시 등기소 방화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래서 제삿날이 같은 집이 마을에 허다하다. 윤정목이 30년이 지나도록 사금파리로 얼굴을 긁는 것은 어쩌면 용서를 구하는 일일 것이다. '잃어버린 마을'의 동혁이 "기억해야만 했다, 이 이름들을"이라고 읊조리는 까닭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4·3사건을 다룬 문학 작품의 목록은 아직 앙상하다. 그러나 1978에 발표한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과 1987년에 발표한 이산하의 장편서사시 '한라산'은 큰 족적을 남겼다. 현기영은 "고모부님, 고모분 당시 삼십만 도민 중에 진짜 빨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햄수꽈?"라고 물었다. 이산하는 "오늘도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 그 아름다운 제주도의 신혼여행지들은 모두/ 우리가 묵념해야 할 학살의 장소"라고 노래했다. 저자 후기에서 그는 4·3을 "인간이 얼마만큼 인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인간이 얼마만큼 인간이기를 포기할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평화의 섬 제주로 가는 항해가 여전히 지난하다는 것을 연극 '잃어버린 마을'은 보여주고 있다. 4·3사건을 말할 수조차 없던 시절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멀리 나아갔는가를 묻고 있다. 4·3사건은 아직 숫자로 남아 있다. 숫자로 기록되는 사건을 넘어 그 이름을 얻는 역사의 과정에서 보면 이 연극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아직도 다하지 못한 말이 남았기 때문이다. 말하지 못한 말, 말하는 동안 목구멍으로 눌린 말, 말한 후에도 혀끝에 달라붙어 있는 말, 그 모든 웅크린 말들이 온전히 날아오를 때 비로소 변방은 변방이 아닌 게 된다.
/권순대 경희대 객원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