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꺼낼 수 없는 두려운 말 가득
표현하지 못하고 소리·가락 이룬 것
파일서 해방돼 시어 만끽하고 싶어
그러기엔 다물어야 할 입 너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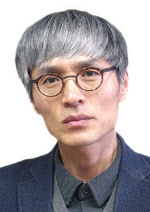
나는 시인이 이전에 펴낸 또 다른 서정 시집을 여러 권 가지고 있다. 서정시라는 말에 어울릴 만큼 하나같이 아름다운 시어들로 가득한 시집들이다. 하지만 이번 시집에는 쉽사리 입에서 꺼낼 수 없는 두려운 말들로 가득하다. 후기에는 시인의 고백이 이렇게 적혀 있다.
"이빨과 발톱이 삶을 할퀴고 지나갔다 / 내 안에서도 이빨과 발톱을 지닌 말들이 돋아났다 / 이 피 흘리는 말들을 어찌할 것인가 / 시는 나의 닻이고 돛이고 덫이다 / 시인이 된 지 삼십년 만에야 이 고백을 하게 된다"
닻과 돛과 덫. 세 단어의 받침에 웅크린 'ㅊ'이 마치 가시처럼 보였다. 과연 시에는 상처 자국이 선연하다. 그래, 가시가 여기저기 걸려서 오는 길이 이렇게 험하고 더디었구나. 닻은 내리고 돛은 올리고 덫은 걸리는 것이다. 시인은 어쩌면 돛을 올려 다다르거나 닻을 내리고 잠시 머무는 장소를 찾으려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읽히는 시(<기슭에 다다른 당신은>, <여기서는 잠시>)가 드문드문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든 덫에 걸려 몸부림 친 흔적이 역력하다. 덫은 땅 위(<이 도시의 트럭들>)와 땅 아래(<혈거인간>), 바다 속(<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과 바다 밖(<난파된 교실>), 심지어 하늘(<새를 심다>)에도 촘촘히 펼쳐져 있다. 시인이 그간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디어 왔는지 느껴져 책장을 넘기는 손이 무겁다. 시에는 지난 몇 해 동안 시인이 무엇을 보았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 비극적인 2014년 4월 16일 이후 시인은 이렇게 썼다.
"(...)지금도 교실에 갇힌 아이들이 있다 / 책상 밑에 의자 밑에 끼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다리와 / 유리창을 탕, 탕 두드리는 손들, / 그 유리창을 깰 도끼는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난파된 교실>의 마지막 단락)"
아마도 이 시는 시인이 걸린 덫 중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흔적일 테다. 이 외침 때문에 시인은 지난 정권 시절 세 곳의 기관으로부터 불온한 자로 지목당하여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아이들의 절규를 대신한 이런 시가 불온하게 여겨졌다면 그런 마음이야말로 정말 불온한 것 아닌가?
남송의 철학자 주희는 '시란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남은 것들이 모여 소리와 가락을 이룬 것'이라 했다. 그러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시를 쓸 수 있는 것이다. 주희의 이 말에 따르면 시는 말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말이 끝나는 지점에서, 말이 멈추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없는 이는 시를 쓸 수 없다. 나희덕 시인의 이 시는 차마 말로 옮길 수 없는, 가슴 아픈 진실을 적어낸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시인은 또 다른 덫에 걸려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그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다시 시가 되어 이렇게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덫에 걸려 괴로워하지 않았다면 이 시들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인에게 덫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독자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언젠가 예전에 그랬듯 시인이 닻을 내린 곳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새벽녘 능선 위에 쉬고 있는 상현달에서 신의 모습을 보고 싶다(<상현(上弦)>). 그래서 파일에서 해방되어 반짝이는 시어들을 만끽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기엔 아직 다물어야 할 입들이 너무 많다. 어둠이 너무 짙다.
/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