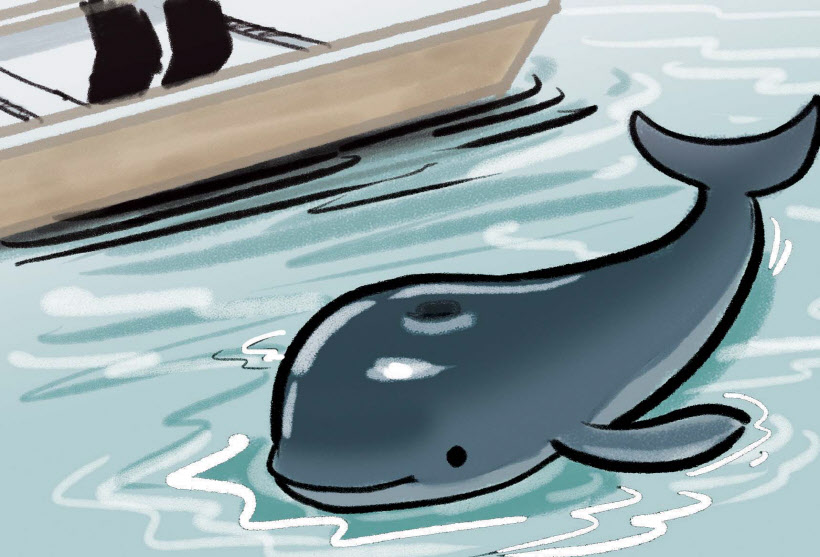
태종실록 1405년 11월 20일에 이런 기사가 실려있다. '큰 고기 여섯 마리가 바다에서 조수(潮水)를 타고 양천포(陽川浦)로 들어왔다. 포(浦) 옆의 백성들이 잡으니, 그 소리가 소(牛)가 우는 것 같았다. 비늘이 없고, 색깔이 까맣고, 입은 눈(目)가에 있고, 코는 목(項) 위에 있었다'. 양천포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잡혔다는 6마리의 고기는 '상괭이'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에도 '갑자년(1564년)에 한강에 큰 물고기가 나타났다. 크기는 돼지만 하고 색상은 희며, 길이가 한 길이 넘는데 머리 뒤에 구멍이 있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 역시 상괭이로 추정된다.
상괭이는 최대 크기가 약 1.5~2m로 회색 몸통에 주둥이가 짧고 등지느러미가 없다. 이빨 고래류 중 덩치가 가장 작다. 예로부터 바다와 강에서 흔히 발견되다 보니 지역에 따라 '쌔에기' '슈우기' '무라치'로 불렸다. 순조 14년인 1814년 흑산도에 유배 중이던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상괭이를 '상광어(尙光魚)'와 '해돈어(海豚魚)'라 적었다. 얼굴 모양이 사람이 웃는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웃는 돌고래', '형사인(形似人)' 즉, 사람을 닮은 물고기 '인어'라고도 불린다.
상괭이는 남·서해안에 주로 서식하지만, 옛날에는 통진(김포) 부근에 특히 많았다. 다른 돌고래와 달리 염분이 적은 물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강에 사는 돌고래는 손에 꼽을 정도다. '보토'라고 불리는 아마존의 '분홍돌고래', 라오스의 '이와라디 돌고래'도 메콩 강에 서식한다. 이들의 특징은 개발과 수질 오염, 남획으로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세계적인 희귀동물이라는 점이다. 사람같이 여러 표정을 짓는다고 해서 모두 인어 전설쯤 하나씩 가진 것도 공통점이다. 인천 장봉도의 인어 전설도 상괭이에서 연유한다.
지난 17일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상괭이 한 마리가 파평읍 율곡리 임진강 변에서 발견됐다. 최근엔 지난 2015년 4월, 5월 두 차례 한강 변에서 사체로 발견된 적은 있지만, 산 채로 잡히긴 처음이다. 구조된 상괭이의 몸길이는 1.5m 가량으로 탈진이 심하고 온몸에 피부병이 발병한 상태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물병원에 옮겨진 지 10분 만에 폐사했다. 모처럼 임진강을 찾은 것은 반갑지만, 인간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웃는 돌고래' 상괭이가 멸종리스트에 오르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다.
/이영재 논설실장












